-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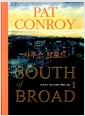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1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이 만큼 훌륭하게, 이토록 아름답게 쓰는 작가는 없다", "눈부시다...놀랍다...우리들 인생을 페이지 갈피갈피에 옮겨놓고야 마는 콘로이의 열정은 한계가 없다"... 거의 대부분이지만 새책이 시중에 쏟아질때 마다 속칭 전문 비평가라는 사람들의 미사여구가 책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문구들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러한 얄팍한(매번 속으면서도) 문구에 현혹되어 무심결에(이번만큼은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책을 픽업해서 천금같은 시간을 탕진해가면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감동의 물결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씁쓸한 상술과 그에 편승한 서평가들에게 세속적인 욕한마디로 그 책에 대한 불쾌감을 들어 내는 것이 보통의 일이 된 것이 다반사라고 하면 너무 비약적인가?
하지만 <사우스 브로도>를 읽고 난 순간(아니 읽어가면서 바로) 다른 생각이 든다. 그토록 미사여구와 환상적인 단어조합에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사람들이 왜 이모양의 찬사밖에 던질줄 모를까라고 갸웃뚱해질만큼 팻 콘로이의 <사우스 브로도>는 환상적인(그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깊이가 작아서 이말밖에는 달리 할말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작품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외곽 해안도시 찰스턴에서 벌어지는 열명의 청춘들이 겪는 삶과 사랑 그리고 우정. 보통 이러한 이야기거리는 아주 단순하고 전통적이고 다소 식상한 느낌마져 주는 소재이지만 존 콘로이를 만나는 순간 한편의 서사시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금새 느낄 수 있다.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루는 유사한 예를 정말 귀가 따갑고 눈이 아프도록 많이 겪어 봤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아니 아름답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꾼은 아마 내 기억엔 없었던 것 같다. 미국 특히 개성 강하고 보수적인 남부지방에 대한 그 어떠한 경험이 없는 이국의 독자라도 소설을 읽고나면 찰스턴이라는 도시는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 기억속에 가까이 남아 존재하고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 버리고 만다. 마치 1969년에서 20년간 찰스턴에 살았다는 강렬한 느낌을 충분히 받게 할 만큼 작가의 레이아웃에 대한 묘사는 마음에 푸근한게 다가온다.
성격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인종적인 문제로 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친구들이 소중하게 키워 나가는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 인생이라는 화두를 만나게 된다. 태어나면서 왠지 모르게 그 방향성이 정해져 버린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고 그럴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청춘들을 통해서 작가가 바라보는(아마도 레오라는 분신으로 통해서) 인생은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레오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친구들 주변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심지어 허리케인의 기습으로 생과 사의 문턱에 도달했던 순간까지도 그저 인생에 한두번 정도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메세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냥 주어진 아니 어떤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한번즘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일종의 철학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작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인 레오의 형인 스티브의 자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때 마저도 잔인할 정도로 무덤덤하게 그저 네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중 하나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치 그냥 길을 걷다가 우연히 죽도록 보기싫은 사람을 만난것 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개인적은 레오와 시바의 첫 사랑나눔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작가의 언어묘사에 다시금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남녀간의 사랑행위가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했던 이가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 마치 서쪽 수평선으로 저무는 태양을 바라 보고 있는 느낌을 가질 만큼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구었을때의 편안함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이 소설은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 추리소설이나 대하 역사소설에서 나오는 방대함과 애틋하고 짜릿한 로맨스를 느낄 수는 없는 내용들이다. 그저 레오를 중심으로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다룬 정말 재미없는(여타소설에 비하면 그소재의 진부함이) 내용을 가득차 있을 뿐이다. 기껏해야 광적인 소아이성애자의 집착과 허리케인이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레오형의 자살의 비밀등이 약간의 긴장감을 갖게는 하지만 이러한 약간의 충격들 역시 찰스턴이라는 무대에 그냥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것처럼 묻혀서 지나간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가의 엄청난 포스을 느끼게 한다. 소설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그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 뿐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야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묘사했던 작가는 없었다는 점에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1,2권 합쳐서 천여페이지에 육박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소설의 후반부를 갈수록 이야기의 결말에 다가가야만 한다는 아쉬움에 책장을 넘기기가 절로 주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문학작품의 개성강한 주인공들의 삶을 동경하게 마련이다. 그들 삶을 통해서 꿈을 꾸고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잠시만 현실로 눈을 돌리면 모든것은 변한게 없다. 언제 무슨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더라도 있을수 있는 것이라며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굳이 인생에 틀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더라도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팻 콘로이는 <사우스 브로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