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시금!) 도스토예스키(특히 <카라마조프>, 역시나 다시금!) 공부를 하다가, 논문 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나쳤겠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나와, 여기다 옮겨본다.
"The Dostoevskys were now relatively well off, compared with their economic situation in the past, but they had been unable to amass any capital and were much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도스토예프스키 부부는 과거의 경제 상황에 비하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지만, 어떤 거금(자본!)도 모을 수 없었던 데다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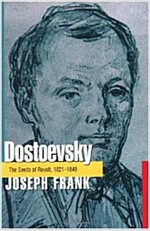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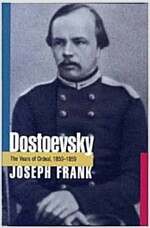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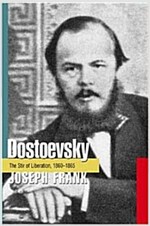
(지금 보고 있는 건 저 시리즈 중 맨 마지막 권. 대학 시절부터 군데군데 읽어온 책. 너무 길어서 때려주고 싶다!)
지금 내 인생에 딱 들어맞는 문장이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책이 가르쳐주지 않는 모양이다!) 서른, 오랫동안 꿰차고 있던 학생증을 버리고 강사증(?)을 들었던 2004년 3월, 나의 월수입은 80만원 남짓, 방세는 세금 포함 28만원이었다. 사실상 50만원 갖고 한 달을 살았다. 그나마 방학 때는 수입이 없었다. 그때 나의 꿈은 월수입 2백.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 강사료도 제법 뛰었고(아, 그런데 왜 취직이 안 된 거냐, 흑흑 -_-;;) 애써 번역한 책들이 은혜 갚은 까치 노릇을 하고 있고, 간혹 연구비나 어디 기금을 받게 되는 해도 있다. 수입이 널뛰긴 하지만, 월 80만원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네 평짜리 원룸-월세방에 살 때보다 더 돈에 허덕이는가.
우선 '모아둔 돈'이 없다, 가 문제. Capital, 이라는 저 무시무시한 단어. 항상 읽고, 이해하고 싶지만, 좀처럼 읽히지 , 이해되지 않는 단어, 캐피털. 아마 영원토록 완독 못 할 저 책. 부자는 노력이나 뭐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는 것'임을 마흔 넘어서는 완벽히 깨닫는다. 애시당초 벌어지는 돈도 거금이 아니거니와 살아가면서 소비되는 돈이 또한 많기 때문에 영원토록 거금은 확보되지 않는다. 티끌 모아 소박한 티끌 더미, 태산이 아니라. 물론 그나마라도 긁어모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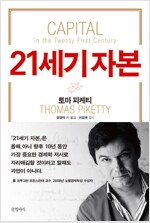
캐피털에 대한 집착은, 앞의 인용문의 마지막 어구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도-키는 사십대에 결혼했고, 당시로선 정말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었다. 그는 조만간(<카라마조프> 출판 하고 일년도 안 지나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의 두 아이는 열 살, 열 두 살(?) 등 그야말로 아이였다. 어린 자식을 둔, 나이 많은 부모의 고민은 다 비슷할 것 같다. 서른 여섯 늦은 겨울에 임신, 서른 일곱 한여름에 출산, 그리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으나, 아이가 대여섯이 되면서부터 아이에게 내가 너무 늙은 엄마라는 것을 의식한다. 앞으로 아이와의 세대 차이도 커질 것이다. 모든 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돈, 이더라니. 관리만 잘 하면 돈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돈 관리가 피부나 몸매 관리보다 쉽다. 아니, 나이 들수록, 후자도 돈이다.
꼬박 2년, 아니, 8월이니 그 이상 치료실을 다닌다. 치료비가 아주 약간의 에누리를 붙여서 딱 백, 이다. 어느 항목에 매달 지출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참 놀라운데, 이게 1년 넘었다. 대문자 C, 저 캐피털에 대한 유혹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한 번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일만 남았다. 그런 것 같다. 이게 또 캐피털의 마력. 캐피털은 결국 욕망의 동의어이다. 그러게 다시 한 번 이 지점에서 발자크의 위대성을 상기하게 된다. 내 안의 속-스러움이여!



시즌별로 업데이트 되는 FW, SS 신상품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나를 보면, 또 테레사 메이나 브리짓 마크롱(그밖의 알렉사 청, 엠마누엘 알트 같은 각종 셀럽들)의 패션을 '탐구'하는 나를 보면, 발자크 소설 속 남자주인공들과, 19세기 프랑스판 된장녀-촌년 엠마 보바리가 떠오른다. "나 같으면 집구석에서 너처럼 그렇게 차려 입고 있으면 쪽팔려 죽겠다."(??) 대략 이런 식의 말을, 보바리의 시어머니가 던지는 장면도.
러시아에서 남이 버리고 간 옷을 주워 입고 살던 촌뜨기 대학원생-유학생의 남자 친구였다가 10여년 전 남편이 된 그가 한 날은 사심없이, 혹은 정말 한심하다는 듯 웃으며 말한다.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저렇게 한심하게 (옷 사는 데나) 쓰다니! ㅋㅋㅋ" 그러는 남편은 정녕 소비-욕망을 잘 모르는, 좀 과장하면, 독일식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 같다. 거의 5년째 똑같은 휴양지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휴가를 보내는 앙겔라 메르켈의 느낌. 물론 그게 학창 시절 나의 모습이긴 했는데...-_-;;
자본, 소비, 욕망, (순수한) 꿈 등을 생각하자면, 언젠가 이 소설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읽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