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러시아문학, 즉 구소련의 SF는 과학픽션, 과학소설, 공상과학소설이라기보다는 나우치나야 판타스티카научная фантастика, 즉 과학(적) 환상(판타지)이라고 불린다. 먼저 두 작품을 읽었는데(그나마 한 권은 절반만 -_-;;) 아주 학을 뗐다. 여러 가지 원인(흠^^;)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유토피아 장르 자체가 그런 문제(재미없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소설적 흥미란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유토피아란 이론적으로 '문제 없음'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로 장르 전환하거나, <안드로메다...> 역자해설처럼 유토피아로 가는 여정에 모험담식 얘기를 배치하거나. 아, 이러나저러나 재미없어서, 앞날이, 까지는 아니고, 14주차 강의의 그날이 캄캄하게 여겨졌다. 겸사겸사, <안드로메다...>의 역자는 SF소설을 직접 쓰기도 한다.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화이팅!^_^



암울한 참에, 최후의 보루처럼 열어본 책이 현대문학에서 대거 나오는(아마 또 나올) 스트루가츠 형제의 SF다. 우선은 제일 최근에 나온, 하지만 창작년도로는 비교적 일찍 쓰인 <죽은 등산가의 호텔>(1970)을 읽었다. 오, 살 것 같다! 거두절미하고, 소설로 재미있게 읽혀서, 이 정도면 다른 작품도 들춰보고 공부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읽히는 데는, 물론 원작이 잘 쓴 SF 스릴러인 덕분도 있지만, 번역의 기여도도 높지 않을까 싶다. 러시아문학 번역 수준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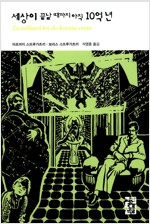


스-키 형제의 초기 유명(대표)작은 <신이 되기는 어렵다>(1964)와 번역 안 된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한다>(1965)가 있다.(그런 모양이다.) 더^^ 대표작은 타르콥스키의 영화(<스토커(잠입자)>)로 더 유명한 <노변의 피크닉>(1972), 석영중 번역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년>(1976).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에는 아직 두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ㅎㅎㅎ
겸사겸사, 펠레빈의 신간(번역본)이 나왔기에 냉큼 주문했다. 이 역시 SF. 유학 시절 그의 단편을 번역할 기회가 있었는데(일부 하기도 했는데) 어째저째 흐지부지 된 것 같다. 아주 잘 되었다^_^ 정말이지 번역이란 너무나 힘든 작업이라, 어지간한 보상(사랑 혹은 돈)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 갈 길이 멀구나! 이거야말로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