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런 책들을 훑었다, 읽었다고 할만한 것도 있다.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기 위해서였다. 이 책인데, 번역이 조금 갱신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소설이 짧아서 작업에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텐데.



러시아문학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안 읽다니^^; 이런 책들이 러시아 수용소 문학으로 대략 꼽히는 모양이다. 바실리 그로스만의 책도 있는데, 나는 읽지 못했고, 번역도 없고, 아마 번역되어도 안 읽기 쉽겠다.



이들 중 최근에 읽고 독자로서 가장 감동 받은 것은 빅터 프랭클 책이다. 처음 듣고(아, 무식?) 처음 읽는 작가라서 그렇기도 할 테지만, 문체가 담백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유의 문학(홀로코스트)에 항상 있는 '늪'이 여기는 없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과연 '로고테라피'가 효과가 있구나, 싶은 대목이다. 결국 자살하고 만 프리모 레비와는 사뭇 다르다. 레비는 완독 못했다, 읽어나가기 힘들었다. 반면, 프랭클은 '읽히는' 것에 대해 쓴다. 읽을 만하고 참을 만하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에 강제 노역을 하다가 저녁 노을에, 자연 풍경에 감동하는 것, 역시 이것이 인간이다!
러시아 수용소 문학의 연원은, 놀라운가, 역시나 도스토예프스키다. '문학'이라기에는 너무나 자료집, 르뽀에 가까운 체호프의 <사할린 섬>은, 그러나, <6호실>, <구셉>과 같은 걸작의 에뛰드라고 볼 수 있다. 아, 작가는 부지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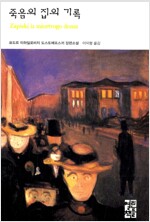


다시 도-키. 서론에만 잠깐 언급되지만, 확실히 그에 맞먹을 만한 작가는 톨스토이(그리고 약간은 체호프) 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책은 겨우 2부작이다.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었겠지만, 확실히 이런 유의 '기록'(반쯤은 논픽션)보다는 소설, 픽션이 더 끌렸을 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 가슴속에서 터져나오길 바라고 있었을까. 나를 꺼내줘, 나를 써줘, 나를 소설로 만들어줘! 솔제니친에 대해 쓰다가, 엉뚱하게도, 다시금,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을 절감한다. 생긴 건 정말이지 도끼 자루 같은데 -_-;; 마침 <죄와 벌> 저 표지의 도끼가 생각나서, - 아무 의미 없는 비유다.
겸사겸사, 러시아문학 번역의 완벽한 세대 교체. 나-우리 역시 조만간 교체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