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에 알프레드 드 뮈세의 <세기아의 고백>을 읽었다. 아주 꼼꼼, 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다 읽었다. 다 읽고 알았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읽는 것임을. 세상에. 오랫동안 읽은 책인 줄 알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내가 번역하기도 한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 탓인 것 같다. 이 소설의 경우 오래 전 논문도 한 편 썼는데, 무수한 레퍼런스에서 뮈세의 책에 관한 언급을 읽었고 아마 그때문에 오랫동안 기시감(기독감??)을 가졌던 듯하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제목이 말해주듯,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경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즉 '역사'의 차원까지 넘보려려는 젊은/어린 작가의 야망이 담긴 작품이다. 야망이 항상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레르-프는 여러 모로 '선전'했다고 할 만하다. 이 책의 말하자면 원조 격이 <세기아의 고백>이다. 스물을 전후한 청년이 스스로를 '세기아'로 내세우고 일견 '일기-수기'나 다름 없는 글을 '고백'이라는 거대한 장르로 내세운다. 여기에는 유구한 문학적(기독교 문학) 전통이 들어 있기도 하다. 아무튼 뮈세 역시, '선전 이상의 선전'을 한 것이다. 사실 소설이 좋으니 뒷 얘기가 궁금한 것이다. 그가 조르주 상드와 뭘 했든, 문학이 좋지 않다면, 아무도 관심 없을 터. 중요한 건 '사소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용의 퀄러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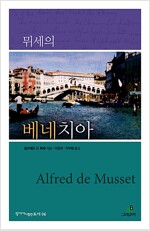
찾아보니 뮈세의 책은 꽤 있는 반면, 조르주 상드는 거의 찾기 힘들다. 비슷한 작업을 대학 초년 시절, <광장>과 <그날> 서점을 뒤지며 해보았다. 그때 상드의 책을 읽은 듯도 싶고 아닌 듯도 싶다. 분명한 건, 그녀는 문학 작품보다는 삶-형상으로 문학사에 남았다는 점이다. 사실 요즘 같으면 '-깜'도 아니었을 텐데, 그 시대에는 애(들?) 딸린 유부녀(이혼녀?)로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리라.
그리고 다시 보니, 뮈세도, 상드도 이십대. 뮈세는, 레르-프도 그렇지만, 요즘 같으면 대학 초년생이다. 글 재주 좀 있는 어린/젊은 제자가 연상의 여자(남자라도 좋다)와 연애한 이야기를 쭉, 쓰면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이런 가정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는 뭔가를 할(쓸) 때 비로소 생긴다.
말이 길어진 건, 솔직히, <세기아의 고백>이 '-시피'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십대 초반에 읽었다면, 레르-프의 경우처럼, 탄복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년에 읽으니 그렇고 그런 것이다. 문득, 어린 천재의 걸작(^^;)을 '씹고' 있는 중년 아줌마를 발견한다. 그러는 너는 도대체 뭘 썼니? 아,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변변찮은 소설 한 권 못 쓴 주제에 계속 남욕이나, 즉 남이 쓴 책 욕이나 할 줄은 참 몰랐다는 소리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갑자기 안 하기는 힘들 테고, 좀 줄여가며 대신, 내 글을 쓰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