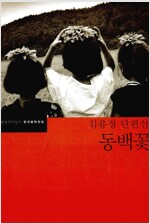나에게도 나만의 '옥수수밭'이 있다. 옥수수밭 뿐이랴. 들깨밭, 참깨밭, 고추밭, 고구마밭, 심지어 소나무 숲, 대나무 숲, 찔레나무 숲(덤불) 등등 하고 많은 숲과 밭이 있다. 하지만 이런 체험-기억과 소설은 역시 별개인 것 같다. <김승옥문학상...>에 실린 편혜영의 <어쩌면 스무번>을 읽으며 해본 생각이고 가져본 슬픔이다.



<식물애호>를 포함, 세 편을 다 읽었다. 그래도 제일 잘 쓴 건 <식물..>인 것 같지만, <호텔 창문>과 <어쩌면...>도 참 좋았다. 이미지만 놓고 보면 옥수수밭 쪽이, 호텔창문이나 강가보다는 좋았지만, 스토리는 후자가 더 나은 것도 같고, 뭐, 아무거나 다 잘 썼다. 아이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나중에 답안을 보면 알겠다. 나도 나만의 밭/숲을 잘 가꿔보고 싶은데, 아무 이야기도 날 찾아와주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모조리 다 너무 피폐하여 무슨 이야기를 찾아나설 힘도 생기지 않는다. 곁들어, 윤성희, 권여선 소설도 읽었다. 한밤에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의 이미지 너무 좋았다. (그러나 글자가 너무 빡빡합니다ㅠㅠ) 쓰러진 할머니를, 마침 공부를 하다 말고(실은 하지 않음) 귀가한 한 청년이 목격하여 신고한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할머니를 구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다. 남은 소설들은 내년 봄에 읽으려고 한다. 이 책은 선별, 편집이 무척 좋다. 흑, 역시 문학동네 ㅠㅠ 문학동네가 현재 우리 문단의 '로마'다. 모든 길은 로마-문동으로 통한다.
-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춘)다면!
- (... 이겨) 춤을 추겠네!
그렇게 기꺼이 춤추는 소설, 김영하를 읽었다. 이번에 새 판본이 나와서 청년 김영하의 소설을 읽는 기쁨을 누렸고, 덩달아 그런 김영하를 읽던 청년 김연경을 되돌아보는 (슬픈) 기쁨을 맛보았다. <엘리..터>는 물론, <사진관...>, <흡혈귀>까지 봤다. 저 춤추는 '끼'를 어쩔까. 건필하시라, 우리의 영원한 오빠여.



시간은 없지만 배수아, 이장욱까지 엿보았다. 이장욱 신간은 <행자...>를 읽는 순간, 아싸~ 이거다, 하고 감이 와서 한 번 골라보았다. 평소 이장욱답지 않게 모종의 생기발랄, 이런 것이 느껴져서이다. 아이들도 재미있어 했지만, 나에게 이장욱은 너무 학구적인(?!) 작가라 그런지 실감이 좀 덜한 작품이었다. 아마 김영하와 같이 읽어서 그럴 수도. 발랄한 스토리텔러의 '끼'가 없어도, 그러나,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다. 배수아를 보라.



아, 나는 영원한 (앨리스의) '토끼'. 정말 시간이 없다. 마지막 주에는 박상영의 소설을 읽을까 한다. 한국소설을 더 읽고 싶은 욕심이 크지만, 장르문학 쪽 단편도 하나는 보는 것을 늘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것까지 꼽사리로. 사실 꼽사리가 될 만한 작가는 아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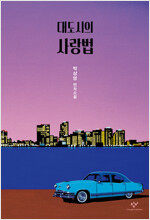


욕심만 내고 못 읽은 작가는 내년 봄으로 미뤄둔다. 미루는 데는 또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적들도 졸지/자지/놀지 않지만, 나도 내 나름으로 일하고 있단 말씀.
*
다시금 48년생 로커.
- 내 음악(노래)을 평가하고요? (...) 나는 내 음악이 너무 좋아, 최고야, 하하하
GOOD!!!!
옛날에는 나의 책, 소설, 학력, 번역 등에 '겸양'의 차원에서 후지다,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후진 책, 왜 쓰나. 쓰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왜 출간하나. 그걸 사보는 독자는 뭐가 되나. 강의 역시 마찬가지. 교수-강사가 강의를 후지게 하면, 그걸 듣는 학생들은 뭐가 되나. 다른 한편, 이런 자기비하, 겸양은 자신의 이상을 지나치게 높이 잡는 데서 비롯되는 오만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십오도 경사에서 뒹굴다 보면 곧 오십'인 처지, 실제로 나의 책, 소설 등등은 후지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지언 정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건 흡사 다음과 같다.
아이가 잠들면 십원짜리 쌍욕을 해본다. 말 그대로 평범한 쌍욕. 과거 할머니가 늘어놓는 구성진, 그래서 문학적인 그런 쌍욕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평소에도 제법 할 만한 그런 욕들. 아이 때문에 참는 말들, 그런 표현, 특히 담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등을 혼자 떠들기도 하고 남편한테 말하기도 한다.(보통 그는 알고 보면, 자고 있다 -_-;;)
"내가 생각해도 난 미친*이다. 야, 이 미친 *아, 너는 마누라가 미친*이면 좋냐? 애 앞에서 어떻게 말을 그따구로 해?"
"그 개**는 왜 그 **이야. 그 **들 중에 나보다 공부 잘 하는 놈 하나 없고 나보다 소설 공부 많이 한 놈 하나도 없어, 몽땅 다 **에 **들이야!"
이런 말을 몇 마디만 하고 나도 상당한 '설욕'의 쾌락이 느껴진다. 욕설의 카타르시스랄까. 이러고 나면 내가 '급' 착해지는 것을, 내 입이 '급'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라고 해서, 특히 아이 엄마라고 해서 항상 '바르고 고운 말'만 쓸 수 있나. 우리에겐 이런 카타르시스의 문학이(도) 필요하다. 무엇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