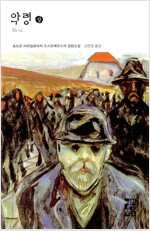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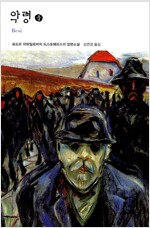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팠다, 이 점을 그는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녀 앞에서 예의 그 불안을 느꼈음에도, 그는 갑자기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Marie… 있잖아… 아마 몹시 피곤한 것 같으니까, 제발 화내지 말고…. 혹시 네가 괜찮다면, 가령 차라도 어때, 응? 차를 마시면 힘이 날 텐데, 응? 네가 괜찮다면…!”
“여기에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괜찮죠, 예나 지금이나 어린애로군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줘요. 정말 집은 왜 이리 좁은지! 춥기는 또 엄청 춥네!”
“오, 내가 지금 당장 장작을, 장작을… 나한테 장작이 있거든!” 샤토프는 정신없이 허둥댔다. “장작이라… 즉…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차부터!” 그는 필사적인 결의를 다지듯 손을 내젓더니 모자를 쥐었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집에 차가 없다는 거로군요?”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지금 당장 모든 게 있을 테고… 난….” 그는 선반에서 권총을 집었다.
“지금 당장 이 권총을 팔아서…· 아니면 전당 잡히거나….”
“진짜 바보짓일뿐더러 엄청 오래 걸리겠군요! 당신한테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내 돈을 가져가요, 이건 8그리브나 정도 되겠군요. 내 전 재산이에요. 당신 집은 꼭 정신 병원 같아요.”
“필요 없어, 네 돈은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당장, 냉큼, 권총은 없어도 되거든….”
그는 곧장 키릴로프에게 돌진했다. 분명히,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와 리푸틴이 키릴로프를 방문하기 2시간쯤 전의 일이었을 터이다. 샤토프와 키릴로프는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만난다고 해도 인사도,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메리카에서 너무 오랫동안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이다.
“키릴로프, 당신 집에는 항상 차가 있죠. 차와 사모바르가 있나요?”
방안을 거닐던(평소처럼 밤새도록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키릴로프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막 뛰어들어 온 사람을 주의 깊게, 그래도 별로 놀라지는 않고 바라보았다.
“차도 있고 설탕도 있고 사모바르도 있어요. 그러나 사모바르는 필요 없을 거요, 차가 뜨거우니까. 앉아서 그냥 마셔요.”
“키릴로프, 우리는 아메리카에서 함께 누워 있었죠…. 나한테 아내가 왔어요…. 나는…. 차 좀 줘요. 사모바르도 필요해요.”
“아내가 왔다면 사모바르도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사모바르는 나중에. 나한테 두 개가 있거든요. 우선은 탁자에 있는 찻주전자를 가져가요.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전부 가져가요. 설탕도 가져가요. 전부. 빵도…. 빵이 많거든요. 전부. 송아지 고기도 있어요. 돈도 1루블 있어요.”
“어서 줘, 친구야, 내일 돌려줄게! 아, 키릴로프!”
“그럼 스위스에 있던 그 아내인가요? 거참 좋은 일이네요. 당신이 이렇게 뛰어들어 온 것도 좋은 일이고.”
“키릴로프!” 샤토프는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에 찻주전자를 끼고 두 손에 설탕과 빵을 든 채 소리쳤다. “키릴로프! 만약… 만약 당신이 그 끔찍한 환상을 부정하고 무신론의 미망을 내팽개칠 수만 있다면… 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텐데, 키릴로프!”
“스위스에서의 일 이후에도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군요. 스위스에서의 일 이후라면, 거참 좋은 일이요. 차가 필요하면 다시 와요. 밤새도록 와도 좋아요, 아예 안 자거든요. 사모바르도 있을 거요. 1루블도 가져가요, 여기. 어서 아내한테 가봐요, 난 여기 남아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 생각을 할 테니까.”
마리야 샤토바는 샤토프가 민첩함에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고 거의 탐욕스럽게 차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사모바르를 가지러 뛰어갈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겨우 반 잔 정도만 마셨고 빵도 조그만 조각 하나만 삼켰을 뿐이다. 송아지 고기는 꺼림칙하다는 듯 짜증스럽게 거절했다.
“넌 아픈 거야, Marie, 너의 모든 것이 너무도 아파 보여·….”
샤토프는 수줍게 그녀 주위를 맴돌면서 정말 수줍게 말했다.
“물론, 아파요, 제발 좀 앉아요. 차가 없었다 어디서 가져온 거죠?”
샤토프는 가볍게, 짧게 키릴로프 얘기를 했다. 그녀는 그에 대해서 뭔가 들은 얘기가 있었다.
“알아요, 미친 사람이죠. 이제 됐어요. 세상에 바보가 좀 많아야 말이죠, 예? 당신들 그래서 아메리카에 갔다면서요?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이 편지를 썼죠.”
많이 고치고 있다. 거의 새로 번역하는 느낌인데, 아마 다 하고 보면 딱히 그럴지도 않을 것이다. 이른바 원판 불변(^^;)의 법칙이랄까. 아무튼 <악령> 거의 막바지. 레뱌드킨 오누이 피살 사건에 완죤 정신이 나간 샤토프 앞에, '마리 샤토바'가 돌아온다. 이어지는 장면은 그녀가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 사이, 오랜 만에 재회한 그녀 앞에서 살살 녹고 반짝반짝 빛나는 샤토프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참... 도스-키의 소설의 출발점이 감상주의(!!!+ 낭만주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람 참 안 변한다! 마리와 샤토프 장면, 너무 감동적이다!^^; 정녕 독자의 금선(!)을 건드린다.
그다음, 짧지만, 키릴로프와 샤토프의 대화 장면. 중간에 "친구야~" 하는 저 대사만 반말인데, 작가의 실수인지 아니면 감정이 너무 격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애매하다. 아무튼 이 부분도 참 좋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천국-지옥, 아무튼 사후에 다시 만난 샤토프와 키릴로프 얘기를 써보고 싶었다, 내 소설로 말이다. 혹은, 반대로, 소설 속에서 조금만 언급되는 둘의 아메리카 체류기도 상상, 써보고 싶었다. 이런 꿈조차도 이미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악령>은 남는다! 스타브로긴보다 인간적으로, 샤토프와 키릴로프가 더 좋다. 이들이말로 <악령>의 감초. 이미지를 한 번 가져온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들이 정녕 청춘(!)이라는 것이다. 자살도 이때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두 컷 모두 오른쪽이 샤토프. 아래 사진은, 지금 내가 다듬은 저 장면인 것 같다. 소설 묘사를 보면, 샤토프도, 키릴로프도 방이 엉망이다. 정녕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 그들'이다.
새삼스럽지만, 어마어마한 소설이다.
사람이 이런 소재로(혁명과 테러), 이런 인물들로(등신들과 광인들과 한량들), 이런 화법으로(안에서 들여다보기) 소설을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