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스러워보일 수 있지만 성장소설(교양소설)은 모름지기, 장편의 (한) 원형이자 모범이다. 우리 문학에도 적잖이 있을 텐데, 생각나는 대로 꼽아본다.



<새의 선물>은 아직 고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유학 가기 전 이십대 중반에 읽은 까닭인지, 계속 그 이전에 쓰인 교과서급(?) 소설과 함께 묶여서 연상된다. 새로 나온 표지보다 초록색이 압도적인 저 표지가 마음에 든다. 주인공 이름이 진희였던 것, 광진테라 아줌마, 정도만 기억날 정도로 가물가물하지만, 무척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사 장면이 초반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거슬렀던 느낌도 있다. 저 소설이 너무 좋았던 탓인지, 이후 은희경의 소설은 다 실망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장 속에 이미 들어 있지만, <새의 선물>의 작가가 어떤 소설을 쓰는지 여전히 궁금해서 사 읽게 된다.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아줌마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유학 갔다온 이후 읽은 장편 중 손꼽을 만한 것이었다. 소설 쓰기에 마땅한 작법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할 것이다. 이후 어린이 책도 좀 쓰고 장편도 꾸준히 써오는 것 같던데, <설이>는 제법 읽히는 모양이다. 챙겨볼 시간이 없어서 유감이다. 언제 또 기회가 되길.
*
아주 많은 작품을 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떠오르지 않아 놀랍다. 지금 놀라고 있다. 역시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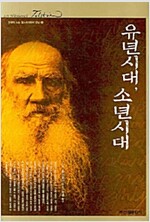
얼마든지 더 꼽아볼 수 있다. 심지어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서유럽문학은 성장소설로 읽을 수 있는 장편이 무척 많다. 그들의 시간 감각, 세계 감각과 잘 맞는 장르여서 일 것이다. 러시아문학에 한정하면, 톨스토이가 그런 균형감각(시간과 성장)을 잘 갖추고 있어서, 그런 전통의 소설을 많이 쓰게 된다. 실상 <전.평.>도 나타샤의 성장 소설일 수 있다. 도스-키도 이 장르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한 편 시도하는데 바로 <네토치(츠)카 네즈바노바>. 결국 미완으로 끝났고(체포 됐음) 훗날 완성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왜냐면... 그는 이른바 '성장'이 불가능한 시공간을 사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
소설을 아주 많이, 많이 쓰고 싶은데 체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소설을 쓸 수 있다면 굳이 다른 글을 쓸 이유가, 필요가 없다. 번역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다듬는 원고의 초고를 잡은 건 2007년 여름이다. 정확히 12년 전이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혹은 있어도 틀지 않는) 4평 남짓 원룸에서 하루 두 세 갑의 담배를 피우며 썼다. 밖에 나가서 밥 먹고(아마 한끼 정도) 동네 산책하고 담배 사오고 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 종일 집에서 쓰기만 했을 터. 2천매 쓰는 데 두달쯤 걸렸을 것이다. 내 몸 사정을 내가 잘 알기에 무척 조심했음에도 이삼일은 아파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생리통도 너무 심해, 하지만 이 심하고 성가신 통증조차 겪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너무 소중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곁들어, 대부분의 사상가와 작가가 남자였던 지라 월경/생리에 대한 사유가 적은데, 지금 떠오르는 걸로는 이 작품 정도다.

늙으면 입만 산다더니,그럴 수밖에. 수족이, 몸이 이렇게 부실해지니 뭘 할 수가 없다. 입의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쓰는 데 무척 많은 힘이 소요된다. 한달 내내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살았는데 이삼일 누워 있었더니 그 통증은 싹 사라졌다. 하지만 몸에 너무 힘이 없고(당연하지만^^;) 여차하면 체중도 출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나도 반갑지 않다!) "살긴 살았는데 도무지 산 것 같지가 않아."(?) <벚꽃 동산>의 늙은 하인 피르스의 말이다. 나도 요즘 비슷한 생각을 한다. 별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죽을 생각을 해야 하다니. 주변의 많은 이들이 스위스를 꿈꾼다. 하지만 거기도 돈이 든단 말이지, 캬.
*
어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의 유치원 시절 담임샘을 만났다.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어떤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다. 디스크 때문에 더는 교사 생활을 못한다고. 한편, 그 아이는 내가 아는, 3학년 짜리 어떤 남자 아이의 여동생이다. "너 ** 오빠 동생이지? 할머니 계시잖아요? 매일 안고 다니셨는데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올해 돌아가셨어요." "예?" 어쩐지 안 보이신다 했더니 세상을 아주 떠난 것이다. "하늘나라 갔어요, 할머니." 옆에서 손녀가 웃으면서 종알댄다. 건강하고 젊은, 그래서 오지랖 넓은(교회 다니라고^^;;) 할머니였는데... 그런 정겨운, 전근대적 오지랖도 이제는 듣기/보기 힘들겠다.
이런 분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시부모들에 비하면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가. 칠순에도 술을 퍼마시는 퇴폐적 자유도 아무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거 아버지 니들 초등학교 때 죽을 줄 알았다, 하도 술을 퍼서." 어제 엄마가 한 말. 여기에 무슨 철학이 있겠는가. 그저 무한한 자기방기, 그리고 나태와 무력이라는 악덕일 뿐. 보들레르가 생각난다. 역자인 황현산 선생도 세상에 없다.


한편으론, '성장'이란 참 슬픈 말이다. 그 끝은 어쨌거나 결국 '죽음'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죽음(들)이 없는 성장(들), 성장소설은 없다. 이 죽음을 삶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결국 아이-생산이다. 그런데 요즘은 참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지막 권은 <되찾은 시간>인데, 소설의 맨 마지막 단어도 (내가 직접 읽지는 않았으나) '시간'(temps)이라고 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본다. 구토가 가라앉아 살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