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과거는 우주보다 낯설고 또 멀다. 그렇지만 이렇게 써가는 동안에는 또 이만큼 익숙하고 가까운 것이 없다. 소설이란 결국 시간과의 싸움. 시간 사용법.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서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미셸 뷔토르의 <시간의 사용>(시간 사용법)을 직접 읽지는 못했는데, 내가 무척 좋아했던 소설가이자 불문학자 최수철의 박사논문 주제여서 도서관에서 찾아 읽은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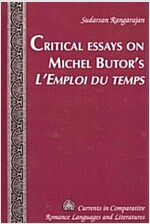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또 절망을 낳고."(??) 이상의 말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교'(=적절한 화법, 문체)를 찾다가 '절망'하여 아무 '기교 없음'으로 가보기로 결정했고, 그러고 나니, 내가 써놓은 원고 더미와 마주할 용기가 생겼고, 2주째 씨름하고 있다. 총 5장에 에필로그 2천매인데, 절반 가까이(심지어 이상) 날리는 것이 목표이다. 1장만 해도 거의 절반을 날렸다. 좋아! 이렇게 뭉텅 뭉텅 잘라낼 때의 쾌감은, 정말이지, 그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소설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이다. <스완네 집쪽으로>가 나왔을 때 꼼꼼하게 정독, 재독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못 댔다. 그 사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 역시 '적들'은 쉬지 않는다 ㅠㅠ 글쎄, 다시 읽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안의 소문과 협박과는 달리(!!!) 이 소설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다만, 길 뿐이다 ㅠㅠ 혹은, 혹자에겐 지루할 뿐이다ㅠㅠ 나의 입장에서, 긴 건 사실이지만 지루하진 않았다. 그러니 읽을 만했고 더 읽고 싶다. 이쯤 되면 당위이기도 하다. 읽어야 한다!^^;;



나아가, 이쯤되면 나의 스승들의 작품은 저 프루스트의 아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인정에 조금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닥치고(!!!) 써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저 소설을 쓰던 스승들 보다도 더 나이가 들었다. 할 말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조동일 선생이 그러셨나, 나이 들고 나서 역작을 쓰겠다는 학자는 해 질 무렵 등산하는 거라고. 나의 나이 역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도, 절반을 넘었다. 안 쓰고 있으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단 쓴다. 기왕지사 쓰는 거 조금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다.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은 절대 쓰지 않기로 한다. 앗, 그럼 <악령>은 언제 고치지?
그러게, 다 할 수는 없단다, 얘야^^; 수학을 많이 했으면 국어 할 시간이 없고 국어 수학 다 많이 했으면 놀 시간이 없고, 대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놀 수 있는 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