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음식 관련 훌륭한 책을 내는 따비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왔다. SNS 에서 출간소식을 접한 바로 그날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서 주말 동안 읽었다. 완독을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건너뛰어가며 대략 3분의 2 정도 읽었다. 그리고 동네신문에 책소개 기사를 쓰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한번씩 더 살폈다.
다른 음식이 아닌 밥(쌀) 자체를 주제로 한 책이라 재미있었고,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탄화미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쌀이 다른 곡식에 비해 한반도에 늦게 전파되었지만 주식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었고, 그 뒤로 이어지는 밥의 문화사 부분도 하나하나 놓칠 것 없이 재밌다.
어려서부터 나는 밥만 좋아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입맛이 그랬을 뿐이었을 수도 있는데, 늘 도시락을 먹고 나면 반찬은 남고, 밥은 모자랐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보다 두 배는 큰 밥통을 갖고 다녔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녀석이 밥은 남들보다 두 배를 더 먹었으니 친구들도 놀라곤 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그 밥을 다 먹고도 컵라면 하나를 더 먹었다. 친구들은 나와 밥 먹기를 좋아했다. 늘 반찬이 남았기 때문이다.(남들처럼 맛있는 반찬을 싸다닌 것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 동기들과 놀러간 MT에서 내가 밥통을 끌어안고 먹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기겁을 하기도 했다. 나중에 서울에 자취하던 동기 집에 놀러가려고 연락했더니, 그 동기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밥만 많이 해놓으면 되지?"
그런데 이 책에 나온 조선 후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밥 그릇과 국그릇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다. 밥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든 지금이라서 그런 걸까? 예전이었으면 별로 놀라지 않았으려나? 요즘 나는 그 시절에 비하면 반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먹는다. 한창 많이 먹었던 20대 후반 시절까지 나는 보통 한 끼에 두 그릇 반, 좀 입맛이 땅기면 서너 그릇 이상의 밥을 먹을 때도 많았지만, 30대부터는 한 그릇 반이 보통이었고, 30대 중반 이후로는 양이 더 줄어서 한 그릇 이상 먹는 일이 거의 없었다. 40대에 접어든 지금은 반 그릇 정도가 적당량이다.

한편 이 책에서 '구석기 식단'에 대해 언급하는 걸 봤다. 간헐적 단식 이후로 이젠 구석기 식단이 유행이 된건가? 이 구석기 식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설명을 보니 [다이어트 진화론]에 나오는 이보(EVO) 다이어트와 비슷한 것 같다.
이 책은 딱 몇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 당시에는 제법 일리있는 주장이라 여겼다. 특히 내가 밥만 많이 먹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더 와닿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지금 밥 먹는 양을 확 줄인 것도 이 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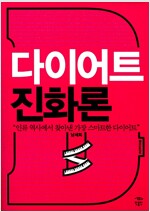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과 구석기 시대처럼 곡물 섭취는 확 줄이고 수렵, 채집 시대의 식단처럼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흥미롭다.
작년 가을 이후로 약 6개월간 제대로 운동을 못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 때문이다.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씩 집에서 운동을 했지만 규칙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현재 내 몸매를 보면 생각보다 양호하다. 예전처럼 밥을 많이 먹지 않아서 일 것이다.(여전히 술과 안주는 많이 먹고 있지만 ㅠ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밥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많이 먹지 않고 적절하게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밥이 아닌 다른 것을 위주로 먹어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 극단적인 느낌이 들어서 별로다. 그냥 먹고 싶은 것을 그때 그때 먹고 살면 좋지 않을까? 과하지 않게 먹고, 필요한 만큼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운동하면 좋을 것 같다. 내일은 일터 근처 헬스클럽을 찾아가봐야겠다. 여름이 다가오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