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 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 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 - 길 위에서 배운 말
변종모 지음 / 시공사 / 2014년 4월
평점 :



그리워하면
언젠가...[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

어젯밤
귓가를 앵앵거리다가 밤새 작은 아이의 얼굴이며 종아리를 사정없이 물어뜯어 놓았던 모기 녀석을 이 아침에 꼭 잡고야 말겠어. 붉은 실핏줄 드러난
눈으로 레이저를 쏘아대다가 서둘러 아이들을 씻기고 분주히 아침을 차린다. 남편과 큰 아이를 보내고 종종걸음으로 유치원 가는 녀석을 데려다 준다.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을 내주려고 나를 기다리던 집의 품에 안...기려는 찰나,
발치에
채이는 훌훌 벗어던진 옷가지에 무심히 눈길을 주게 되고 널브러진 장난감 조각들을 허리 굽혀 집어 올리게 되고 맨발바닥에 닿는 먼지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된다.
에잇,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자.
그러다
보니 땀방울이 송송 맺히고, 아직 세수도 안 한 얼굴이 유난히 번들거리며 기름져 보인다.
샤워하자.
욕실에
들어서니 또 가족들이 사용한 흔적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부터 뚜껑 안 닫은 치약, 욕조 안에 떠다니는 거품까지 거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눈에 띄고 또 띄는 잡다한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새 11시.
배가
꼬로록 거리기 시작한다. 아침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나.
한
가지를 끝내면 또 한 가지가 맞물려 시작되기 때문에 뭐 하려던 거였지,를 자주 까먹게 되는 주부성 치매가 이래서 생기는 거였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의 무게가 버거울 때, 현실과 완벽하게 단절된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TV 보기와 독서다.
드라마
시청의 기본인 본방사수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 나이기에 아침 시간에 TV는 잘 보지 않는다.
그러면,
독서.
특히
추리소설이 빚어내는 환각과도 같은 어찔함과 한 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글맛에 나는 중독되어 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 긴박한 사건 전개와 대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만 같은 신선한 매력을 가진 각양각색의 탐정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머리가
쿵쿵 울리고 심장이 빨리 달리며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이게 되는...그렇게 한 두 시간 책 속을 헤매다 보면 일상은 쉬이 잊혀졌다.
개다
만 빨래며, 저녁 거리 장 봐야 할 장보기 목록들은 가서 낮잠이나 자라지. ^^
그러나
추리소설의 세계만으로는 완벽한 도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현실이 아닌 남의 현실을 엿보고 싶어지는 이상한 심리가 내게는 있다. 그럴 때는
에세이를 찾아 읽는다.
번잡한
일상이 사라진, 완벽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행기들은 추리 소설 못지 않게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력이 있다.
변종모의
[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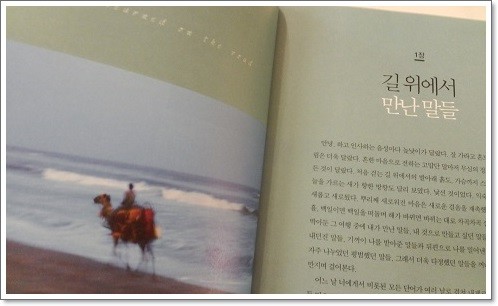
흐릿한
낙타를 쳐다보니 매직아이를 쳐다보는 듯, 이상한 나라의 폴이 끌려들어가는 사차원의 세계로 들어서는 듯...
호이호이
호잇~ 이다.
어느
곳을 걸어도 그가 걷는 길에서 말과 글을 제대로 건져낼 줄 아는 변종모. 그는 길을 나섰다가 훈자에서 5년 전, 매일 그를 찾아오고 그의 어깨에
목말타고 그에게 구구단을 배웠던 까까머리 꼬마 칸을 보고 고마워했다.
눈시울이
뜨끈해졌고 잠시 눈물도 났다던가.
나는
오히려 그의 글을 보며 행복해하는데...
그가
펼쳐놓은 말을 쳐다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똑, 똑, 하고 따서 꼬로록거리는 배 속에다 던져 넣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렇지?”(...)
아무래도
좋다. 다만 살면서 정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 사막을 기억하리라. 단단히 땅에 박힌 이 소금별의 편린을 떠올리리라. 그렇게
꿈인 듯한 비현실을 불러다가 이 반짝이는 순간들로 나머지 흐린 날들을 위로받을 것이다.
-207
나
대신 소금 사막을 건너온 그가 전해 주는 말들로 나는 비현실을 떠올린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쌓인 빨래와 먼지 수북한 바닥과 널브러진 책들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진저리가 난다. 가끔은 소금별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만으로도 숨쉬기가 조금은 편해진다.
그
언덕에서 할 말이 없었다. 나의 언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
차라리
바위처럼 침묵하자. 남은 것이 있다면 더 버릴 것이 있다면 이 벼랑 아래로 전부 팽개치고 슬며시 돌아서고 나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높이. 내가
발설하지 않아도 당신이 듣지 않아도 과거로 흩어져 나부낄 일들. 침묵만이 증언할 수 있다. 때로는 묻어두고 쌓아두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르고
숙성시켜 진실을 이루게 할 것이다. -235
어쩜.
지금 내 안에서 굳게 닫힌 이의 단단한 성문과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말들에게 꼭 필요한 단 한 마디, “침묵하라.”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
화를
꾹꾹 누르고서 차마 그 사람 면전에서 쏘아주고 싶은 말을 삼키고 대신 어깨를 꾹꾹 짚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거겠지.
나의
고통스런 기다림은 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여행자가 품어 온 지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잇는 것이겠지.
카톡.
아아,
카톡.
이놈의
카톡 때문에 왕 진지모드가 헤실헤실 풀어져 버렸다.
심하게
감정이입되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봐,
동생아, 사탕 크러쉬는 좀 쉬는 게 어때?’
붉은
사막 와디럼. 말이 되는가? 붉게 죽어 있다니. 말은 되는가 말이다! 죽은 것이 붉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막이 그랬다. 붉은 사막.
-258
(...)
어쩌면
차가운 외면보다 홀로 선 뜨거운 열정이 더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외로움의 온도마저도 뜨겁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 외로움이야 어떠랴. 자신만
좋아서 자신만 이해되는 일, 이것도 열정이다. -261
바람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지만 굳건히 뿌리내린 말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작가도 있는데, 일상의 삶에 완벽하게 뿌리박은 나는 왜 흔들리는가.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열정이
없어서인가,
잼을
만드는 동안 부글 부글 끓어오르는 솥처럼 화악 솟아오르는 화를 참아내기만 하는 것에 진저리가 나서인가.
혼자
남겨진 집 안에서 꼬로록 거리는 배를 안고 참, 혼자 생쑈를 다한다고 하겠다.
그래도
말들을 집어먹고 있으니 괜시리 포만감이 들어서 다시 배시시 웃음을 베어문다.
참
속도 없지. 참 무던하기도 하지.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무엇을?
무언가를.
아직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두어 시간은 남았다며 기뻐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변종모는
참 글을 잘 쓰네. 나는 언제나 되어야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나 되어야 홀로 구름에 달 가듯이 떠날 수 있을까나.
문득
이승철의 애절한 음색으로 읊조려지는 노래의 이 가사를 흥얼거린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결코 입밖에 내지 않았을 , 몹쓸 노래. 훗.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