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몬 - 권여선 장편소설
권여선 지음 / 창비 / 2019년 4월
평점 :




의식 없이 우리는 이 세계에 참여할 수 없다. ‘의식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을 때
우리가 참담해지는 이유이다. 줄리언 제인스는 “의식은 모두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로 생성되고 언어로 접근된다”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문예반 선후배
사이였던 상희와 다언은 시를 쓰고 싶어 했지만 그리하지 못했다. 상희와 다언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다언은 ‘참회록’ 비슷한 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십육 년 넘는 시간을 아우르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 소설의 주요 화자가 다언이니 이 책이 그 결과물일 것이다. 이 소설에서 시인이 된
사람은 가장 어울리지 않을 거 같은 윤태림이다. 불안과 우울, 죄의식으로 가득한 채 구원을 바라는 심리 상담과 시의 내용이야말로 참회록이지만
온전한 의식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다. 알다시피 죽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과거완료라 더
난공불락의 요새다. 어떻게 접근하든 더 많은 의미와 의문을 낳는다. 해언의 의문의 죽음도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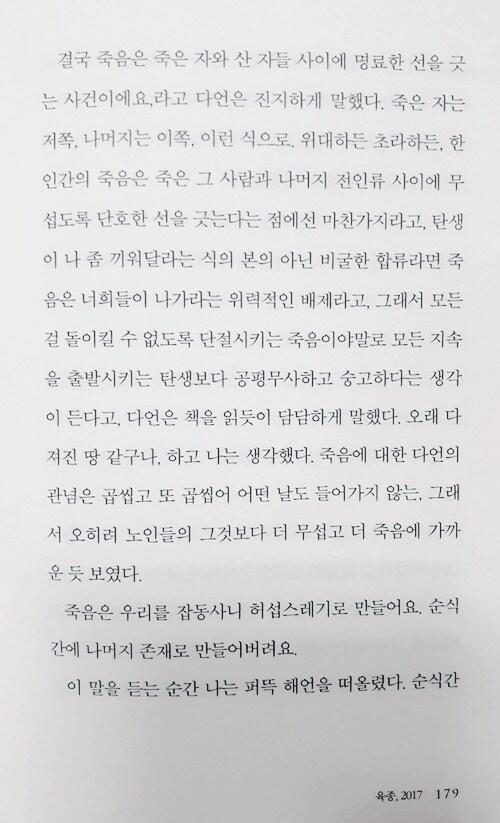
사망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었던 ‘혜은’으로 개명할 수 없었던 해언의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되돌리려 했고, 해언의 독보적인 매력이었던
아름다움을 다언이 자신의 성형수술로 복원하려 했지만,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무턱대고 시작되었다 무턱대고 끝나는 게 삶”이듯
다언이 언니 해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은 돌연하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해언의 죽음 관련자가 적당한 죗값을 받은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난쟁이 엄마와 누이동생만 있는 가난한 집 장남이라 새 신을 사지 못해 신을 직직 끌고 다니고 열두 살 때부터 푼돈을 벌며
학교에 다녔고, 열아홉 살에 살인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매를 맞고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학교에서도 쫓겨난 뒤 군대에 가서 육종에 걸려 늦은
조치로 불구의 몸이 되어 세탁공장에 취직해 화상을 입으면서도 베테랑이 되었지만 육종이 폐에까지 퍼져 서른 살에 죽는 한만우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한만우우우 이 세사아앙 야속한 임아”의 가사 때문에 별명이 「한오백년」이었던 소년에게 단 한순간도 신의 섭리나 온정은
없었다.
한계도 기한도 없어 상상이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다언의 참회가 이 소설의
처음이라면, 해언이 죽음으로 향해가던 그 길에서 교차했던 한만우가 그의 짧은 생애 동안 처음 느꼈을 낯선 희열의 순간이 이 소설의 마지막인 것은
바로 이어지는 「작가의 말」에서 이해된다. “평범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다, 평온하게 죽을 수 없는” 사람 삶에 대한 연민. 평(平)하지 못한
삶의 복판에 있는 ‘당신의 삶이 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의 상상은 거기서 멈춘다. 그다음 상상은 우리의 몫이다.
다언이 선택한 복수와 참회의 방식도 최선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2002년
해언을 잃었을 때는 “누군가 봄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잃었듯이” 그랬지만, 2019년의 다언은 자신이 무엇을 잃는지 알고 있다. 신을 믿지
않더라도 아니 그래서 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나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