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루 100엔 보관가게
오야마 준코 지음, 이소담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5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하룻밤만 자고나면 카페가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사라지는 서울 어디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소설속의 보관가게가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은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한번씩 생각 할 때마다 괴로운 사연들을
보관가게에 맡겨두고 찾고 싶을때 찾고 찾기 싫을땐 그냥 두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보관가게!

도쿄의 허름한 상점가, 서쪽 끄트머리쯤 위치한 보관가게!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게 실내장식과 앞 못보는 가게 주인 아저씨!
하루 100엔에 어떤 물건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관해주고
보관 기간안에 찾아가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지만 보관기간이 지나면 물건은 주인 소유가 된다.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돈 100엔에 처치곤란한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은 그걸 처리하는데 몇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별 이익이 없다는 것쯤 눈치 채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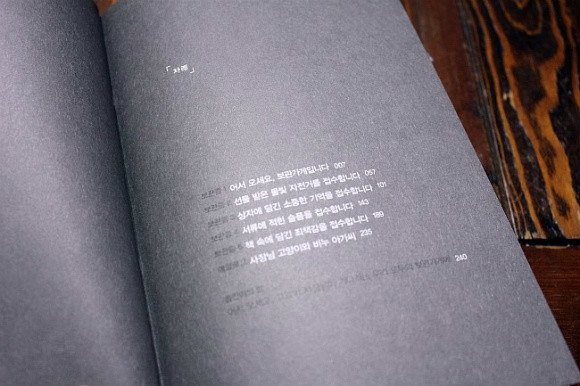
게다가 가게 주인은 물건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까지 맡아 보관해준달까?
눈이 보이지 않는 보관가게 주인은 어떤 물건인지 확인 할 수 없지만
후각과 기억력이 뛰어나 한번쯤 가게에 찾아온 손님과 물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재주가 있다.
그리고 늘 점자책을 들고와 읽어주기를 바라는 아주머니도 등장하는데
나중에 아주머니의 사연을 듣고 자신이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그 남자를 떠올리고
그가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돌려주게 되는데 맡았던 물건이 아닌 돈을 건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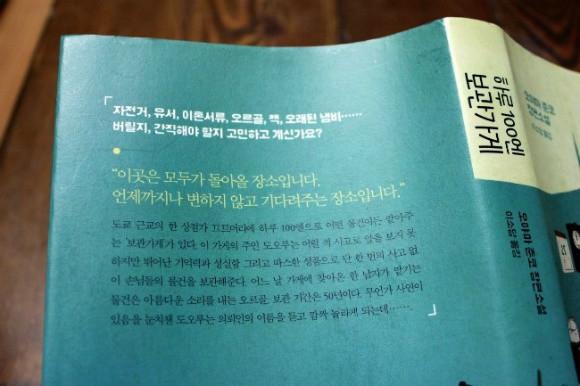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게 주인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처음엔 가게 현관문 위에 걸리는 사토라는 이름이 쓰여진 포렴이
보관가게에 맡겨졌던 반짝 반짝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물빛 자전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게에 놓여져 있던 유리진열장이
어릴적 보관가게를 통해 마법같은 기억을 갖게 된 어린 소녀,
그리고 고양이가 맡기고 간 하얀 고양이의 시각으로 쓰여져 이야기가 지루함없이 흥미롭고 신비롭게 흘러간다.

어마어마한 가치로 팔 수 있다는 오르골, 누가 맡긴건지도 모를 가방,
꼬마 여자아이가 맡긴 서류봉투, 소년이 맡기고 간 자전거,
오래된 낡은 냄비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들게 한 비누아가씨의 등장은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가 하면
사람의 인연과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까지 소중함을 가지게 만드는 신비로운 기분이다.
이런 보관가게라면 나 또한 내게 소중한 것들을 혹은 가지고 있기에 부담스러운 것들을
그에 얽힌 사연과 함께 보관하고 싶다.
유리진열장에 놓인 오르골의 트로이 메라이가 들리는것만같은 잔잔하고 아름다운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