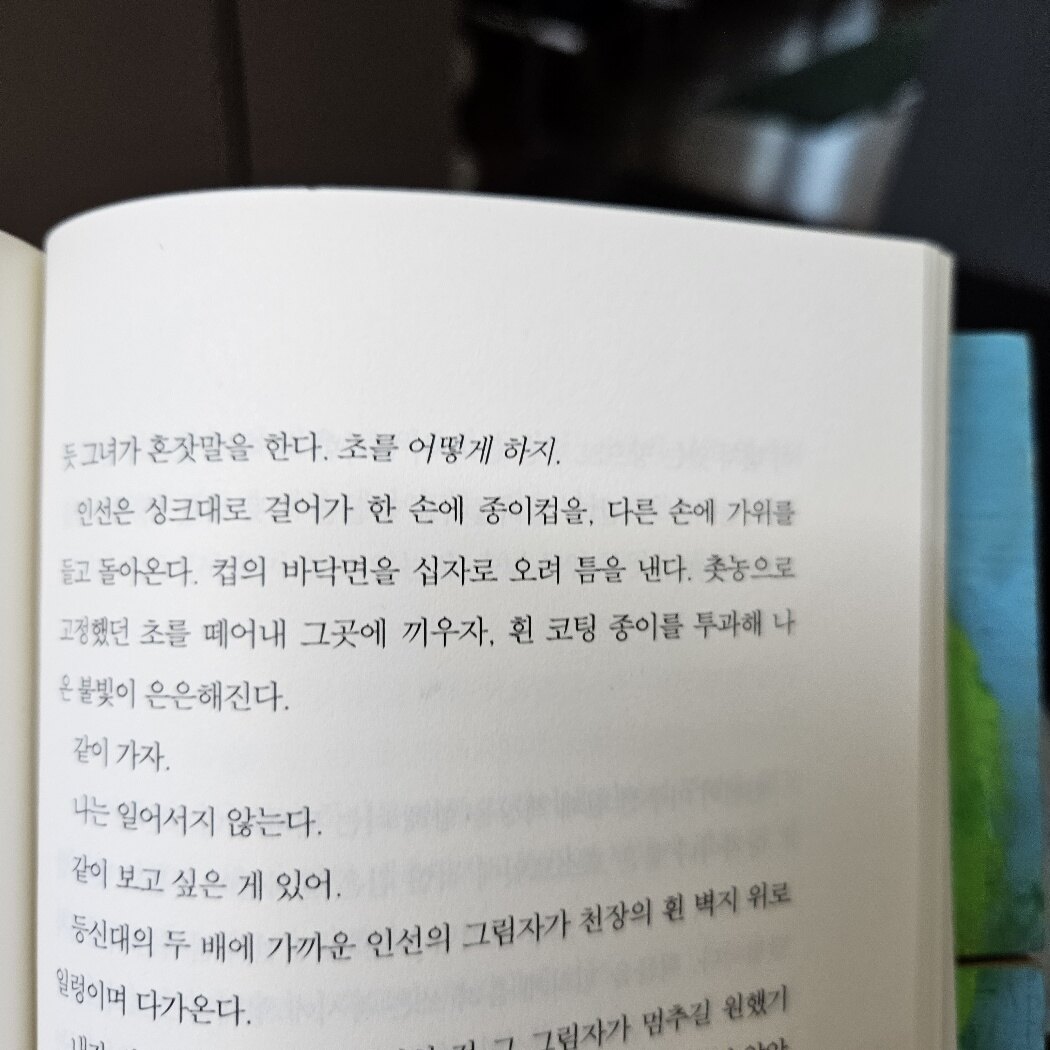‘인선은 허리를 수그리고 부엌의 식탁 위에 촛농을 떨어뜨리는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촛농이 충분히 모이자 그 위로 초를 눌러세웠고, 촛농이 우윳빛으로 굳기를 기다리며 붙잡고 있었다.‘
예전엔 초를 켤때 그랬어요.
가늘고 길다란 하얀 양초를 켤때,
심지에 불을 붙여 조금 녹으면
그 투명해진 촛농을 바닥에 몇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에 양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붙들고
촛농이 우윳빛이 될정도로 굳으면
(나중에 이걸 똑 떼어내는게 은근 힐링이었던)
그제서야 마음을 놓듯 손을 놓아요.
그래야 양초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거든요.
초를 켜는 일이 드문 요즘,
물론 향기양초를 켜기는 해요.
안전한 케이스에 잘 담그져 있으니
그냥 진짜 불을 켜기만 하는...
아날로그한 것들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이 주는 낭만이 있어요.
요즘은 촛불시위도 많이 달라져 초를 켜지 않지만
은은한 노란 불빛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그 초를 켜는 모양새를
한강 작가는 친구 인선을 통해 보여주네요.
‘여러 가닥의 구슬띠 같은 형상의 촛농이
식탁위로 흘러 굳어 있다‘
촛농이 흘러내리면 구슬띠 같이 맺힌다는 는 표현도 참,
종이컵에 초를 끼우는 장면도 나오네요.
뭐 이런 글에 꽂혀서....
거대한 눈폭풍이몰아치는 밤,
어두컴컴한 산장같은 집에서
초를 켠듯한 분위기로 읽게 되는 소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