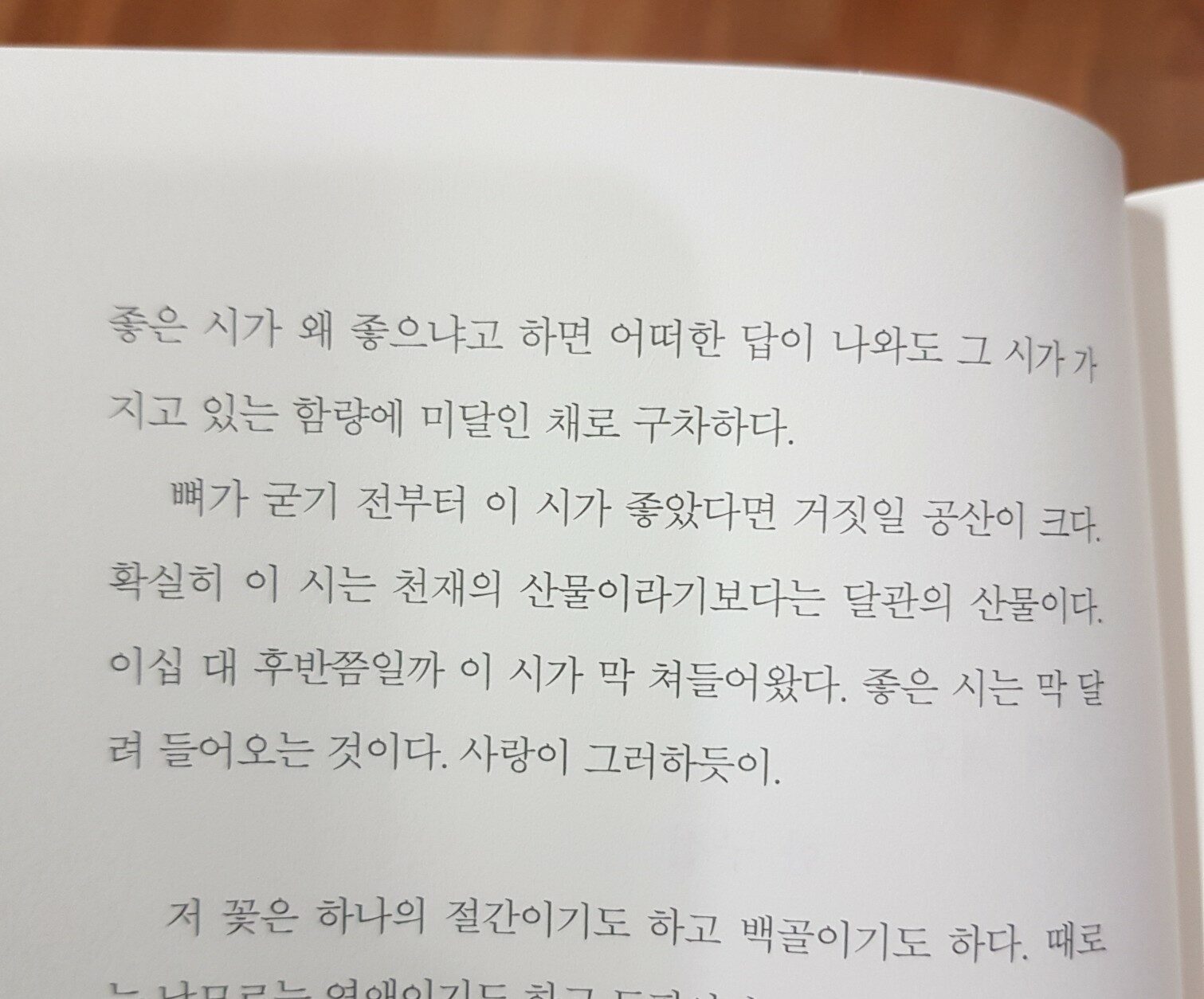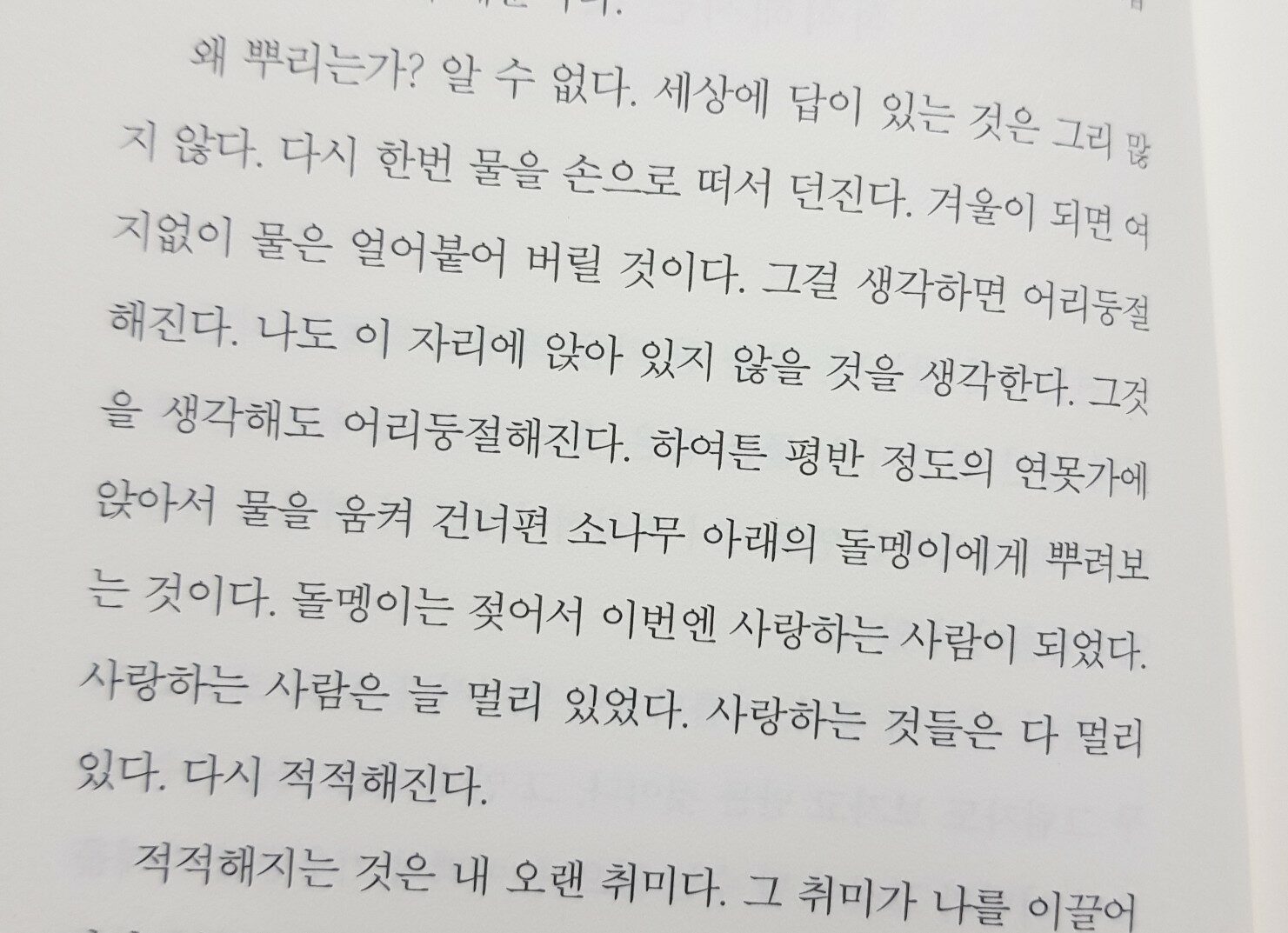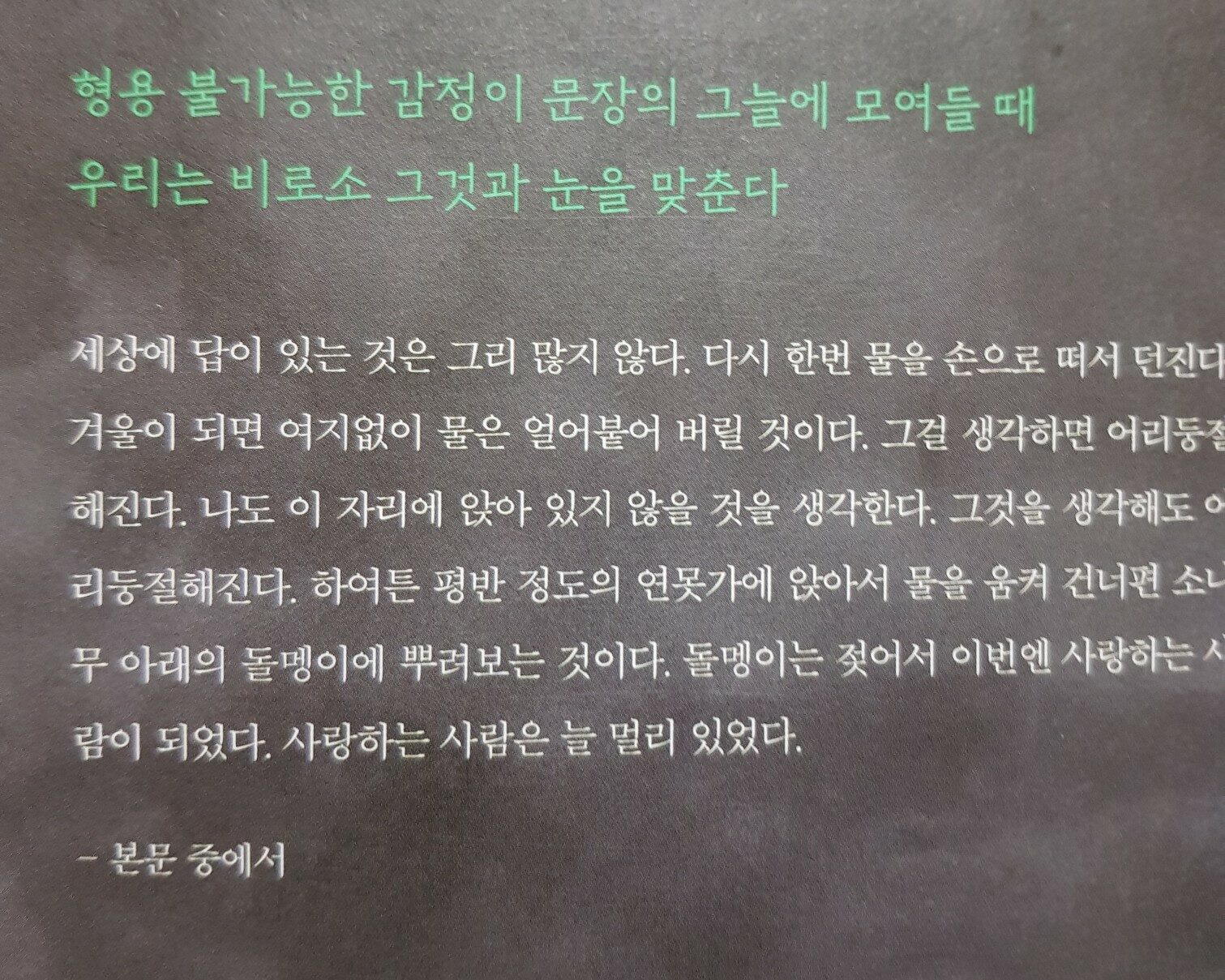그런 글이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차분해지고 사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글! 시인 장석남의 에세이 ‘사랑하는 것은 모두 멀리 있다‘ 가 바로 그런 책이다.
책 제목부터 벌써 쓸쓸함이 전해져오는 에세이, 사랑하는데 왜 멀리 있다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멀리로 떠난걸까? 아니면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어 멀리 있다는걸까? 사랑의 대상이 사람인걸까 사물인걸까? 혹은 우주 저 너머의 어떤것일까? 문득 궁금한 마음에 책장을 빨리 펼쳐보게 된다.
좋은 시가 왜 좋으냐고 하면 어떠한 답이 나와도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함량에 미달인 채로 구차하다.
좋은 시는 막 달려 들어오는 것이다. 사랑이 그러하듯이.
시인의 문장은 역시 남다르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시 한구절을 떠올려 옮겨 적으면서도 그 시가 좋은 이유를 구차하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좋은건 그저 좋은 것일뿐! 시가 달려온다는 표현도 사랑이 그렇듯 달려온다는 표현도 시인이 아니면 하지 못할 은유가 아닐까? 시를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어떤 느낌에 빠지들게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로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함락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시도 사랑도 내게 막 달려 들어오는 것이 맞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시인의 문장에 공감하게 된다. 아니 고독을 즐기지 않더라도 시인의 문장을 읽으며 나 또한 그런 때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된다. 인공 연못에 돌을 던지며 홀로 쓸쓸하고 적막한 시간을 즐기는 시인, 어느순간 돌맹이가 좋아져서 그 돌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일에 몰두하게 된 시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나 적막하고 쓸쓸하게 가슴을 파고 드는것일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내면의 어떤 것에 파문을 일으키듯 문장을 던지는 글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밤이 되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며 시인의 쓸쓸한 문장과 더불어 내 마음 한구석에 사색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