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 진지하고 심각한 르포르타주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한 사람의 오롯한 추억들, 사는 이야기들, 살아갈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듣고 싶을 때 '수필'이라는 장르로 다가가게 된다.
중학교 국어 시간,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수필'이라는 장르를 진지하게 조금은 지루하게 배우고 한 문장, 한 문장, 줄을 긋고 이미 해석되고 분석되어 버린 한 메모광의 메모에 대한 천착과 한 의사가 쓴 아버지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 그것을 둘러쌌던 그 분분하던 해석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깃거리들이 열네 살 독자의 생동하는 호기심과 함께 어우러져 남는다. 읽은 것들도 결국 추억이 된다.
나는 아이를 업는 데 서툴다. 요즘 나오는 아기띠들은 아이를 앞으로 안는 데에 더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애를 낳았을 때 친정 엄마가 동네에서 산 처네는 지금도 순전히 할머니용이다. 나도 흉내를 내어 보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게 허리도 못 펴겠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아이는 내 등을 줄줄 타고 내려온다.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아이를 업고 국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재우기도 한다.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키웠다고들 한다. 육아와 가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달팠던 것이기도 하고 더 가능한 것들이 많기도 했던 시간. '처네'는 그런 면에서 어떤 그리움, 아련함을 불러일으킨다. 목성균이라는 작가를 알지 못했는데 우연히 그의 유고 수필집 제목 <누비처네>가 너무 좋아 그를 만나게 됐다. 그의 유년시절, 청년시절, 중년시절, 노년시절을 아우르는 이 방대한 수필집이 마치 한 인간의 생애를 역사적, 지리적 배경과 잘 섞어 뭉근하게 끓여낸 것 같아 이 사소하지 않은, 소소하지 않은 이야기에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다. 그의 그 단아한 문장들, 마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묘사들, 귓전에 들리는 듯한 목소리들에 그저 아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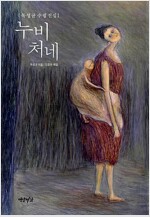
추석을 쇠고 우리는 아버지의 명에 의해 근친을 갔다. 강원도 산골 귀래 장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가위를 지낸 달이 청산에 둥실 떴다. 그때부터 십리가 넘는 시골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내는 애를 업고 나는 술병과 고기 둬 근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아내 옆에 서서 말없이 걸었다. 달빛에 젖어 혼곤하게 잠든 가을 들녘을 가르는 냇물을 따라서 우리도 냇물처럼 이심전심 걸어가는데 돌연 아내 등에 업힌 어린것이 펄쩍 펄쩍 뛰면서 키득키득 소리를 내고 웃었다. 어린것이 뭐가 그리 기쁠까. 달을 보고 웃는 것일까. 아비를 보고 웃는 것일까. 달빛을 담뿍 받고 방긋방긋 웃는 제 새끼를 업은 여자와의 동행.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구체적으로 알았다.- 누비처네 중
목성균은 이때 처지가 곤궁했다. 서울에 올라가 벌인 인쇄업은 어려웠고 차마 면이 서지 않아 첫애를 낳은 지 백일이나 지난 아내를 보러 고향집으로 내려가지도 못했다. 이러한 처지를 감안한 그의 아버지는 아이를 업고 근친을 갈 누비처네를 살 돈을 아들에게 소액환으로 보내 내려오기를 독려한다. 바로 그 누비처네에 아이를 업고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는 길의 이야기다. 그의 행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고백이 와닿는다.가난과 싸웠던 젊은 아빠는 마침내 아이 셋을 오롯이 키워내고 직장에서 퇴직 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그는 노년에 등단했다. 글만을 위한 삶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살아내고 그리고 썼다. 어린 시절 진외가의 개소주를 손주에게 먹이기 위해 친정길에 나섰던 할머니와의 추억들, 산림 공무원을 하며 오며가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야기, 중년이 훌쩍 넘어 아내와 여행 간 이야기, 손주들과의 아기자기한 한때. 그가 젊었을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이 업이었다면 갖지 못했을 이야깃거리가 많다. 불현듯 동인도회사의 회계원으로 수십년 간 일했던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이 떠올랐다. 그는 목성균과 달리 가정을 갖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생계를 위하여 매일 직장에 출퇴근해야 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그가 퇴직하던 날 그의 이야기는 초로의 사내가 썼다고 보기에 굉장히 발랄하고 사랑스럽다. 내게 아들이 있다면 이름을 '나싱투두'로 붙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하지만 찰스램이 회계원으로 근무했던 수십 년이 없었다고 해도 찰스 램의 다감하고 아기자기한 에세이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든다. 그러고 보면 레이먼드 카버가 돈을 벌며 막간을 이용하여 단편 소설을 써내고 목성균 작가가 문예창작가를 중퇴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나 직장에서 퇴직하고나서야 등단하고 찰스 램이 퇴근 후에야 글을 쓸 수 있었던 상황들은 무조건 비관시 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덕분에 우리는 비근한 일상사가 농밀하게 배어 있는 그들의 글을 곁에 둘 수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