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독학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꼭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아 덤비게 된 것. 유튜브를 보며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외우고 EBS 초급 일본어를 듣는다. 성시경의 일본 노래 가사를 활용한 일본어 강의도 듣는다. 그리고 두둥, 일본어 책을 샀다. 하루키의 <후와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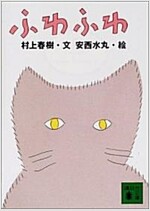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못 잡는 수준이 내 일본어 수준이긴 하지만...그러나 역시 하루키는 하루키다. 어렵다. 한 문장도 사전 없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블로그에 단어를 정리해둔 것을 찾아 그 단어를 모조리 적고 다시 읽어도 역시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다. 이건, 나이 때문일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일인데 그 확장도 가능한 연령 한계치가 있는 것일까? 돌아서면 전날 외운 단어를 까먹는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일어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더 못하는 것도 같다. 하기사 영어 공부한 세월을 생각하면 고작 육 개월도 공부하지 않고 바로 원서를 술술 읽고 싶어하는 게 말도 안된다 싶기도 하고...게으른 욕심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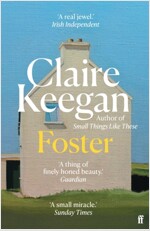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는 킨들에 원서로 먼저 다운 받아 놓았다. 아마존 리뷰도 극찬 일색이고 일단 분량이 적어서 바로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했다. 그 입구 허들이 높다고 해야 하나. 영 몰입이 안 되었다. 일단 클레어 키건의 문장은 암시적이고 함축적이다. 번역본을 봐도 쉽지 않다. 그 함축의 미가 클레어 키건 자신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이건 원작으로 읽어도 마찬가지다. 소녀의 마음은 언어의 필터로 다 걸러지지 않는다. 그 밑에 가라앉은 것들을 읽는 이들 각자가 알아 소환해야 한다. 쉽지 않다.
줄거리 자체는 복잡할 게 없다. 여름 방학 동안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를 떠나 나이 든 친척 집에서 지내는 소녀의 얘기다. 대단한 극적 긴장감도 없다. 그 친척 부부는 친절하고 따뜻하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 친절이 이 소녀에게 가지는 의미와 무게다. 줄줄이 딸린 동생들, 언니들 사이에서 소녀는 따뜻한 환대나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러한 소녀가 이 눈부신 여름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아이가 되어보는 경험이 이 소녀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누구나 한번쯤 몹시 춥고 소외당했던 유년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나만이 유일하게 흠뻑 사랑 받는 기회는 애석하게도 흔치 않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이는 누구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거슬러서 하게 된다. 그게 이 소설을 읽다 갑자기 툭 떨어지는 눈물의 의미일 것이다. 치유의 시간이다. 아일랜드 작가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것 같다. 트레버가 그랬고 샐리 루니가 그랬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행간에 거대하고 심오한 뭔가가 불거져 나와 마음의 어떤 현을 '딩'하고 건드린다. 그 공명감은 길게 여운을 남긴다. 잘 쓴 이야기란 이런 것이다. 많은 것들을 부연 설명하거나 과장하지 않아도 바로 건너가서 건드린다. 억지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그 여름에 이 친척 부부에게 맡겨질 수 있었다면...나도 이 소녀처럼 그랬을까 싶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