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실물의 서점, 그것도 동네의 서점 안에 들어서는 일은 일상의 풍경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서점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나는 아무리 책을 비싸게 구입한다고 해도 빈 손으로 나서지 못하겠다. 그런 서점에서 정갈한 책 배치를 통해 짐작하게 되는 부재의 서점 주인을 상상하면서 그의 딸일지도 모를 젊은 점원에게서 이 책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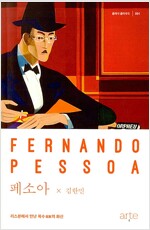
아르떼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클림트>를 통해 신뢰를 가지고 있던 터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다. 게다가 <불안의 서>의 페소아라면. 저자는 포르투칼과 페소아를 선택했고 실제 리스본에서 페소아 전문가와 함께 그의 수많은 이명의 삶의 경로를 그의 작품들과 함께 추적한다. 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리스본으로 귀향한 열일곱의 소년은 "내 영혼은 덜 보이는 것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문학적 성취의 색깔을 예고한다. 페소아의 삶은 괴이했고 동시에 지극히 단조로웠다. 그는 이름이 알려지기를 갈망했지만 생전에 이룩한 성과로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대신 끊임없이 오해받고 폄하되
곤 했다. "영혼 안에 울린 종소리"로 다가왔던 단 하나의 사랑은 곧 페소아 안에서 끝나버렸지만 상대 여성은 그 사랑을 불멸의 것으로 끌고 간다. 괴팍하고 고독한 작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텍스트적인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결국 불사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물질적 것들 안에 비물질적인 것들을 발견해 내고 발명해 내고 결국 그것의 허술한 경계마저 파괴하고 뚫고 나와 세상에 숱한 '자기'를 전염시켰다. 페소아의 복수의 이름들은 그러한 것의 단적인 예증이었다. 저마다 다른 캐릭터로 다른 음조와 속도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사람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포섭되었다. 말도 안되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목소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는 각각의 진실이 함유되어 공명했다.
오늘 나의 일부가 줄어들었다. 오늘의 나는 이전의 나와 같지 않다. 사무실 사환 아이가 떠났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보는 곳에서 없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없어진다. -[불안의 책], 텍스트 279 * 김한민 <페소아>에서 재인용
내가 두고 온 풍경들은 내가 떠나온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하루 하루를 소진하고 있을까, 반문하면 묘한 기분이 들곤 했다. 왠지 내가 떠나왔으니 그곳도 더이상 실재하지 않을 것만도 같았다. 아쉬운 작별 인사, 서글픈 잔상들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감해지지 않으려면 왠지 내가 떠난 그곳은, 나를 떠난 그들은 나와 함께 어딘가로 날아가버려야 마땅할 것만 같다. 페소아의 예리한 언어의 화살은 그 흐리멍덩했던 언어로 채집되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막연한 것들을 다시 소환하여 정렬시킨다. 바로 그거였다. 그가 말함으로써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들.
죽기 하루 전 그가 남겼다는 마지막 문장은 누구에게나 오늘 유효하다. "나는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디고 산다. 페소아처럼 위대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텍스트를 자신의 생에 아로새기는 일이기에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