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턴의 아틀리에 - 과학과 예술, 두 시선의 다양한 관계 맺기
김상욱.유지원 지음 / 민음사 / 2020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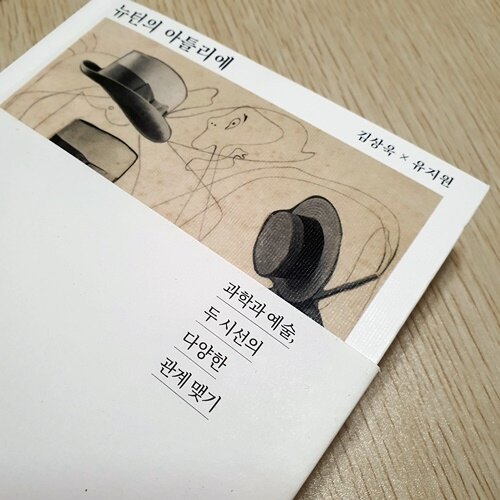
김상욱 교수를 처음 본 것은(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였다. 첫 인상은 달변가라기보다 조곤조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나의 생활반경을 고려한다면 과학자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때로는 다큐멘터리보다 큰 역할을 할 때도 있다.
문과 성향이 다분히 큰 나는 의식적으로 과학책을 한 권씩 읽는 편이다. 당연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고르다보니 동식물을 다룬 책이 많았다. 이 또한 내가 김상욱의 글을 읽을 일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덥썩 구입을 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 책은 과학자는 예술을, 에술가는 과학을 이야기한다.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영역에서 교차점이 생긴다. 김상욱이 이야기하는 예술은 쉽게 읽힌다. "물리가 답이 있는 질문을 다룬다면 미술은 답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리의 상상이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미술의 상상은 질문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p.7) 김상욱과 유지원은 서로 미술작품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말한다. "둘 다 '어떻게'를 먼저 질문한다. 회화에서는 화학의 질문이 되기도 하고, 설치작의 스케일이 아주 커지면 공학의 질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작가의 상황과 의도와 마음에 한층 다가서게 된다."(p.10)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평면에 펼쳐진 도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형이 내포한 의미와 그 의미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의미를 본다. 의미와 새로운 의미들은 맥락을 생성하고 맥락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 없던 의미를 추가로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그림은 의미의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인간의 뇌는 세상 자체를 이야기로 인식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우리의 뇌가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라 대상과 배경, 색깔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화면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하나의 화면은 창작된 이야기와 같다.
"인간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제대로 소통하는 것은 기적이다." (p.49) 백영옥 작가가 한 말이다. 최근에 나는 '소통'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읽거나 듣고 판단해야 하는 정보, 나로 하여금 추가로 시간을 쓰게 만드는 정보(p.55)는 우리의 주의력을 필요로 한다. 정보가 과잉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창조적 생산성이 높아진다.
유지원은 <이상은 「오감도 시제4호」를 어떻게 '제작'했을까?>에서 이상이 《조선중앙일보》에 이 시를 발표한 1934년에 금속활자를 가지고 어떻게 뒤집히고 반전된 글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나는 이상의 시를 제법 많이, 자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쇄법에 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지금이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된다지만,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제작할 수 있었을까. 유지원은 타이포그래피를 연구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것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시(詩)를 읽으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를 접한 순간 머리가 띵~ 울렸다. 이상이 추가했을 거라고 짐작되는 공정을 직접 해 봄으로써 그것이 사진임을 알아낸다. '어떻게'가 해결되는 순간 '왜'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왜 굳이 그 어려운 작업을 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 "시는 그래픽 이미지가 된다. 인간의 음성으로부터 더 멀어지며, 서술적인 텍스트로 읽히기를 거부"(p.91)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자연'과 '자연스러움'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p.117) '자연스러움'이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받아들이는 관념이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기계에 대비하여 쓰는 말이니 '자연'에 더 가까우며, '동물'에 대비해서는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쓴다. 물리학자의 시각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보는 것은 눈의 작용인 동시에 뇌의 작용이다. 눈은 '감각'하고, 뇌는 '지각'한다."(p.148) 눈으로 본 것은 뇌 안에 있는 배경지식이나 기억의 맥락으로 해석하여 완성된다. 이를 통해 사람은 '감정'을 끌어낸다. 시각과 촉각은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다. 즉, 우리는 만지기 전에 보는 것으로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과학 속에 예술이 있고 예술 속에 과학이 있다.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기에 수학이나 예술이 존재한다. 우주는 수학과 물리학으로 기술되고, 인간이 수학과 언어로 기술할 수 없는 것을 예술이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예술을, 예술가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