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데드 존The Dead Zone 시즌 4, 2005
원작
: 스티븐 킹
연출
: 존 카사르, 제임스 A. 콘트너, 로버트 리버맨 등
출연
: 소니 마이클 홀, 니콜 드 보에, 크리스틴 댈튼 등
작성
: 2007.06.20.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필연과 악연만이 있을 뿐.”
-즉흥
감상-
다른
외화시리즈보다 빠른 속도로 격파해나간다는 기분이 들었기에 다시 확인해보니, 보통 24회씩 한 시즌을 마감하는 다른 시리즈와는 달리 이번 작품일
경우 각 시즌 당 20회를 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나리오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인지 불규칙적인 방영을 한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매 회가 흥미진진하다 판단되기에 용서(?)하며 이번 이야기 묶음을 조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두통의 원인을 찾고자 병원을 찾게 되는 주인공은 ‘데드 존’을 통해 보게 되는 ‘비전’의 종류에 따라 뇌에 부담을 주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알게 되고,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이 스틸슨과 관계있다고 결론을 내린 레베카가가 스틸슨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앞선 시즌의 사건을 통해 연인사이가 된 레베카의 스틸슨 암살계획을 막아낸 주인공은 미래로부터의 원조를 끊고 다시금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데드 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래로의 ‘비전’을 보는 여인을 만나는 등 앞선
이야기보다도 좀 더 심도 있는 사건들을 통한 다양한 실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의 미래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계속 되지만, 그를 향한 운명의 바람은 그 기세를 점점 매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번
이야기 묶음일 경우 원작을 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산뜻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하고 싶어지는데요. 바로 주인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팡이가 버려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비록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부터도 조금 다르긴 했지만, 이로서 원작에서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렸다는 기분에 드라마는 그 자체의 스토리 라인에 진입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원작을 통해 알고 있는 미래로의 마침표를 만날
것인지, 아니면 던져진 답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해석을 만나게 될지 그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마지막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즉흥 감상도 바로 그 이야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시리즈물에 대한 감기록일 경우 저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던 관계로 ‘시즌 5’가 끝나는 대로 그 마지막의 내용을 간추려볼까 합니다만,
뭐. 정 급하시다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군요(웃음)
어떤
한순간의 선택과 그 방향성에 따라 무수히 분리되는 평행차원들. 문득 ‘시즌 1’의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사고가 나기 전의 주인공이 나무위에서
강연한 수업내용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아래에서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나뭇잎사귀를 보지. 구성도 없고, 조직도 없이 무작위로 널리
퍼져있어. 그렇지만, 자연에서 무작위인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이 위에서, 우리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햇볕을 받기 위해서 말이야. 이것이 자연의 태피스트리란다. 그리고 언제나 놀라운 것이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태피스트리tapestry’란 명사로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벽걸이나 가리개 따위의 실내 장식품으로 쓰며, 일반적으로
날실에는 마사, 씨실에는 양모사나 견사를 쓰는데 고블랭직이 가장 발달한 것이다.’라는 사전적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고자하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의 모체로부터 뻗어나간 무수의 나뭇가지들과 나뭇잎사귀를 빗대서 설명하는 주인공의 삶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인생에 대해 미리 예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기나긴 여정의 밝게 빛나는 마침표를 만나기에는 주인공의
말처럼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완벽한 직물을 만들기 위한 아슬아슬한 이 작품의 철학 짜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중얼거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슬슬 마감이 임박해온다 판당중인 ‘시즌 5’를 기다려보며 이번 감기록은 여기서 마치고자합니다.
TEXT
No.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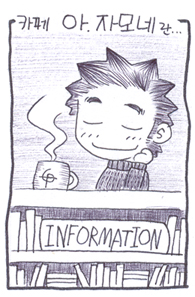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