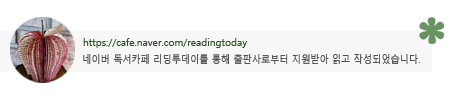-

-
시와 산책 ㅣ 말들의 흐름 4
한정원 지음 / 시간의흐름 / 2020년 6월
평점 :




한정원의 에세이에선 편안함이 다가왔다. 금정연 작가님 정지돈 작가님의 무게감 때문에 한정원 작가님의 글이 더 반갑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다.(이렇게 적으면 세분 작가님 다 서운해하시려나?)) 아무튼 지금의 나로서는 이 책을 읽은 소감이 그러하다. 그리고 어릴 적 연애편지를 대필해서 써준 이야기라든지 과일 장수 아저씨와의 추억 이야기라든지 아픈 과거의 이야기라든지... 소소한 에피소드는 사건의 경과가 제법 나타났지만 꽤 진지한 아픈 경험은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공감이 갔다. 이전과는 절대 같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이...
한정원 작가는 에밀리 디킨슨과 이웃해서 살았다면 꽤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것이라 언급한다. 그녀와 시대도 성격도 격차가 있지만, 왠지 영혼의 몇몇 지점이 겹쳐진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밀리 디킨슨의 인생을 살짝 언급해 놓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참 관심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것 같다. 솔직히 자기 삶 살기도 바쁜데 남 사는 거에 그리 관심이 많다는 게 신기하다. 아무튼 한정원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녀는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았다. 바깥세상에 나가봤는데 별 마음을 끄는 게 없길래 은둔했고, 흰옷을 입은 자신이 가장 멋져 보이길래 흰옷만 입었다. 그것뿐이다.
맞다. 사람들은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숨은 뜻을 파악하려고 하려 들 때가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봐주면 좋을 텐데 말이지...
한정원이 즐겨 있는 저녁용 시집이 있다고 한다. 릴케가 만년에 10년을 걸쳐 쓴 [두이노의 비가]라는 시인데 한 구절을 언급해 놓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세계란 우리들의 내면에 아니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삶은 변용하며 떠나간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시시로 초라하게 사라진다.
'변용'이라는 딱딱한 어휘에는 번역자의 주석이 달려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기는 것." 바로 저녁이 하는 일, 저녁에 벌어지는 일이다. 124쪽
사실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애매하고... 뭔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기고 싶어 언급해 보았다. 한정원의 글은 처음에는 가볍게 다가왔다가 책을 다 읽을 때쯤이 될수록 점점 내면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과 인상을 받는다. 그의 문체는 편안함이었고, 그 속에서 뭔가 생각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