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런 날씨에 어울리게 기온도 제법 쌀쌀했다. 저녁에 인터넷으로 야구중계를 보는데, 비바람이 작정하고 9회말을 겨냥했는지 선수들을 괴롭혔고 경기 진행까지 위협했다. 투수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려다 발을 삐긋, 어쩔 수 없는 보크까지 범했다. 궂은 날씨가 보크로 이어지는 기이한 광경을 지켜 본 하루다. 그래도 그 투수는 끝까지 투혼을 보이면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우리는 우리 뇌다>는 최근에 나온 뇌 과학 에세이다. 흔히 뇌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몸의 일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자는 뇌 자체가 우리라는 식으로 급진적인 접근을 꾀한다. 따라서 이런 모양새에는 결국 결정론적인 성향이 농후할 수밖에 없다. 선천적인 것보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딴지를 걸고 싶어 근질근질해질 것이다. <초공간>이란 책으로 유명한 미치오 가쿠는 물리학에서 뇌과학으로 잠시 관심을 옮겼는지 <마음의 미래>라는 책을 내놨다. 첨단 뇌과학도 뭐 결국엔 현대 물리학 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니다. 이 책은 흔히 초능력이라 볼 수 있는 텔레파시나 염력 이동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물론 초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간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중 과학서의 냄새가 많이 난다.
올리버 샥스의 책들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앨런 로퍼의 <두뇌와의 대화>도 괜찮을 듯싶다. 처음부터 뇌과학에 관한 설명이나 용어가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념처럼 나오니까, 부담이 없을 것이다. <뇌, 신을 훔치다>는 원래는 다큐로 만들어진 '신의 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시작한 다큐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쉬움이 남았던 프로그램이다. 뇌 안에 신을 느끼는 부분, 신에 가까이 다가갈 때 활성화 되는 뇌의 부분을 더 과학적으로 길게 접근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한 다큐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편집을 통해 줄인거 같다.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기획 의도에 맞게끔 충실하게 다루어졌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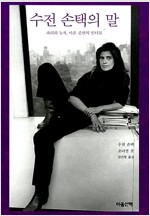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이란 부제가 달린 <음식의 언어>는 -언어학자가 음식에 대해- 쓴 책이다. 단순해 보이는 제목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정보로서 담긴 셈이다. 문화인류학에선 낯선 일이 아니지만, 요새는 철학, 인문학을 통해 음식에 다가가는 흥미로운 접근들이 더러 있다. 하긴 음식에 담긴 역사, 장소, 그리고 기호는 꽤 다양한 텍스트를 발산할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책의 성공은 결국은 그것을 다루는 저자의 풍부한 감성과 내공에 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책을 읽으면 뇌 속에서 어떤 풍미가 느껴질지도 모를 일..
수전 손택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이 익을 것이다. 손택의 주도하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나온 말은 색다르고 더 친근함을 줄 것이다. 이 책 <수전 손택의 말> 같은 인터뷰가 담긴 책처럼 말이다.

글, 문장을 다듬도록 도움을 주는 책들은 찾아보면 상당히 많다. 근데 뭔가 비슷비슷한 느낌을 준다. 마치 후다닥 글에 대한 요령만 알려주는 건조한 형식들마냥.. 그 사람의 오랜 세월, 그 습기가 배어 있는 책이 이런 건조한 분위기, 갈증을 풀어줄 것 같다. 예감이긴 하지만, 이 책 <동사의 맛>에는 그런 즐거운 습기가 감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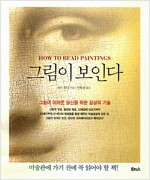

이 책도 BBC 다큐의 결과물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안 된 거 같다. 그런데 책의 설명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인다. <하워드 구달의 다시 쓰는 음악 이야기>는 저자가 정말 다시 쓰려는 마음을 먹고 쓴 책 같다. 음악사를 형식의 변화보다는 '소리의 혁신'이라는 시각에서, 다른 책들이 주지 못하는 시원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것 같다. 특히 이 책의 번역자는 미학, 예술에 과한 좋은 책들을 꾸준히 소개해 왔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
<그림이 보인다>는 대중들이 미술에 다가서기 쉽게 꾸며진 책이다. 이런 책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 그래도 왠지 놓치기엔 아쉬울 거 같은 아기자기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책들이 대중들의 입맛에 너무 맞추다 보니, 그냥 유명한 그림들을 떡하니 올려놓고, 차례대로 에피소드나 중요한 것들을 건드리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개별적인 자극들은 있지만 묵직한 것이 남기엔 부족했다. 이 책은 차례를 보면 알겠지만, 그림의 문법이라는 시작을 통해서 형태와 바탕, 매체, 구도, 스타일, 기호, 상징 등 꼭 짚고 넘어갈 것을 다뤄 미술에 대한 기본을 추스리게 만든다. 이어서 본격적인 그림 감상에 들어가면,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 등 체계적인 접근이 눈에 띈다.


<티벳밀교>는 티벳밀교의 -역사와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성을 잘 살린 책이라 평가를 받는 책이다. 이는 티벳에서 인도로 망명, 지금은 일본에서 활동중인 출팀 깰상과 일본인 학자 두 명이 상보성을 발휘한 덕분으로 보인다.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은 초기불교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아는 개론적인 내용에 살짝 여진을 줄 만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저자 틸만 페터의 문헌학적인 접근이 초기불교에서 새로운 풍경을 찾아냈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광경에 눈길을 뺏길 필요는 없겠다.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어떤것이 더 타당한지 곱씹는 자세가 바로 공부가 아니겠는가.
-그 외 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