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와도 더운 날이 많지만, 창밖에서 잔잔하게 내리는 날은 그래도 선선한 감이 있다. 이런 날은 멀리 했던 책도 집어서 펼쳐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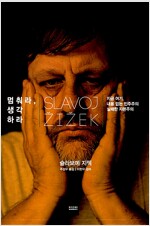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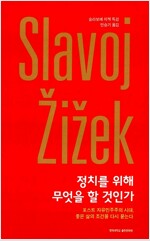
지젝의 굵직한 책들은 이미 꽤 나왔고, 이젠 지젝의 파편을 수거할 차례인가? 물론 대담집이나 강연문 등을 얕잡아 보자는 건 아니다. 어쨌든 출판사에서 지젝의 발이 어느 정도라도 담겼다면, 그것들을 텍스트 형태로 가공해서 내놓으려는 건 사실이다.
그의 출세작?이라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지젝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한 듯 하다. <멈춰라, 생각하라>, <임박한 파국>,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은 그러한 호소가 많이 깃든 결과물로 보인다. 특히 뒤에 두 권은 강연문이라서 더욱 그러한 모양새가 강하다.
<지젝의 기묘한 영화 강의>라는 영상물도 눈에 띈다. 지젝 특유의 영어 발음과 제스처가 인상적인데, 영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엮어나가는지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






근대와 관련해서 일본은 유독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당시 유럽 열강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그러할 테지만, 일본은 좀 특수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근대화가 강요된 면도 있지만, 자발성도 이에 못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그림자 처럼 우리나라에 투영되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 면도 강하다. 따라서 단순히 먼 이웃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일본근대사상비판>이란 책은 독창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보긴 조금 어렵다. 비슷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담은 책들은 찾아보면 더러 보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런 류의 책에는 유독 '타자', '시선' 이런 제목들이 공통적으로 끼는데,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도 서양의 거대한 담론을 다시 쓸 수 밖에 없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더운 여름을 잠시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귀신'이다. 동양에서의 귀신은 그냥 뭇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가벼운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 하나의 토론 대상으로도 격상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귀신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음양과 氣의 차원에서도 다뤄질 수 있겠다. 고야스 노부쿠니의 <귀신론>은 '귀신'을 가볍거나, 흥미위주로만 다룬 책은 아니다. 여기에는 주자의 귀신론이 들어가 있지만,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자철학의 귀신론>을 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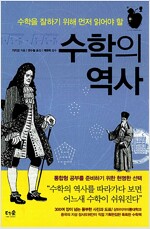


이젠 지긋지긋한 수학을 어쩔 수 없이 마주 칠 일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편하게 교과서적이지 않은 수학책을 건드려 보고 싶을 때가 있다. 두뇌에서 수학을 추방하고 사는 것은 홀가분하긴 하지만, 때론 두뇌에서 그런 일방적인 결핍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한다. 지즈강의 <수학의 역사>는 편한 마음으로 수학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같다. 저자가 중국사람이라서 서양에만 편중되지 않고 동양의 수학사도 균형있게 넣었다.





<-그 외 읽을 만한 과학 책들



<이것이 현대적 미술>이란 책은 제목 그대로다. '현대미술'을 다룬 책들은 꽤 많고, 비슷비슷한 구성들이다. 고전작가들에 비해 낯선 (주로 젊은 작가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기괴한 그림이나, 설치물들이 도판을 통해 제공된다. 그래서 읽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 책의 미덕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빠질 순 없겠지만, 작가의 문제의식을 살피는 부분이다. 또한 저자는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이들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젠 이런 사전들도 나오는구나, 하는 반가움이 앞선다. 물론 일본 학자들의 수고가 깃든 책들이긴 하지만... 사전하면 떠올리게되는 용어만 가득, 빼곡한 사전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사전 시리즈는 현재 네 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헤겔사전>이 가장 탐이 난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었기에, 같은 동양인으로 그 덕을 조금 더 볼 것 같다. <니체사전>도 앞으로 나올 거란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매우 기대가 된다.









<영어 글쓰기의 기본>은 꽤 알려진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전에 두 번이나 나왔던 책이다. 영어로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핵심들(쉼표를 찍는 법 등등)을 짚어주는데, 더불어서 문법사항도 다루기 때문에 영어공부에 도움이 클 것 같다.





어휘를 재미있게 공부하기에 <원서 잡아먹는 영단어>란 책이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사전 없이도 낯선 단어를 만났을 때,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디엄 600개 내 영어가 살아난다>와 <구동사 600개 내 영어가 쉬워진다>는 나름 독해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화 <명량>이 벌써 600만, 7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관객수 신기록 달성도 명량해전급으로 놀랍다.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의 해전 하나를 가지고서도 소설이나 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하다. 나도 이런 영화 밖까지 이어지는 이순신 열풍에 짐짓 점잖을 빼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런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너무도 뻔한 이미지 말고, 더 세세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한 두 번은 운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전투에서 절대 지지 않은 그러한 전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특히 왕을 비롯 조정에서도 그리 탐탁치 않게 보는 분위기에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건 더 어려웠을 것이다. 시간이 나면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대면하고 싶은 생각이 일렁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