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은 80년대 (번들거리는) 화장기로 버티다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말이 있다. 그보다 오래 전에 재즈는 전기가 가득 넘실거리는 기타를 앞세운 록 앞에서 큰 위기감을 맛봐야 했다. 그래서 마일즈 데이비스의 [비치스 브루]라는 기괴한 앨범을 낸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음악도 돌고 도는 법! 재즈도 죽었다고 했고, 록도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즈와 록은 시디에 몸을 실어 연명을 계속한다. 혹은 새로운 돌연변이들을 계속 만드는데, 재즈록이라는 (인간적인) 미학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럴듯한 결합도 있고, 프리라는 극단으로 치달아 소음으로 얼룩진 불협화음의 집합들도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만을 꼭 들으라는 법은 없다. 요새 첨단 음악이 어떤 해괴한 모양으로 나오는지 상관없이, 과거의 음반을 건드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누구는 아직도 지글거리는 엘피판으로 운치나게 음악감상을 하지 않던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와 엘피 혹은 시디만 있다면, 2010년에도 1970년대의 음악은 현재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록의 창조력이 고갈이 되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태 세계 곳곳에서 나온 음반들, 들을 만한 곡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도 희귀앨범들이 발굴되어 소수 매니아들에게 배달되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그러니 실감나지 않는 록의 죽음 앞에서 록의 잔치는 계속 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선 사이먼 프리스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사운드의 힘>은 -록 음악의 사회학-이라는 부제처럼 록에 대한 진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이런 류의 책은 매우 드문 편인데, 오래 전 책이만, 필독할 만 하다. 최근에 나온 페터 비케의 <록 음악>도 사이먼 프리스와 비슷한 무게와 흐름을 갖는 책인데, 전자에 비해 덜 지루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도 눈에 띈다.
위의 책들처럼 록의 이데올로기니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록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 책이 있다. 물론 이런 책들도 고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숫자가 적다. 먼저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이란 책이 있다. 1960년대 플라워 무브먼트부터 우드스탁의 열기 등이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비틀즈 뒤집기>는 제목과는 달리 비틀즈에 대한 책은 아니다. 이 책도 록의 잡다한 풍경과 진행과정을 잘 담고 있는데,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는 못하다. 그래도 록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펼칠만한 책이다.














록이라는 주제로 이데올로기나 연대기순의 나열을 벗어난, 독자적으로 짜여진 텍스트를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록 음악의 미학>은 매우 차별적인 색감을 드러내는 책이다. 철학교수이기도 한 저자의 지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접근이 돋보이는데, 재즈나 클래식과 다른 록 음악에서의 레코딩의 위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즉 록에서의 레코딩은 라이브의 거울 같은 재현과는 전혀 다른 지점을 갖는데, 음의 기술적 조작을 통해 새로운 음악에 도달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기도 한 셈이다. 이 점을 저자는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케임브리지 대중 음악의 이해>는 록 음악은 물론이고 대중음악 전반을 다룬 매우 질 높은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이먼 프리스라는 이름을 볼 수있다. 최근 이안 감독이 만든 <테이킹 우드스탁>이란 영화가 있다. 우드스탁에 대해 기대했던 록의 향연과 관중들의 함성이 녹아내린 장관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쉬운 기대를 비켜가서 감독은 더욱 진실한 우드스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드스탁은 록에 떨어진 핵폭탄이 아니였을까? 그 열기와 남은 흔적들이 아직도 계속 우리 곁으로 밀려온다. 지미 헨드릭스의 접신들린 연주 모습과 함께..




잠깐 록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음악(학)에 접근하려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몇 권 들춰보자. 빅토르 주커칸들은 (나의 경우에) <소리와 상징>이란 책으로 처음 알았다. 음악의 핵심이라 할 만한 주제를 수준있게 다룬다는 인상을 받았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역시도 음악의 기본 요소들을 그의 음악내공으로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은 '인지고고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이 인간의 음악을 바라보는 톡특한 시선이 담긴 책으로 보인다.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꽤 흥미롭게 다가 올 거 같은,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교양을 얹어 줄 책으로 보인다.









만화로 친근하게 엮은 <Paint it Rock>은 왠지 탐이 나는 책이다. 비슷한 내용도 만화로 나오면 왠지 보고싶게 만든다. 다시 록을 차근차근 훑어 볼 책을 골라 보자. <시대별 ROCK을 찾아서>는 흔히 말하는 록의 명반을 시대순으로 엮은 것이다. 간단한 앨범 설명까지 곁들여서 그야말로 록의 굵직한 아이콘들을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금 아쉬운 점은 책에 나온 아티스트 이름이나 앨범명 철자(알파벳)가 틀린 곳들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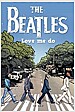








한 뮤지션, 밴드를 인물 중심으로 다룬 책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역시 비틀즈가 압도적이다. 최근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레드 제플린이 음악이 아닌 책으로도 나왔다는 것이다. <레드 제플린>이란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다양한 사진자료와 그들의 빛과 어둠이 담겨 있다. 책 가격이 비싸지만 나 역시도 이 책을 사고야 말 것 같다. 에릭 클랩튼 역시도 빼 놓을 수 없는 양반인데, 록의 예술적 경지를 드 높인 그의 젊은 시절의 공은 아마 록 매니아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지만, 록, 포크사 그리고 미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밥 딜런에 대한 책도 몇 권 눈에 띈다. 이 책을 옮기면서 이 페이퍼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