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사진 작가 헬무트 뉴튼이 그렇게 자주 보던 흑백 고전 영화가 바로 막스 오퓔스 감독의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헬무트 뉴튼의 흑백 사진 중에는 그러한 영향을 짐작케하는 작품들도 더러 보인다.





이 감독도 프랑스 영화작가들에 의해 재발굴된 경우에 속하는데, 트뤼포는 그를 장 르느와르, 로베르 브레송, 장 꼭토 등과 함께 작가라는 격을 부여한다. 막스 오퓔스는 특히 인간의 '욕망'을 스크린이라는 그릇에 담는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여러 작품이 DVD로 나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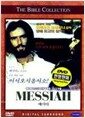
 <무방비도시>는 최근에 손예진이 나오는 우리나라 영화의 제목하고도 같다. 물론 제목만..
<무방비도시>는 최근에 손예진이 나오는 우리나라 영화의 제목하고도 같다. 물론 제목만..
 감독의 이름에 미리 기대어 대표작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영화라니, 도무지 통.."이라며 가벼운 찜찜함을 속으로 낙서하듯 되뇌이는 영화들이 있다. 전에 <독일영년>을 보고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만큼 감정이 복원되기도 한다.
감독의 이름에 미리 기대어 대표작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영화라니, 도무지 통.."이라며 가벼운 찜찜함을 속으로 낙서하듯 되뇌이는 영화들이 있다. 전에 <독일영년>을 보고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만큼 감정이 복원되기도 한다.
뭐.. 시점이니, 카메라와 대상과의 거리가 객관성과 주관성에 어떻다느니 하는 것은 생략하자. 어쨌든 다행히도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영화 몇 편이라도 여기 이렇게 존재하니까. 특히 아직 보진 못했지만, 로셀리니의 여인 잉그리드 버그만과 함께 한 <이탈리아 여행>도 있으니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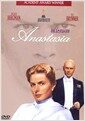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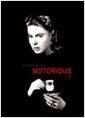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온 영화들>
히치콕의 <스펠바운드>와 <오명>에서 탱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에 남는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이창>에 나온 그레이스 켈리랑 가끔 헷갈리곤 한다. <성 메리의 종>도 재미있게 본 영화고, 그녀의 대표작에 속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어릴 적에 명화극장 이런 데서 하는걸 언뜻 본 기억이 나지만, 제대로는 아직 못 본 영화다. 좀 안쓰러웠던 영화는 베리만(베르히만) 감독의 <가을소나타>이다. 한 시절 미모로 풍미했던 여배우를 나중에 늙은 모습으로 마주쳐야 할 때.. 왜 스스로 마음 속의 고개가 수그러드는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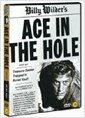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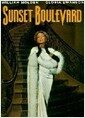
장 피에르 멜빌은 꽤 이른 시기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누벨 바그 영화에도 영향을 줬는데, 특히 저예산과 짧은 시일에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그러하다. 악당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데(알렝드롱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도 있음), 관객을 그들에게 동화시키긴 하지만 결국엔 죄값을 치르게 하는 냉정한 결말을 고수하기도 한다.
고전으로 유명한 <선셋 대로>의 감독 빌리 와일더는 미국 영화의 거물이라 봐도 손색이 없다. 마릴린 먼로가 나와 유명한 <7년만의 외출>, <뜨거운 것이 좋아>, 그리고 오드리 햅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브리나> 등 여배우 복도 많지만,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은 감독이다. 대중의 기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화를 내 놓기도 했지만,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 비평가 앙드레 바쟁도 이 감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는 빌리 와일더 영화 중에서는 <이중배상>을 재미있게 봤다. 1940년대 만들어진 영화지만 지금봐도 구성이 허술하지가 않다. 팜므파탈이 나오는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히치콕과는 또 다른 긴장감을 간직한 영화다.
나는 빌리 와일더 영화 중에서는 <이중배상>을 재미있게 봤다. 1940년대 만들어진 영화지만 지금봐도 구성이 허술하지가 않다. 팜므파탈이 나오는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히치콕과는 또 다른 긴장감을 간직한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