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은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바다에서 부는 바람도 거세다고 한다. 늦더위 탓에 어떤 잔여의 힘들이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린 모양이다. 그러나 여기 중부지방의 하늘은 얌전하기만하다. 창 밖은 너무도 짙고 차분해서 진한 커피와 함께 책을 펼칠만하다. 그러나 같은 땅, 아래쪽 사람들에게 은근히 걱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스 사유의 힘은 무엇일까? 느닷없이 그리스에 전혀 새로운 사유가 솟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동이나 이집트에서 지식의 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그래서 그 묘한 경계가 되는 '밀레투스 (학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실용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추상으로도 뻗쳤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로써, 그리스인들은 수학과 논리학에서 체계적인 사유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자체적인 수학과 논리학의 발달)이 가능했던 지역은 그리스와 인도가 유일하다고도 한다.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동양인이고 거기다 민족주의자라고 외친다한들, 우리 머리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새겨진(이식된) 서구 사유의 그림자가 꿈틀댄다. 그러니 그리스 사유는 우리에게도 (서구인들보다는 약하겠지만) 유일하진 않지만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다. <그리스 사유의 기원>은 그러한 전 지구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이성의 모델을 고안해 낸 그리스 사유를 역사라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접근한 책이다. 이쪽에서는 전문가라고 칭할 만큼, 많은 책들을 쓴 장 피에르 베르낭이 저자인데, 짝이 될 만한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자유>도 보인다. 요새는 어렵고 딱딱한 분야도 감각적인 재미를 살려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학문적인 무게를 가진 방식 그대로를 따른 듯이 보인다. 좋은 주제를 가진 책들을 많이 냈던 출판사 까치에서 나온 <정신의 발견>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책이다. 그러나 앞의 책보다는 좀 부드럽게 접근한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나 헤시오도스, 아리스토파네스 등과 같은 문학의 시간적 발달과정을 통해서 신화적인 것, 미학적인 것 등을 추적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동양인이고 거기다 민족주의자라고 외친다한들, 우리 머리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새겨진(이식된) 서구 사유의 그림자가 꿈틀댄다. 그러니 그리스 사유는 우리에게도 (서구인들보다는 약하겠지만) 유일하진 않지만 하나의 기원이 될 수 있다. <그리스 사유의 기원>은 그러한 전 지구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이성의 모델을 고안해 낸 그리스 사유를 역사라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접근한 책이다. 이쪽에서는 전문가라고 칭할 만큼, 많은 책들을 쓴 장 피에르 베르낭이 저자인데, 짝이 될 만한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자유>도 보인다. 요새는 어렵고 딱딱한 분야도 감각적인 재미를 살려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학문적인 무게를 가진 방식 그대로를 따른 듯이 보인다. 좋은 주제를 가진 책들을 많이 냈던 출판사 까치에서 나온 <정신의 발견>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책이다. 그러나 앞의 책보다는 좀 부드럽게 접근한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나 헤시오도스, 아리스토파네스 등과 같은 문학의 시간적 발달과정을 통해서 신화적인 것, 미학적인 것 등을 추적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서사학의 입문서라고 밝히는 <서사란 무엇인가>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본적인 (서사 텍스트) 이론을 통해서 문학을 해석하는 도구의 기능까지도 염두했음을 말하고 있다. 잠깐 훑어봤는데, 기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구성이 보이고, 여백이 많은 편집이라서 300쪽에 가깝지만 읽기에 부담스러운 양은 아닌 것 같다. 최근에는 이러한 서사 이론과 영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보인다. <서사의 영상 영상의 신화>도 그러한 책이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와 같은 모범이 되는 책도 있다. 이 외에도 기호학,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독자적이고 철저한 깊이를 가진 학자로 알려진 고 박홍규 교수의 책이 전집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강독>이다. 나도 아직 제대로 이 분의 책을 읽어보진 못했다. 오래 전에 어떤 분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기억에만 담아두고 아직 경험을 못해봤다. 빠른 시간 안에 정직한 독서로 그 깊이를 챙겨야겠다.






오랜만에 데리다와 관련된 책이 보인다. <T.S. 엘리엇과 쟈크 데리다>인데, 제목처럼 엘리엇과 데리다가 두 줄기를 이루는 책이라기보다는 해체비평을 통해서 엘리엇을 접근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이 살아 있다면>은 저자가 기존의 비트겐슈타인 책들과 달리 더욱 그의 독특한 논리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 제목이 같은 <언어의 시간>이 두 권 보인다. 볼프강 클라인의 책은 말 그대로 언어의 시간표현-시제에 관한 전문적인 책으로 보이고, 다른 책은 소쉬르 언어학을 중심으로 훗설과 라캉의 문제까지도 다룬다.








 <한국 철학의 역학적 조명>은 역학의 관점을 통해서 한국 철학을 재구성하려는 책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의 뼈대로 꽂는 모양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읽어 볼 생각이다. <역과 탈현대의 논리>와 <수운과 화이트헤드>는 김상일 교수의 책들이다. 김상일 교수는 예전부터 서로 다른 영역의 접붙이기식 책들을 써왔다. '한'철학으로도 유명하며, 화이트헤드에 관한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른 시기에 다루기도 했다(동양철학과 과정신학과 관련하여). 그리고 현대물리학(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카오스 이론, 퍼지 이론)이나 '판비량론'을 통해 원효와 괴델에까지 그 지식의 영역은 상당히 넓어 보인다. 요새는 전문적이고 두꺼운 분량의 책들이 나오는데, 일반 독자들이 쉽게 감당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수운에 대해서는 도올(그도 역시 주역이나 화이트헤드에 큰 관심이 있다. 다만 과학쪽엔 약한? 편이다)도 큰 관심을 보였던 인물인데, 이번에 나온 김상일 교수의 <수운과 화이트헤드>는 (주제) 접근으로만 보자면, 매우 독창적으로 보인다. 동학, 기철학, (화이트헤드의) 창조성과 과정신학 그리고 시스템 과학의 '맴돌이'의 적용도 살짝 보인다.
<한국 철학의 역학적 조명>은 역학의 관점을 통해서 한국 철학을 재구성하려는 책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의 뼈대로 꽂는 모양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읽어 볼 생각이다. <역과 탈현대의 논리>와 <수운과 화이트헤드>는 김상일 교수의 책들이다. 김상일 교수는 예전부터 서로 다른 영역의 접붙이기식 책들을 써왔다. '한'철학으로도 유명하며, 화이트헤드에 관한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른 시기에 다루기도 했다(동양철학과 과정신학과 관련하여). 그리고 현대물리학(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카오스 이론, 퍼지 이론)이나 '판비량론'을 통해 원효와 괴델에까지 그 지식의 영역은 상당히 넓어 보인다. 요새는 전문적이고 두꺼운 분량의 책들이 나오는데, 일반 독자들이 쉽게 감당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수운에 대해서는 도올(그도 역시 주역이나 화이트헤드에 큰 관심이 있다. 다만 과학쪽엔 약한? 편이다)도 큰 관심을 보였던 인물인데, 이번에 나온 김상일 교수의 <수운과 화이트헤드>는 (주제) 접근으로만 보자면, 매우 독창적으로 보인다. 동학, 기철학, (화이트헤드의) 창조성과 과정신학 그리고 시스템 과학의 '맴돌이'의 적용도 살짝 보인다.










로렌스 M. 크라우스는 <스타트렉의 물리학>과 <스타트렉을 넘어서>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스타 트렉의 우주선(엔터프라이즈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물리학을 적용해서 풀어 낸 이야기인데(그것이 과연 가능한가?식으로), 그냥 심심풀이로 볼 정도로 쉬운 책은 아니다. 올해 나온 <거울 속의 물리학>은 '차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인데, 역시나 기발하게도 플라톤, 피카소, 끈이론에 걸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초공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치오 가쿠의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도 한번 눈여겨 볼 책으로 보인다. <초공간>은 끈이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양자역학의 어긋난 대비와 결국 그 누구도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는 엇갈림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초공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역시 이쪽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실려 있다. 그외 <평행우주>나 브라이언 그린의 책도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최근에 지젝이 지은 <HOW TO READ 라캉>의 4장 '실재의 수수께끼'도 <초공간>을 읽었다면 좀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뇌과학에 관한 <새로운 뇌>는 대중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로 엮은 책으로 보인다. 우리와 가까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어 낸 것이라서 가볍게, 그러나 쏠쏠한 정보들도 얻을 것 같다.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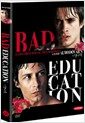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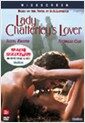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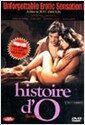
<나쁜 교육>은 강한 동성애 코드가 있지만, 이상하게 왜곡된 과잉의 열정이 지독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영화다. 프랑스 흑백 고전으로 유명한 <금지된 장난>은 영화로도 음악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하도 오래전에 본 영화라 가물거리긴 하지만, 어떤 이미지 하나는 애매하게 늘 머리 속에 저장된 영화이기도 하다. <차탈레 부인의 사랑>은 <개인 교수>와 함께 소년들에게는 이쪽 분양의 양대산맥과도 같은 작품?으로 통한다. <개인 교수>는 지금 보면, 살짝 웃기기까지 하는데, 에로 영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O의 이야기>는 문제작 중 하나다. 단순한 에로 영화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새롭게 살펴 볼만한 것들이 있다. 나중에 시리즈로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흥미로운 다큐 시리즈 <고대 성경의 비밀>도 흥미를 돋운다. 총 6편인데, 여기서 제2편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은 부분이다.
흥미로운 다큐 시리즈 <고대 성경의 비밀>도 흥미를 돋운다. 총 6편인데, 여기서 제2편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