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비슷한 날씨.. 낮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고 밤엔 귀뚜라미로 추정되는 곤충의 소리가 난다. 가끔은 이 두소리가 중첩되서 들리기도 한다. 여름과 가을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징후인가 보다.
---------






<산해경 목천자전> <목천자전 신이경>
어제는 <회남자> 책들을 둘러봤는데, 오늘은 <산해경(山海經)>이다. 아무래도 정재서씨가 옮긴 산해경에 눈이 간다. 신화와 지리, 괴물이나 방사(方士), 내단술에 얽힌 신기한 것들을 좋아한다면, 이런 책을 놓치면 아까울 것 같다. 서왕모 이야기가 나온다는 <목천자전(穆天子傳)>과 산해경과 유사한 <신이경>도 독립된 형태는 아니지만 드물게 나와 있다. 서양의 오디세이와 다르게 동양은 특히 산에 얽힌 이야깃거리가 많은 것 같다.


불교적 오디세이라고 해야하나.. 일본인 구법승 엔닌의 순례가 담긴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전에 출판사 정신세계사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도 나온다고 한다. 그럼 이와는 전혀 다른 현대적 오디세이는 맛이 어떨까? 같은 일본인인 이시가와 나오키의 <청춘여행, 길 위에서 꿈을 찾다>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인도 여행을 감행한 후 나중엔 열기구로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는 모험을 즐기는 여행가다. 현장의 사진이 곁들여진 정말 개인적 체험의 여행서란 느낌이다.





어제도 '도교와 여성-여신'에 관한 책을 잠깐 꺼냈는데, <중국 여신 연구>라는 근사한 책이 보인다. 여기도 자료로서 <산해경> 등이 나온다. 중국 여신이 남신에 비해 유독 많고, 또 다양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책이라고 한다. 인도와 중국의 여신을 비교하는 책도 나오면 꽤 흥미로울 것 같다. 리쩌허우는 전에 동문선에서 나온 <미의 역정>, <화하미학>이란 책을 통해서 꽤 저명한 학자란 감을 잡았었다. 한마디로 철학, 미학에 걸친 자기만의 시각을 텍스트에 녹여낼 수 있는 학자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중국고대사상사론>도 따라서 개론서와는 다른 차원의 중국사상사가 담겼으리라 예상한다. 중국고대사상에 관한 책하면 개인적으론 곽말약(꾸어뭐르우어?)의 <중국고대사상사, 까치>가 생각난다. 지금도 집에 잘 모셔져 있지만, 이 책도 잘만 읽으면 그 얻는 바가 클 것 같은 책 중 하나다. <소설로 읽는 도덕경>이라니, 과연 소설로 가능할 지 궁금하다. 도덕경은 문고판에서부터 도올의 <노자철학 이것이다> 등등 몇 번 읽어봤지만, 체득하기에는 아직 가물가물한 그 무엇이다. 이 책은 소설 형식을 빌어 현대적 감각으로 썼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싶다.




리쩌허우의 다른 책들 <학설>, <역사본체론>, <중국미학사>, <미의 역정> 등이다.



브라이언 페이건은 고고학과 인류학 박사로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으로 통하는 것 같다. <람세스의 눈>은 오랜 흙먼지 같은 과거를 단지 과거의 이야기마냥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각-프레임으로 풀어낸 고고학 이야기로 보인다.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는 기후와 문명의 관계를 다룬 연구서다. 그렇게 생소한 접근은 아닌데, 이와 비슷한 책으로 전에 고려원에서 나온 <환경과 자연인식의 흐름>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첫사랑 피카소>는 그냥 단순한 책 제목인가 했더니, 실제로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훼르낭드 올리비에의 일기를 모아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랑을 나누던 여자의 눈에 한 남자로서 피카소의 모습이 어떠할지 꽤 궁금하다. <어떤 이의 악몽>은 재기넘치는 상상의 단편들이 이어지는 책인듯 하다. 짧은 호흡과 자극의 글이 읽고 싶어 이 책을 고른다면, 과연 그 결과는 악몽일까? 아니면 단꿈의 감상을 남길까..
아사다 지로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철도원>의 작가로 알고 있을 뿐, 자세히 몰랐는데, 꽤 많은 책들이 번역된 걸 보고 놀랐다. <창궁의 묘성>이란 제목이 참 근사해서 읽어보고픈 마음도 불러 일으킨다. 다른 책들이 비해 약간 썰렁해 보이는 책을 몇 권 골라봤다.
<메피스토>는 이스트반 자보 감독이 만든 영화도 꽤 유명하다.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외국영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의 이름이 암시하듯, 어떤 진한 개인적 갈등과 악마적 전이(물듦) 등을 한 예술가(연극배우)를 통해 그려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메피스토>의 작가 클라우스 만이 토마스 만의 아들이란다. 이 책도 역시 전에 고려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 이 메피스토의 기운과 맞물려 <포르노 작가의 시>도 얼추 예상되는 분위기다.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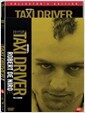




전에 마틴 스콜세지의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영화들도 꽤 보는 것 같았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부드러운 인상은 여전하다. <좋은 친구들>이 어떤 조사에서 최고의 영화로 뽑혀서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수많은 영화를 제칠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마틴 스콜세지 영화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에 알던 사람도 그랬는데, 나는 기대치를 높게 잡고 봤는지 생각보다는 썩 좋지는 않았다. 그 유명한 <분노의 주먹(성난 황소)>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로버트 드니로의 젊고 단단한 육체와 거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아울러 작고 시끄러운 사고뭉치 조 페시와의 콤비 플레이 정도. <순수의 시대>는 다른 영화들과 다른 맛이 있다. 어떤 폭력의 제스처가 아닌 묘한 심리를 그린다는 면에서. 그리고 초기 미국 귀족 사회의 화려한 볼거리(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이나 유럽에 대한 콤플렉스도 엿보이지만)도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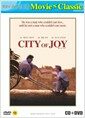


영화 <미션>은 음악과 함께 여전히 강한 인상이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와 타문명에 관한 비판적인 읽기도 가능한 영화지만, 여기서 구태여 꺼낼 얘기는 아닌 듯 하다. 롤랑 조페도 그러고 보니 다양한 쟝르의 영화를 찍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4. 4. 4.>는 아마 보고 나면, 롤랑 조페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냥 가볍게 즐길 만한 반전이 있는 스릴러이긴 하지만, 감독의 역량보다는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한 영화 중 하나로 보였다. 차라리 에로틱이 가미된 스릴러인 <굿바이 러버>가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