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은 좀 선선하다 싶었는데, 오후의 꼬리에 질긴 더위가 끌려가듯 잔열이 남는다. 저녁 일곱시가 넘었는데도 그렇다. 오늘은 밖에서 <루이스 부뉴엘의 은밀한 매력>이란 책을 구했다. 품절이라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운이 좋았다. 한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이상의 영화를 계속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히치콕도 가끔 수준 이하의 영화들이 보이질 않던가?





다윈도 생물학에서는 헤겔처럼 또 하나의 망령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가끔 이 진화론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윈은 자신의 파편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후예들을 바라본다. 분명, 진화론적 시각과 창조론적 시각은 어느 편에서 확실히 끝장낼 수 있는 이론이나 무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양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성과는 달리 세상의 참 실상은 야누스의 미소를 머금고 그냥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예민한 지적인 문제,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축을 차지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긴 호흡의 독서로 말끔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다윈의 대답>에서 아마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40억 년 간의 시나리오>는 일종의 '생명의 역사'에 해당하는 생물학 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더 유전자에 초점을 둔 긴 시나리오가 담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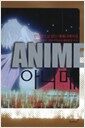





아니메, 미국산 만화도 움츠려 들 수 밖에 없는 그 만화 이미지의 강박증을 유발하는 힘!
-인문학으로 읽는 제패니메이션- 부제가 붙은 <아니메>는 몇 가지 큰 얼개를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째로 엮어 내고 있다. 아마 저자의 오랜 관심의 시간과 경험에서 나오는 정리 기술로 보인다. 특히 제2부 '신체, 변신, 정체성'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장이다. 되도록 많은 아니메를 동원해서 자신의 콜렉션을 자랑하는 식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큰 여러 갈래의 줄기 안에 도드라진 대표성을 가진 것들을 추려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으로 보인다. <저패니메이션 하드코어>는 제목만 봐도 (어쩔 수 없이?) 친근하다. 나는 상상을 자극하지 않고 너무 과장된 걸 들이미는 광경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 터라, 이런 류의 만화를 즐기진 못한 편이다. 이왕이면 실사가 낫다는... 하여튼 요괴나 괴물까지 등장해서 여자를 줄기차게 괴롭히는 성깔을 가진 만화도 보이던데,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보기 힘든 일본만의 풍경인 듯 하다. 그 지나친 과잉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지도.. <박인하의 아니메 미학 에세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다. 8가지 미학 코드로 아니메 읽기를 시도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주제들로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위의 책 <아니메>에 비해서 '정리의 기술'이 좀 우왕좌왕해 보인다.






<뇌는 스크린이다>를 번역하고, <들뢰즈> <디지털 영화의 미학> 등을 지은 박성수씨의 <애니메이션 미학>은 아무래도 저자의 특성상 인문학적인 풍취가 강한 책일 것 같다. <움직임의 미학>은 애니메이션의 작업 과정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애니메이션 미학', 즉 애니메이션과 수용자와의 관계와 그 효과등도 아울러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학과 만화의 만남은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책이 두 권 눈에 띈다. <만화 기호학>과 <기호학적 만화론>인데, 영화와는 어떤 차별적인 특색이 있는지 기회가 있으면 들여다 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인 오시이 마모루에 관한 책, <아니메의 시인 오시이 마모루>도 눈에 보인다. <공각기동대>로 정말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극장판이 흥행에서 저조한 반면, TV 시리즈는 꽤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 <공각기동대 2> 극장판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는데도, 대중이 받아들이기엔 난해했다. 원래 실험적인 실사 영화들도 찍었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저예산인지라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나로서는 '공각기동대 3'에 해당하는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게 또다른 낙이다.

 외국사람의 눈으로 쓴 우리나라에 대한 책을 아직 읽어보질 못했다. <은자의 나라 한국>은 책 제목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나라의 고대사부터 을사조약에 이르는 긴 역사를 건드린 책이다.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봐서, 그의 역사 시각이 어떠할지는 약간 짐작이 갈 뿐이다. 이에 반해 <조선풍물지>는 외교관으로 온 외국인이 19세기 조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은 책인데,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이국적이었을지 궁금하다.
외국사람의 눈으로 쓴 우리나라에 대한 책을 아직 읽어보질 못했다. <은자의 나라 한국>은 책 제목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나라의 고대사부터 을사조약에 이르는 긴 역사를 건드린 책이다.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봐서, 그의 역사 시각이 어떠할지는 약간 짐작이 갈 뿐이다. 이에 반해 <조선풍물지>는 외교관으로 온 외국인이 19세기 조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은 책인데,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이국적이었을지 궁금하다.
-DVD-




<12 몽키즈>와 <브라질>로 유명한 테리 길리엄은 그 전에 <몬티 파이톤...> 같은 이상하게? 웃긴 영화들로 인정을 받았다. 나한테는 '브라질'이 더 친근한 제목인 <여인의 음모>, 이 영화를 가장 잘 봤다. <12 몽키즈>는 크리스 마르케의 짧은 실험작 <환송대('활주로' 혹은 '통로'라고도 함)에서 모티브를 얻었음을 알 수 있고(넓게 보자면 매트릭스까지도), 또 역으로 <여인의 음모>는 스티브 소더버그 감독의 <카프카>에서 그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두 편 외에는 그 후로 테리 길리엄의 이름 값을 톡톡히 해내는 영화는 안 보인다. <그림형제>는 모니카 벨루치를 구경하는 재미와 거울 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풍경 말고는 그리 큰 재미는 없었다. 왜 감독의 예술가적 재능은 누적이 되질 않는 것일까?
 레오 까락스는 너무 어린 나이에 등장해서 고다르의 관심까지 받은 천재감독이었으나 왠일인지 <폴라 X>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공백이 길었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길다. 그가 찜해서 스타가 된 줄리 델피와 줄리엣 비노쉬만이 영화에서 활동이 많았을 뿐..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흥행하는 바람에 레오 까락스를 놀래켰다고 한다. 그래서 방한까지 했다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줄리엣 비노쉬의 멋진 노숙자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밤에 강물을 타고 수상스키를 타는 장면도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귀가 얇은지라 결말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줄리엣 비노쉬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았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다.
레오 까락스는 너무 어린 나이에 등장해서 고다르의 관심까지 받은 천재감독이었으나 왠일인지 <폴라 X>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공백이 길었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길다. 그가 찜해서 스타가 된 줄리 델피와 줄리엣 비노쉬만이 영화에서 활동이 많았을 뿐..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흥행하는 바람에 레오 까락스를 놀래켰다고 한다. 그래서 방한까지 했다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줄리엣 비노쉬의 멋진 노숙자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밤에 강물을 타고 수상스키를 타는 장면도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귀가 얇은지라 결말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줄리엣 비노쉬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았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