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솜털 같은 미세한 차이지만 더위의 힘이 정점에서 점차 기우는 듯한 느낌이다. 길거리에는 뙤약볕이 햇물 번지듯 이글거리고, 담과 가까이 자란 나무들 밑은 그래도 그림자가 있어 발과 몸을 담그로 더운 열기를 식힐 수 있었다. 오늘도 그러한 여름 하루였다.

브루스 핑크(Bruce Fink)의 <에크리 읽기>가 나왔다. 라캉을 즐겨 읽는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브루스 핑크가 번역-편집한 '에크리'나 '세미나'가 우리말로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짧은 단비는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핑크의 다른 책으로는 <라캉과 정신의학>이 있고, <성관계는 없다>에서는 <라캉의 주체(The Lacanian Subject, 1995)>의 일부가 번역되어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아무래도 핑크의 글쓰기 방식은 전달자 역할에 어울린다. 지젝이 약간 꼬는 재미(희롱)를 부리다가 내려 놓는 것 하고는 맛이 다르다. 그래서 지젝 스타일이 버겁거나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핑크의 글이 더 당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젝에 비해 핑크의 책은 아직은 숫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 동안 읽은 '라캉 입문서'들을 정리해서 페이퍼를 쓸 생각인데, 비슷 비슷한  책들이 있는 반면에, 꼭 읽으면 좋을 책들도 몇 권 눈에 띈다. 라캉은 지젝, 핑크와 같이 탄력 있는 줄을 뽑아내는 거미?들이 있는 것이 들뢰즈와 사뭇 다르다. 그리고 사상에서도 서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극과 극은 아니더라도 얼핏 대비되는 것들이 보인다.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로 넘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페이퍼를 꾸며봐야겠다.
책들이 있는 반면에, 꼭 읽으면 좋을 책들도 몇 권 눈에 띈다. 라캉은 지젝, 핑크와 같이 탄력 있는 줄을 뽑아내는 거미?들이 있는 것이 들뢰즈와 사뭇 다르다. 그리고 사상에서도 서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극과 극은 아니더라도 얼핏 대비되는 것들이 보인다.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로 넘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페이퍼를 꾸며봐야겠다.





<O-기호의 매춘부>는 'O'이라는 기호-아리비아 숫자 영, 알파벳의 'O' 그리고 무(無)의 개념 등을 좀 더 자극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다룬 듯이 보인다. 물론 이런 비슷한 책들이 여럿 있지만, 그 대상에 어떤 비밀스런 우회로를 거쳐 도착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O'는 시각적으로도 '우로보로스 뱀'을 연상케 하는데, 역시나 목차에도 '연금술' 항목이 있다. 이언 스튜어트는 과학, 특히 수학적 시각으로 자연을 꿰는 재주가 남달라 보인다. <하느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가>에서 이 남자를 처음 접했는데, <자연의 패턴>도 그의 진가가 많이 실린 책 같다. 이 책은 전에 <자연의 수학적 본성>이란 약간 센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도 비슷한 패턴을 가진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수학) 패턴에 관한 책이다.








회남자는 전부터 읽을 생각은 컷지만, 아직 제대로 눈맛도 못보고 있다. <회남자 황제내경> 이렇게, 회남자와 황제내경까지 묶어서 나온 책도 보인다. 출판사 김영사의 -지식인 마을 시리즈-라는데, 지성인 두명 혹은 고전 텍스트 두 개를 약간 긴장되게 한 권에 담아 번갈아가며 엮어 나가는 식으로 꾸며진 듯 하다. 황제헌원은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바로 치우천황과 대결을 벌인 주인공이다. 황제가 이겼다는 설도 있고, 치우가 이겼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치우가 나중에 티베트로 갔다는 말도 얼핏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긴 도통 어떤 것이 사실이고 신화인지 헷갈리는(헤깔리는x) 영역이다. 어쨌든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회남자 한 권을 두툼하든 얄팍하든 한 놈 손에 쥘 생각이다.











'회남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약간 거슬러 올라가 도교에 관한 책들을 둘러본다. 나는 도교에 관해서는 앙리 마스페로의 책하고 사까이 다다오 등이 참여한 <도교란 무엇인가, 민족사> 그리고 <도교와 불로장수의학, 열린책들> 등이 기억난다. 그 외에도 <태을금화종지>니 <참동계천유> 등이 있는데, 지금 잠깐 훑어보니가 그새 품절이나 절판된 책이 많다. 물론 도가와 도교가 엄밀하게는 갈리는 것이긴 하지만 <도덕경>을 '여성성의 상징'으로 읽는 방법이 있듯이, 동양에서는 하늘보다 땅의 이치, 여성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보이곤 한다. 인도를 (사상적으로) 동양으로 보긴 어렵지만, 인도도 아리안족 침입 이전에는 여신의 힘이 만연했다. 그러나 도교에서의 여성성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도교와 여성>은 신화나 양생술에 치중한 다른 도교 관련 서들과 차별성을 갖으며, 또한 도교의 핵을 차지하면서도 베일에 가렸던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아 관심이 가는 책이다. <조선시대의 내단사상>은 한길사에서 나온 걸로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새로 나왔다. 박사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든 것인데,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내단 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을 꺼낸 김에 <내단>이란 책도 잠깐 구경을 해보자. -심신수련의 역사-라는 부제를 가졌는데, 간단한 제목에 비해선 의미있는 작업의 결과가 담긴 것 같다. '내단(內丹)'은 체내에서 연단술을 통해 단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몸 밖의 물질에 투사되어 발휘될 경우 '연금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서 고대부터 명청시기까지 두루 살핀 것 같은데, 주로 일본학자들의 연구서에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학자들의 도교사에 대한 내공적 글쓰기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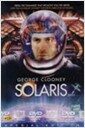

대니 보일 감독의 <선샤인>은 약간의 무리수를 둔 영화다. 아마 머리가 나쁘거나 뻔뻔한 감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벤트 호라이즌(Event Horizon, 1997)>과의 비슷함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여기선 마치 '물활론'의 부활이랄까? 주인공들은 너무도 가까이 저 뜨거운 태양에 다가간다. 물론 아마겟돈 같은 임무라지만, 그런 영화를 뛰어넘는 처절함과 혼돈들이 우주선을 통째로 집어 삼킨다. 마치 대원들의 영혼을 삼킬만한 영적인 힘의 압도, 그렇게 거대하게 기다리는 태양처럼. 그러나 그러한 위험 앞에서 우리는(대원들은) 유혹에 노출된다. 태양은 우주의 자궁이 아니던가? 거기에 녹아들기 바라는 뜨거운 타나토스가 이 우주선 안에서 죽은 나무들을 대신해 자라나는지도 모를 일이다. 영화 <스피어(Sphere, 1998)>나 타르코프스키와는 또 다른 스티븐 소더버그의 <솔라리스>에서도 비슷한 위기와 철학적 무게를 맛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 컬렉션>은 영국 BBC에서 만들어 낸 세익스피어의 영상 집대성과 비슷한 성격의 모음이다. 수십편(37편)이 담겨 있는 만큼 디스크 숫자도 거기에 버금간다. 세익스피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소식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