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곁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
책제목처럼, '숨결이 바림 될 때' 그 순간을 가장 의미있게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밤 늦도록 읽으면서 가슴이 아리도록 슬펐다. 그러나 그
슬픔 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에 마지막 장을 덮은 후에도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다.

저자인 '폴 칼라니티'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 '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영문학 석사를, 영국에 가서는 철학 석사를
받는다.
그러나 작가가 되고 싶었던 생각은 생명 현상과 인간을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예일 의과대학원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기체들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데 뇌가 하는 역할을 알기 위해 신경과학을 공부하면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연구소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그는 신경외과 레지던트 7년 과정의 혹독한 수련기간 막바지에 폐암 선고를 받는다.
<숨결이 바람 될 때>는 1부에서는 암 선고를 받기 전에 그의 삶과 의사로서의 환자들을 진료하던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고,
2부에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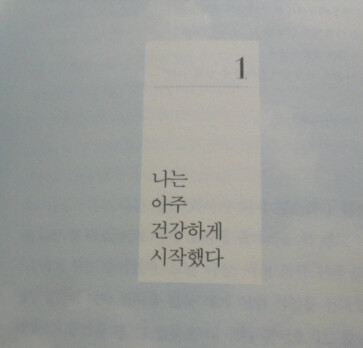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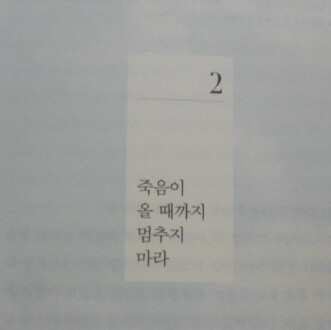
"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등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그에게 암이 찾아 왔다.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 오던 서른 여섯 살의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 (작가 소개글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입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생각, 자신이 말기암 환자가 돼서 죽음을 생각하는 환자의
입장....
폴은 의사이자 환자, 그렇기에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있기도 했다.
폴은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였다. 그가 레지던트로서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폴'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때론 의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무감각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했다. 진료과정을 설명하는 내용들도 다수 담겨 있는데 어렵게만 느껴질 의학적
상식들을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기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의학적 상식을 넓힐 수도 있다.
그는 발병 사실을 알고 치료를 하게 되면서 죽음을 의사와 환자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죽음이 그를 엄습해도 그는 끝까지 어려운
신경외과 뇌수술, 척추 수술들을 해 나간다.
그건 죽음과 마주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런 순간에 환자와 함께하는 건 분명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은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이 일의 신성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환자의 뇌를 수술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정체성, 가치관, 무엇이 그의
삶을 가치있게 하는지, 또 얼마나 망가져야 삶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수술에 성공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에는 큰 대가가 따랐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실패는 참기 힘든 죄책감을 안겨 주었다. 이런 부감감은 의학을 신성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든다. 의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다가 때로는 그 무게를 못이겨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 (p. p.
124~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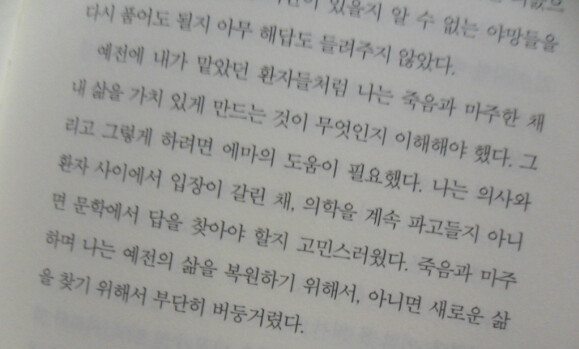
"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우리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살고 숨 쉬고 대사
작용을 하는 유기체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살아간다. 죽음은 당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제프와 나는 몇 년 동안 죽음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마치 천사와 씨름한 야고보처럼 죽음과 씨름하는 훈련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대면하려 했다. 우리는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을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멍에를 졌다. 우리 환자의 삶과 정체성은 우리
손에 달렸을 지도 몰라도, 늘 승리하는 건 죽음이다. 설혹 당신이 완벽하더라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 " (p.
142)
그는, '만약 자신에게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 남았다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 남았다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How Long Have I Got Left?)’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칼럼을 통해 정확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 환자의 딜레마를 절실하게 표현했다.
이 책의 글들을 읽어
보아도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필체를 보여주고 있다.
아쉽게도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끝맺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Epiloque는 그의 아내인 '루시 칼라니티'가 이어서 썼다. '폴'은 발병한 지 2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가족들과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한다. 부부에게는 '폴'이 발병을 한 후에 얻은 딸 케이디가 있다.

의사이자 환자로서 죽음을 대면하면서 죽음을 이해하고, 마지막 순간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노력했던 '폴
칼라니티'
그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면 상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병원들이 있을 정도로 신경과 의사이자 신경 과학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의사였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폴'
책을 읽고, 글쓰기를 즐겼던 '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이 가을이 가면 추운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겠지....
그리고 멀지 않아서 꽃 피는 봄이 올 것이다. 자연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듭나지만, 인간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래도 '폴 칼라니티'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떠났으니, 우린 그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