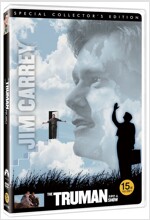
이 영화를 보는 마음은 남다르다. 우선 추억의 영화다. 옛 영화를 보면 왜 그리도 애틋하고 아련해지는지. 1998년 산이다. 출연한 배우도 이젠 노년으로 접어 들었다. 특히 영화속 김 캐리의 풋풋함과 유머러스한 연기란 참...!
처음 봤을 당시에도 좀 충격적이다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세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해 보인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완벽한 쇼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것에서 우리는 뭔가 조정 받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요즘 각 방송국마다 보여주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은 이 영화의 오마주라고 보면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컨셉과 동선을 보며 킬킬대고 웃다보면 TV가 사람을 바보 만들지 싶다. 그뿐인가, 우린 감시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영화는 이걸 더불어 꼬집어 주고 있다. 허위만이 진실이란 묘한 역설이 성립되는 느낌이다.
솔직히 올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 혹시 뭔가에 조정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씨와 기후도 조작한다는 말이 있던데 말이다. 누군가 코로나의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고 킬킬대고 웃으며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했더랬다. 물론 지금은 그 보다는 인류가 언젠가 치르게 될 재앙을 치르고 있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상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딜 갈 때마다 QR 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도 뭔가 편치마는 않고.
그런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님께선 이걸 꼭 나쁘게만 보지 않고 있어서 좀 의외이긴 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디스토피와와 유토피아 동시에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통제 불능의 상황을 보면 세계는 디스토피아로 갈수도 있고, 비교적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보면 유토피아로 갈수도 있다고 했단다. 결국 통제만이 살 길인가 싶기도 한데 그것을 꼭 나쁘게 보지마는 않는 것 같았다. 이를 달리 보면 서로를 위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즉 내가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 역시도 피해 받지 않으려는 그 통제 가능함이 유토피아로 갈수도 있다나 뭐라나. 그렇게 보니 그런가 싶기도 하다. 뭐 영화도 나중에 해피엔딩 아닌가. 아, 나의 팔랑귀란...
아무튼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허리우드의 시스템이 부럽기도 했다. 그나저나 감독 아저씨는 요즘 뭐하시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0년 이후 필모가 없는 걸 보면 은퇴하고 놀고 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