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대담 醫對談 - 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
황상익.강신익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12월
평점 :

품절

<의대담-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는 강신익 교수와 황상익 교수가 네 차례에 걸쳐 가졌던 대담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저자 강신익 교수는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으로서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인문의학: 인문의 창으로 본 건강>,
<의학 오디세이> 등을 집필했고,
[사회와 치의학] 외 다수의 역서를 내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전향 이전 20여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의료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 과감히 인생 경로를 전환했다고 했다. 대담자 황상익 교수는 강신익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으로서 의료윤리를 전공한 의철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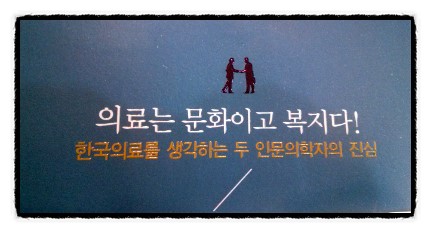
한국의
의료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두 인문의학자의 시도. ‘인문의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학문의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있게,
역사학, 철학, 윤리학, 진화심리학, 생명 과학 사회학과 의료 인류학 등 인접 학문들의
이론들을 종횡무진 엮고 잇는다. 또한 ‘인술 VS 상술’, 의사사회의 이상과 현실,
의료사고와 인간이 존엄성, 의료제도와 의료윤리 등과 같은 철학적 물음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인술의 함의, 현대 한국사회의 과잉의료화,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 등 의역사학의 전반적인 이슈들도 대담에서 아우른다. 그렇다고 이 의철학자와 의학역사가는 결코
비전공자 독자를 소외시키 않는다. 보라매 사건이나 영화
<치코>, 이태석 신부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현실적 사례와 소재들로서
독자에게 인문의학의 주제에 현실적 공감을 갖게 한다.
특히
강신익 교수가 ‘의술은 인술이네.’하는 현실을 무시한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술은 역사적으로 본디 상술도 띠어 왔기에 의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이태석 신부를 모델로 삼으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솔직한 말하는 부분에 큰 공감이 갔다.
‘인술VS상술’의 논의 구도를 만들면서 정작
인술로서의 의술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이 의사에게 인술을 이데올로기로서 강요한다는 비판에도 공감이 갔다. 이 외에도 서구 사회의 특정 맥락에서 나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국의 의료현실에 탈맥락적 탈역사적 개념으로
무조건 들이대는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의대담>을 읽기전에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문외한으로서 전혀 생각해본 적 없었던 이슈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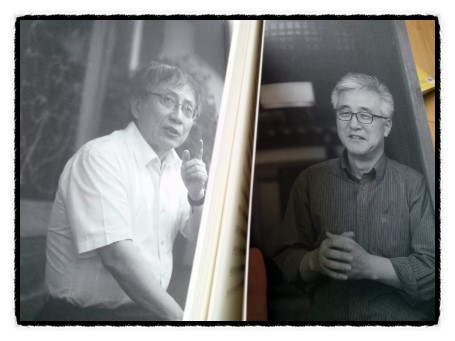
1부
‘의료 현실에 청진기를 대다’에서는 ‘건강의 자기 책임 이데올로기’ 확산과 이 흐름을 간파한 자본의
개입으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건강이 재화의 소비로 ‘성취’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기는 태도를 지적한다. 그 외에도 인술 이데올로기의 횡포성을 지적하는 등 두
대담자는 우리가 간과해 왔던 의료현실 이면의 이데올로기를 해부하려 한다.
2부
‘의료, 과학 이전에 문화다’에서는 우리 의학의 역사를 짚어본다. 흥미로웠던 점은 치과의사 출신
강신익 교수가 학부 때부터 품었다던 질문 ‘왜 치과대학은 의대에 속하지 않고 따로 있을까?’에 대한 답이었다. 답은 의외로 합리적 필요성이 아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의학의 역사를 ‘사회문화적 변주 속에서
발전해온 역사의 산물(p.135)로 살펴보아야 논의가 풍부해짐을 보여주는 답이었다.
3부
‘의료, 증상을 알면 처방이 보인다’에서는 한국의 의료문제를 복지 프레임에서 볼것을 제안하고 있다.
‘3분 진료’라는 화두를 두고, 시스템과
제도의 탓으로 돌리며 의료복지의 수준을 개탄하지 말고 이 문제를 문화적 프레임,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담>을
읽으니, 강신익 황상익 교수의 자유로운 지적 여정을 따라 소개된 책들과 이론들을 다시 훑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
참 적절한 부제같다. 교양인이라면 우리의 의료현실과 인문학적 논의의 대상으로서의 의학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