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ㅣ 나폴리 4부작 4
엘레나 페란테 지음, 김지우 옮김 / 한길사 / 2017년 12월
평점 :



드디어 다 읽었다.
이 책은,
3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다 지나가게 그리는 것처럼 사유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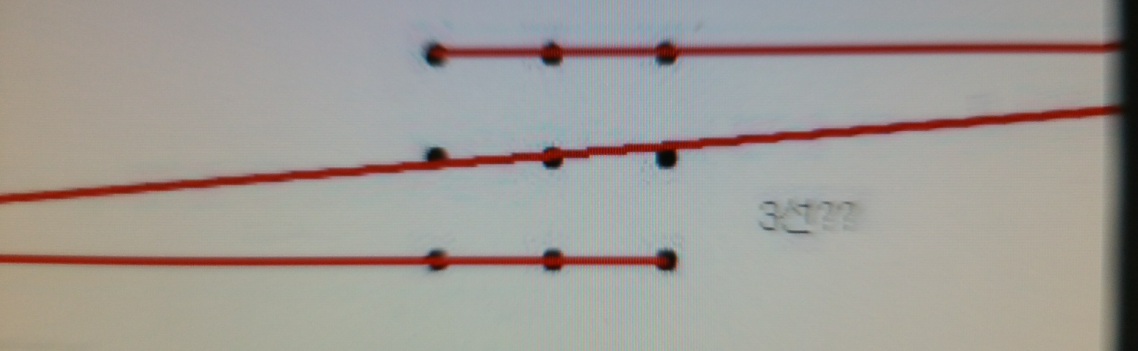
그리고 줄거리라고 해야 할까, 사건의 전개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하게 마무리 되고 작아지는게 느껴지는데,
그게 4권이다.
고백하자면 이탈리아의 역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따위의 이념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불리워지는 이런 개념들과 이탈리아의 그것들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나는 이러한 용어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게다가 페미니즘 관련 부분에서도 급 소심해지고 말았다.
책에 관해서만 얘기하자면,
난 이 책의 어느 누구에게도 감정이입을 할 수 없었다.
너무 가난해서 불편했는데,
그 가난이 지엽적인 것이어서 더 불편했다.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망한 것도 부담스러웠고,
지독한 가난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어려운 수학공식마냥 외우기는 했어도 증명을 해보이지 못 하는 것처럼,
읽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책을 읽든 쉽게 몰입을 하고,
쉽게 눈물을 흘리고 하여 수도꼭지라는 별명을 달고사는 나인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번 울었는데,
그게 4권이었나, 프랑코 부분에서 였다.
어느 누구 한사람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줄거리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슬픔이나 어두움 따위를 과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다 읽은 후 더 확고하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담담히 적어내려간 것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소설이라면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최명희의 '혼불'처럼 이야기를 장황하게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급조하였으나,
그게 '끝'은 아니다.
이 얘기도, 그 후의 삶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외국소설들을 읽고 감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내가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인데,
이 책은 몰라서 빠져들 수 없었고,
아직 진행 중이어서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감동을 즐길 사이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린다.
이건 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지식한 삶을 살아왔고,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다.
다 읽어냈다.
심적으로 많이 불편해서 재미있었다고 하긴 힘들지만 의미있는 독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