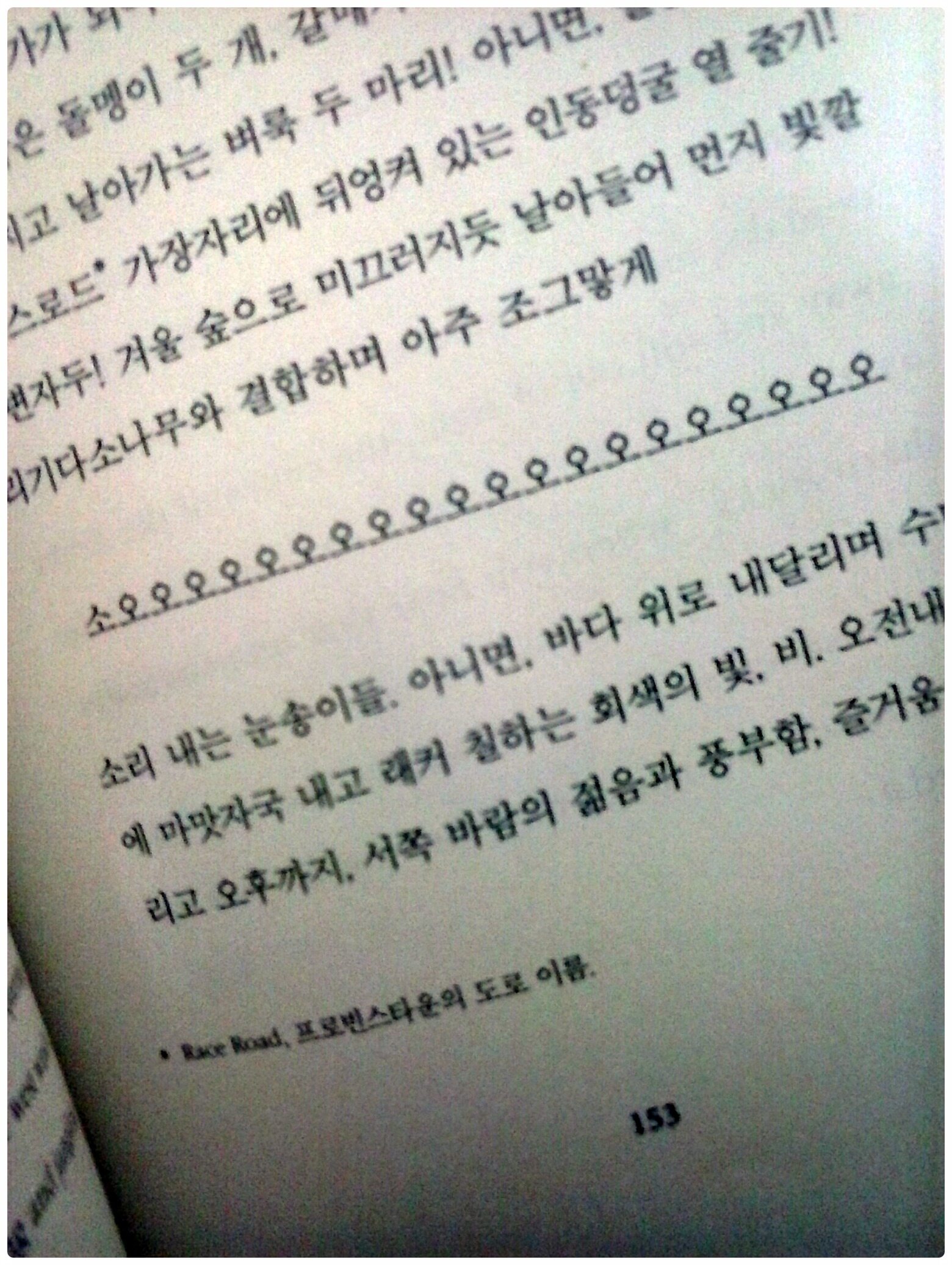-

-
서쪽 바람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 마음산책 / 2023년 1월
평점 :



2023년, 설을 두 번이나 치르고 1월이 다 가는데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어렵다. 아니 그저 새해라는 기분으로 어떤 멍청한 계획이라도 시작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 하루만 더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기대는 하루 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으로 변질된다.
장미에 대해 무얼 말할 거지 -
장미의 한숨, 나부낌 -
그리고 마음의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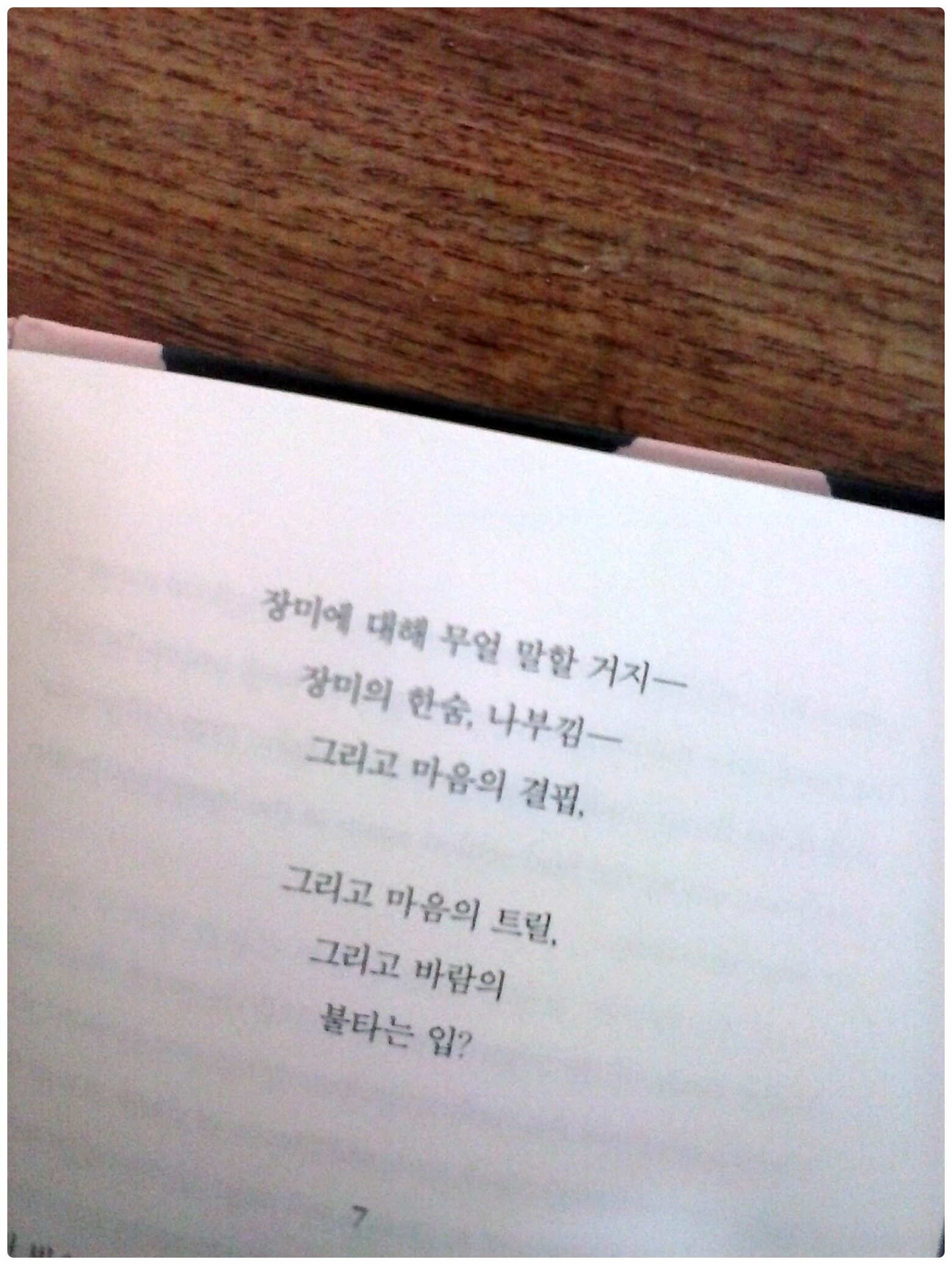
대단한 프로젝트를 계약 사인한 것도 아니고, 취소가 불가능한 복잡한 행사를 치러야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새해를 맞은 조그마한 기분의 티끌조차 찾을 수가 없다. 뇌의 한 부분에 기대와 희망과 설렘 등등의 저장소가 있었다면 텅텅 비어버린 듯하다.
그러니 아침에도 밤에도 끌리는 시집은 제정신으로 살 생명유지장치에 다름 아니다. 의지 삼아 한편씩 읽고 있다는 지인들 얘기가 힘이 된다. 죄책감도 부채감도 일으키지 않고, 매일의 풍경, 일상의 사물, 지금 여기 내게 필요한 자그마한 안부가 가득하니 더욱 의존 중이다.
이봐, 야망이 장화 신은 양발에 번갈아 체중을 실으며
초조하게 말하지-이제 시작하는 게 어때?

아버지는 내게 야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나는 성취 지향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삶이 너무 지겨웠다.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해치우고 가능한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방법만이 궁금했다.
반백년을 살다 보니 혹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낭패감, 허망함, 무료함, 혼란함, 허무함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욕망을 만들고 휘둘리고 도착지도 모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그게 무엇이건 진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바람이 빛의 가지들 사이로 뒹굴며
부르는 노래가
보살핌에 대한 것인지 무심함에 대한 것인지.

메리 올리버가 만나는 풍경과 사물을 내 세계에서도 찾아보려했다. 형태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같은, 어쩌면 해석과 의미는 잠시 비슷할 수도 있는. 산책하기 최악의 날씨가 이어져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주 잠시만 둘러볼 수 있었다.
겨울 숲은 무리지만, 먼 곳을 여행했을 바람을 겨울산책길에 만나면 덜덜 떨려도 반가웠다. 오래 전 바람이 싣고 오는 것을 채집 분석한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 숲에서 실려 온 씨앗, 혹은 수억 년 묻혔다 어떤 이유로 드러난 화석조각을 보았다.
지구는 둥그니까 동서남북이란 건 없지만, 내가 선 곳에서 바라본 서쪽에는 그리운 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팬데믹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더 오래 만나지 못할 이들. 분명 그들에게도 잠시 닿았던 그 바람이 지금도 내게 불어오고 있다.
이마가 쩡하게 아플 만큼 추운 날,
입김도 눈물도 얼어버릴 날,
아침부터 눈송이들이
“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쏟아지는 설레고도 떨리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