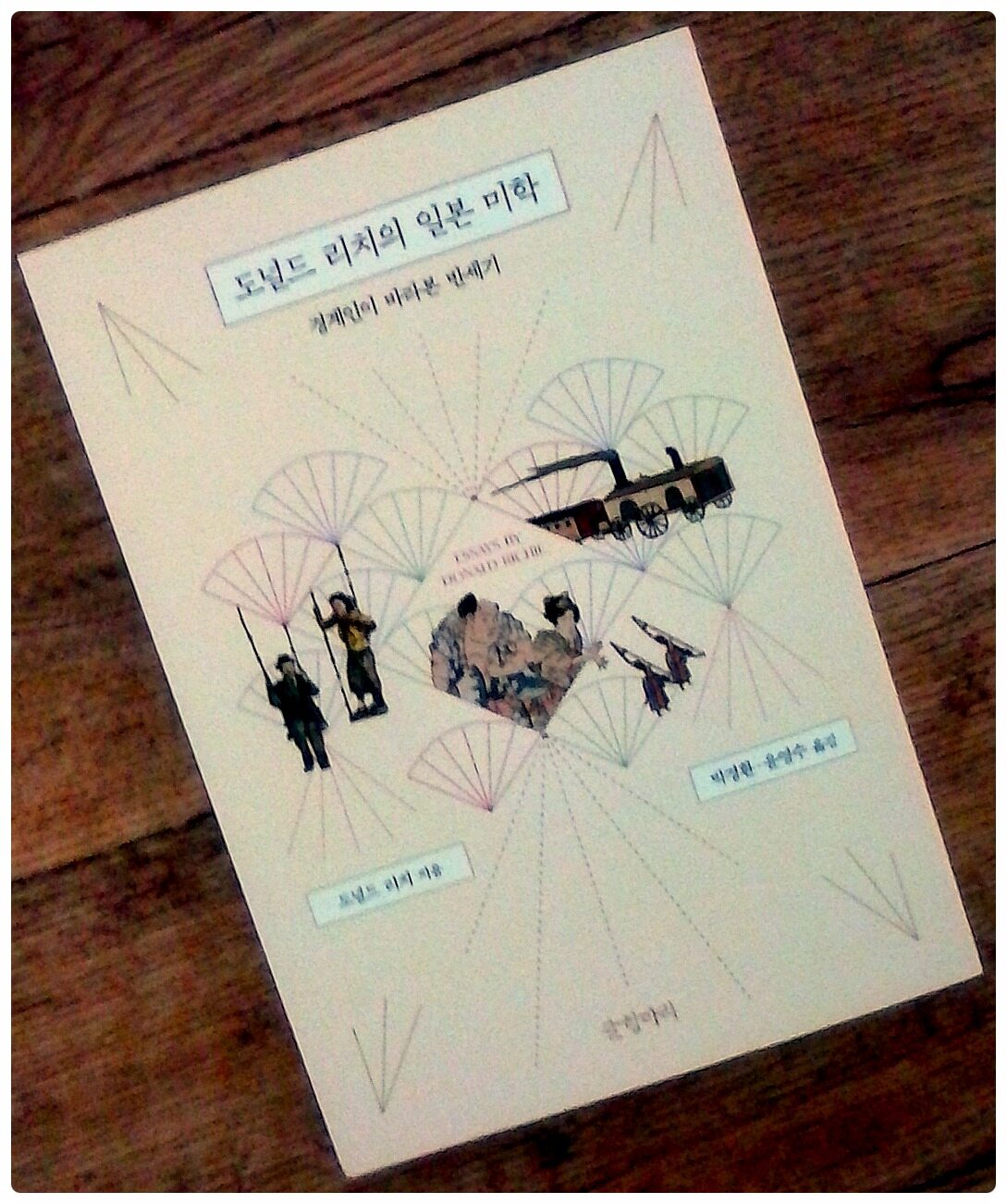-

-
도널드 리치의 일본 미학 - 경계인이 바라본 반세기
도널드 리치 지음, 박경환.윤영수 옮김 / 글항아리 / 2022년 8월
평점 :



영화 평론가란 문화적 소양과 필력을 모두 갖춘 이라고 생각한다. 수입된 작품들을 보는 입장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60여년의 세월을 보낸 이라면, 문화의 배경이 되는 다층적인 면들을 이방인이라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거란 생각도 해본다.
참전 군인이었다가 파병 국가에서 살며 문화를 미학의 관점에서 오래 보고 글로 정리한 것이라서, 가깝게 느끼지만 실은 잘 모르거나 단편적으로만 경험한 아시아권의 저자들보다 오히려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있을 거란 기대를 했다.
친한 일본인 친구들도 있었고 일본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아주 얕다. 그건 일본의 문화 상품을 얼마나 많이 접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미학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면서도 아주 난해한 분야라는 선입견이 강했는데, 걱정보다 편안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글들이라 다행이다. 익숙한 것들을 만나고 확인하는 내용이 절반은 되겠지 했던 짐작은 틀렸고 새롭게 배우는 낯설고 신기한 문화를 만났다.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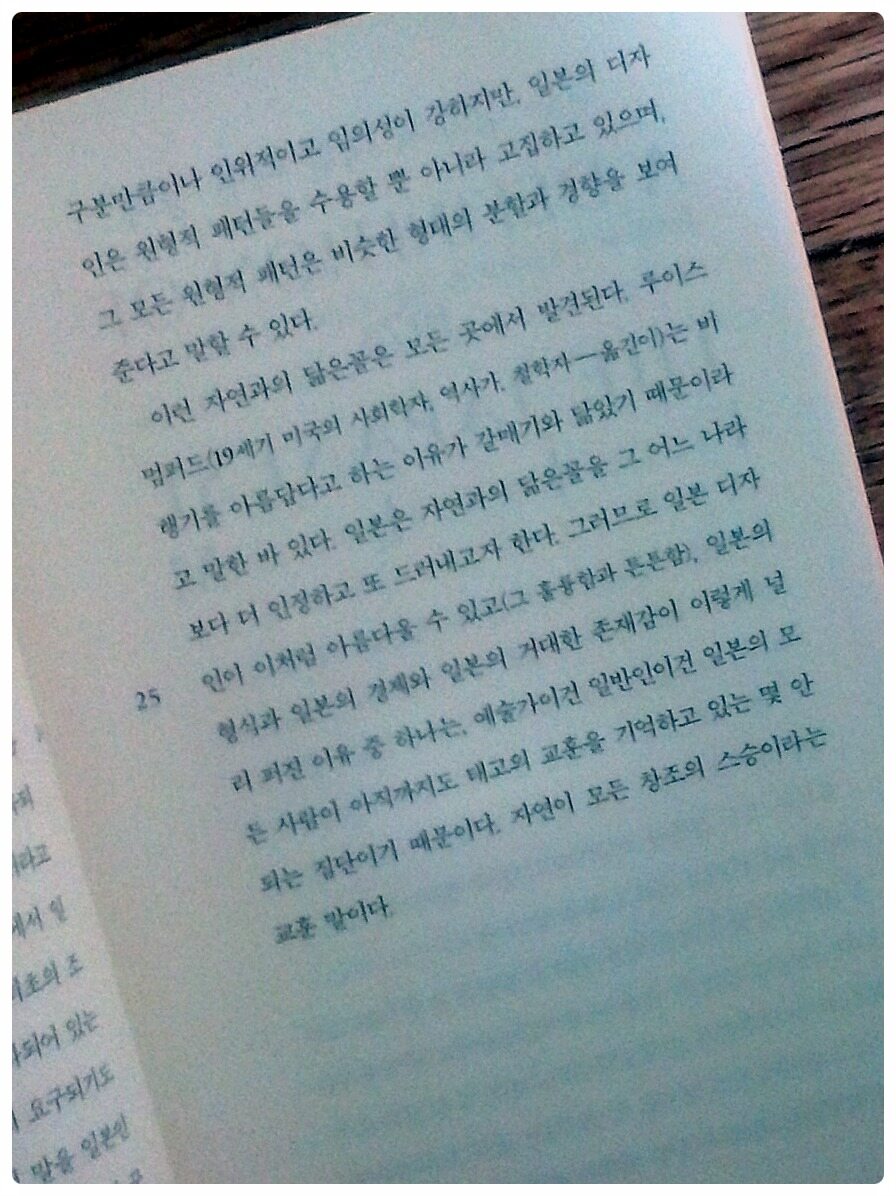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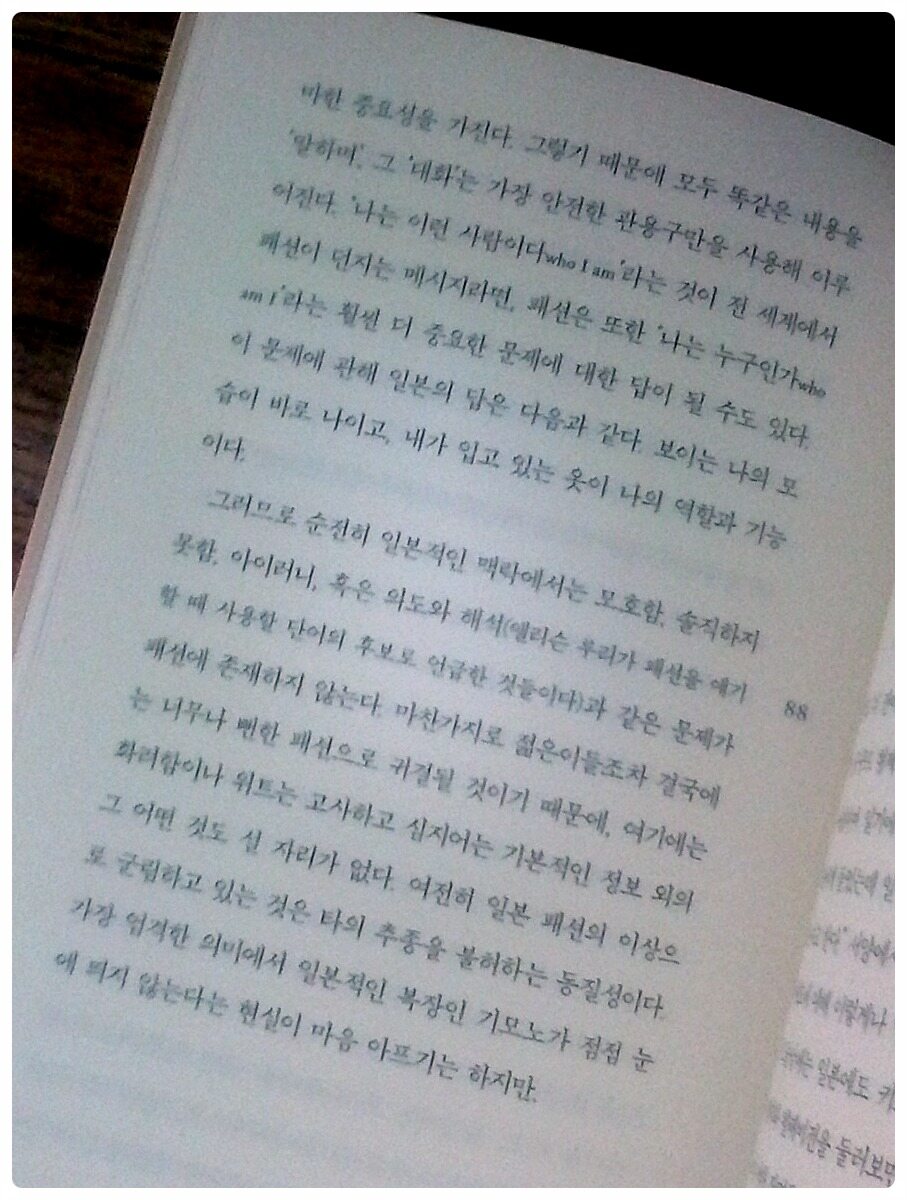
“다른 모든 언어가 그렇듯 옷차림에 관련된 언어는 뉘앙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기모노는 여러 의미로 옷의 주인을 정의한다. 몸에 딱 맞춰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기모노는 그 어떤 옷과도 다른 방식으로 몸을 휘감고, 제한하고, 받쳐준다. (...) 특히 여성의 기모노는 몸에 꽉 끼는 데다 겹겹으로 덧입은 속옷 위에 비로소 기모노를 입기 때문에 마치 몸의 형태를 기록해놓은 껍데기 같다.”
얼마 전 한복 문화를 소개한다는 기획으로 청와대에서 촬영된 옷들이 생각났다. 패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일본 디자이너의 옷에 버선과 고무신을 신었다고 한복 차림일 수는 없다. 그 기괴함은 한국, 일본 어디에도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뿌리를 두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일본의 전통 영화들을 보면 이들은 현실이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뒷면에 숨겨진 현실이라든가 가치 판단에 대한 고려가 느껴지지 않는다. 일본인은 개인으로서의 죄책감은 없으나 사회적 수치심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들 하지 않던가.”
이 단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 이전 선입견을 건드리는 주장은 대체로 반가운데 일본 전통 영화들을 많이 못봐서일까. 속마음, 감춰진 진실, 가치 판단에 대한 고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재확인을 위해 체크해둔다.
“일본은 죽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놓는다. 아마도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나 많이 다루는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극이나 시를 보면 죽음은 일상적인 주제 중 하나다. (...) 고대 이집트인들도 그랬지만, 일본은 죽음을 축하하고 받아들인다. 오히려 삶에 집착한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접해본 문화에서도 죽은 자를 애도하고 산자를 위로하는 방식이 무척 다양하다고 느꼈다. 마치 구분이 있으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함께 지낼 수도 있는, 문득 조우가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혼재되어 있다. 신기하게도 무섭진 않았다. 뜻하지 않은 이별, 아쉬움이 클수록 그리는 마음도 더 커서 산자들이 불러내고 곁에 두는 애도 같았다.
나는 문화보다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죽음과 삶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의미과 가치가 떨어져나간 삶에 비로소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찰나의 시간이 아깝고 귀하고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애틋하다. 죽음이 일상,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건 좋은 면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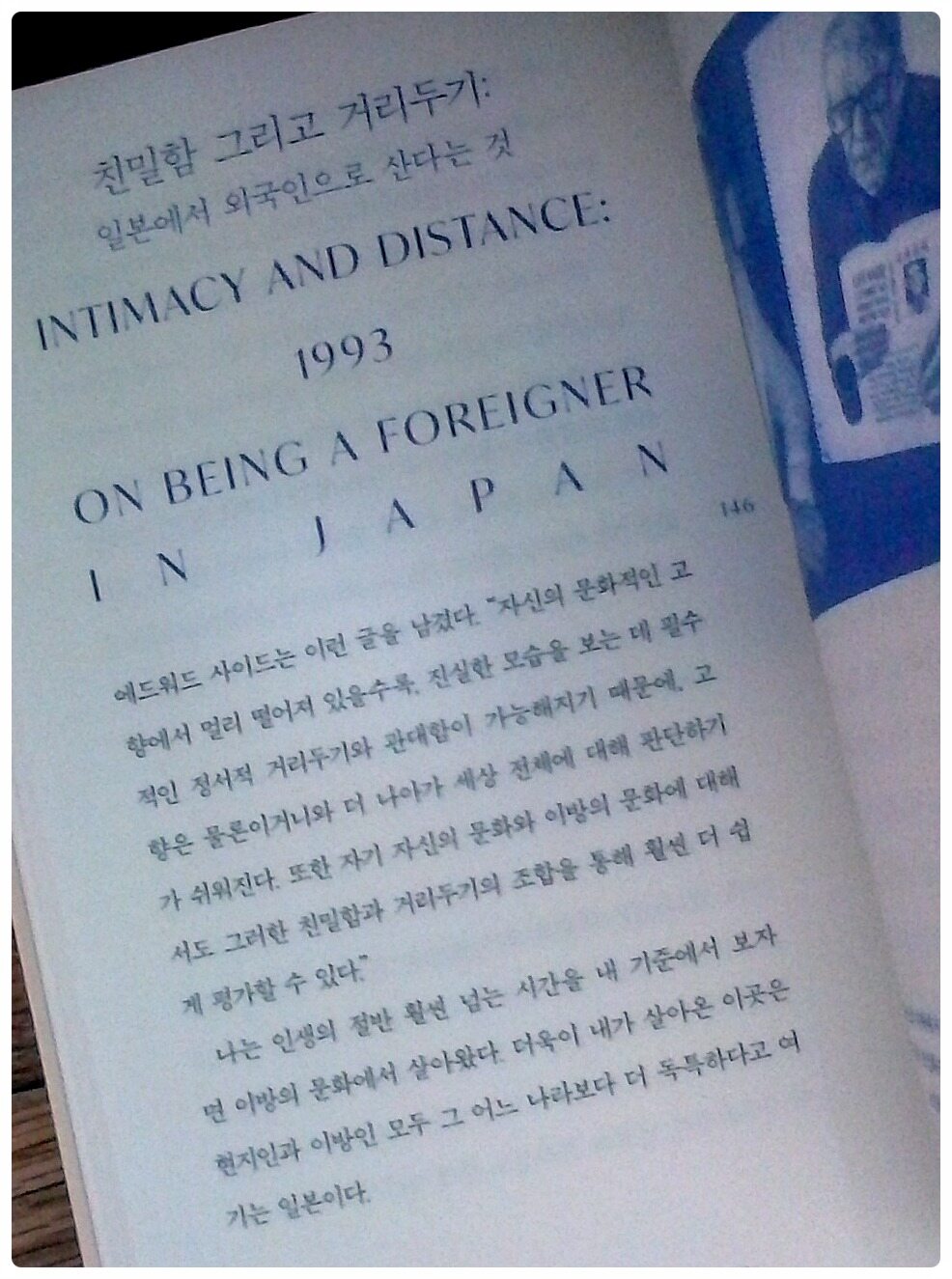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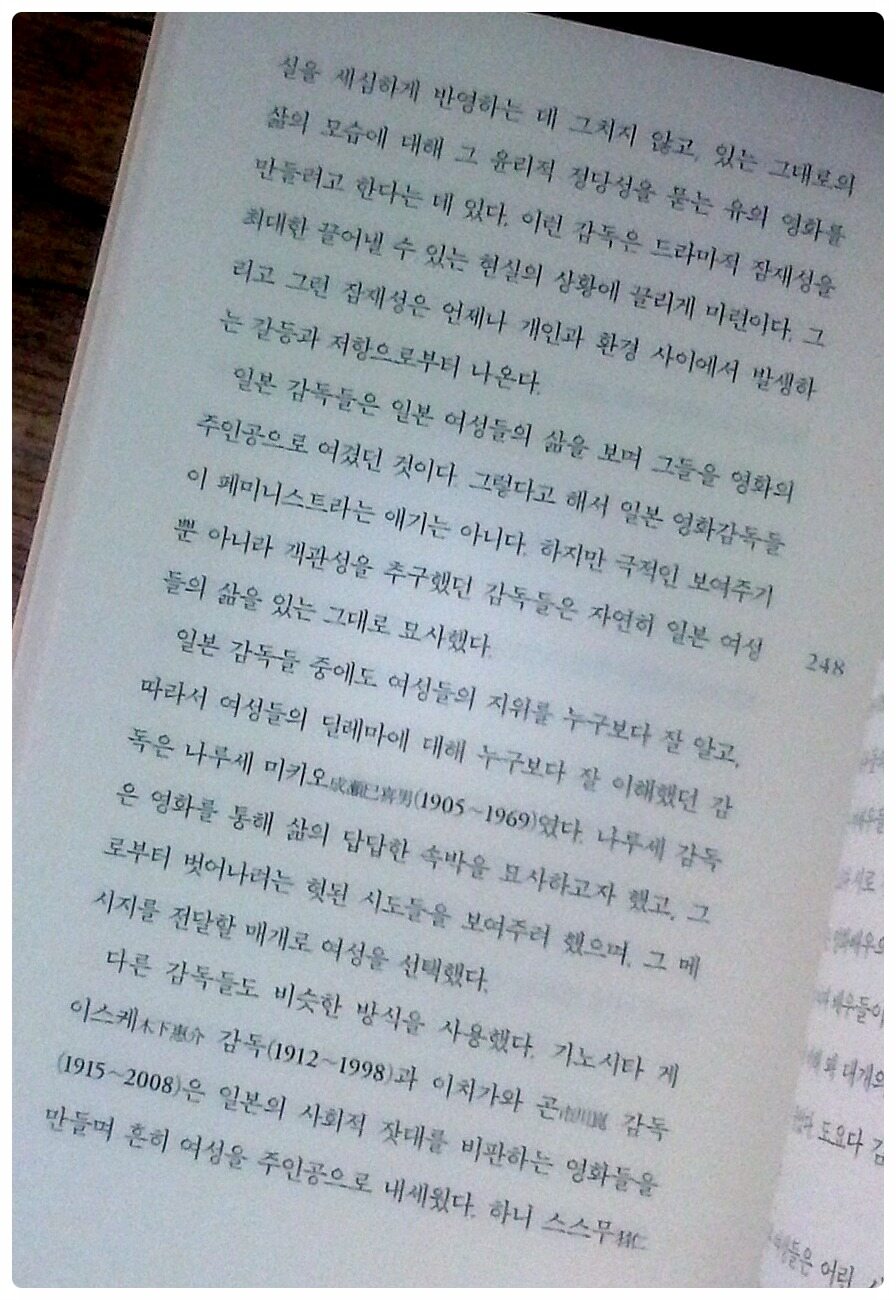
이제 막 9월이 되었는데 나뭇잎들이 노릇노릇하다. 가을공기에는 이별을 예감할 기운이 가득하다. 지나가고 떠나가는 모든 순간이 이별이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저자가 가치 있다고 한 되돌아보는 일이 깊고 서늘한 계절이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간 얘기다. (...) 그러므로 역사의 긴 복도를 되돌아보는 일은 가치가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세상, 아름다움의 특징들을 분류하던 세상, ‘미학’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던 세상을 돌아보는 일은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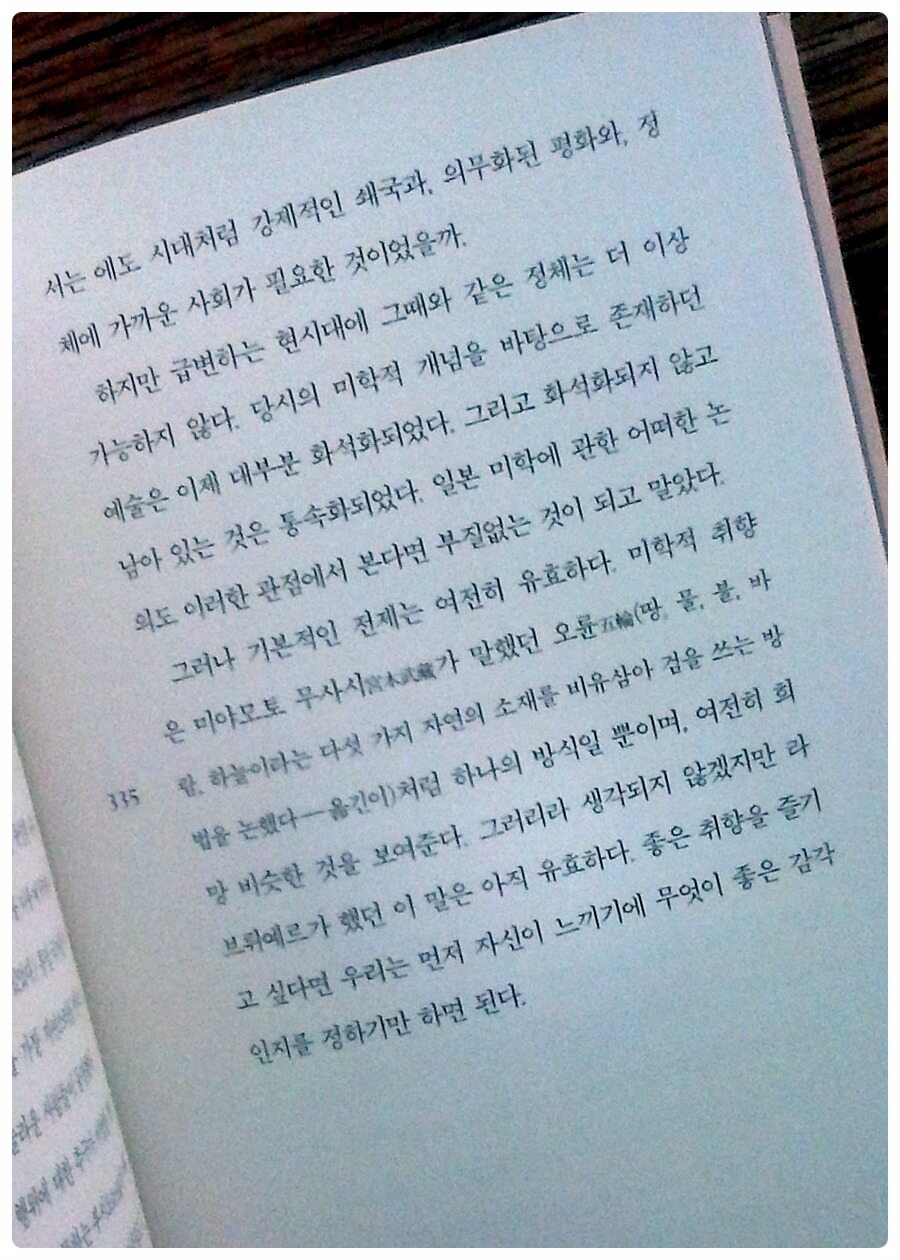
아담하고 무겁지도 않은 책에 재미난 내용이 가득해서 초고의 반도 더 줄여서 남겨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