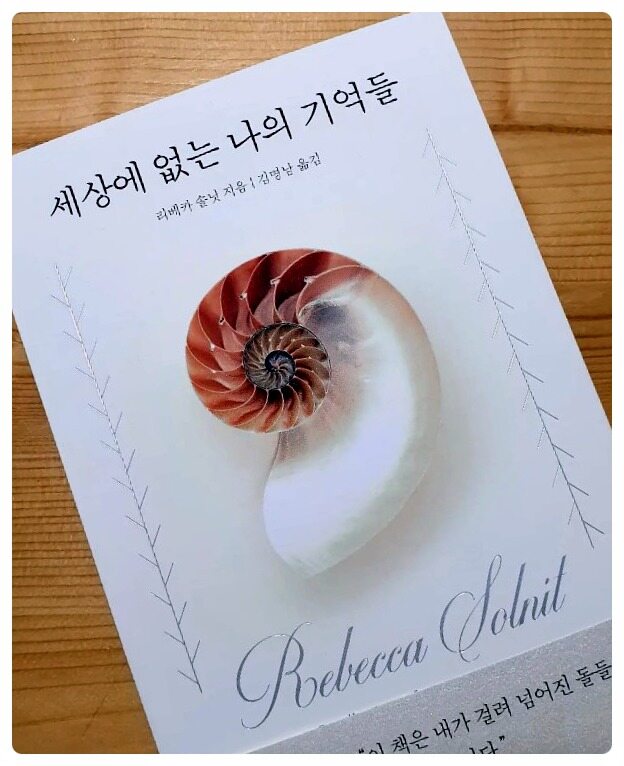-

-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
리베카 솔닛 지음, 김명남 옮김 / 창비 / 2022년 3월
평점 :



3일
“그 시절 나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읽는 잡식성이었다. 젊은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다.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자양분이 되는지, 무엇이 자신의 의욕을 꺾는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 차차 책의 숲에 난 오솔길을 따라가는 법을 익혔고, 지형지물과 계보도 익혔다.”

나는 묘하게도 반대의 길을 걸은 듯하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채워주시는 전집류...를 그야말로 독파하듯 읽었고,
전공이 생기고서는 전공 관련 서적들,
논문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메인에... 레퍼런스에... 책이 불러들이는 다른 책들...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국적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정말 못하고 모른단 생각을 했다.
한국어시험공부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그 또한 한 발 들어가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읽는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나이가 들수록 기준도 헷갈리고
길이라 보였던 곳도 흐릿해진다.
불혹도 못했고 지천명도 못할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책 속으로 도망을 간다.
그 세계에서만 안심이 된다.
해가 갈수록... 현실이 난망難望하다.
“내 시대와 장소를 일시 정지시키고 타인의 시대와 장소로 여행하는 행위인 읽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사라지는 방법이지만, 그저 저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라 내 마음과 저자의 마음이 상호작용하여 그 사이에서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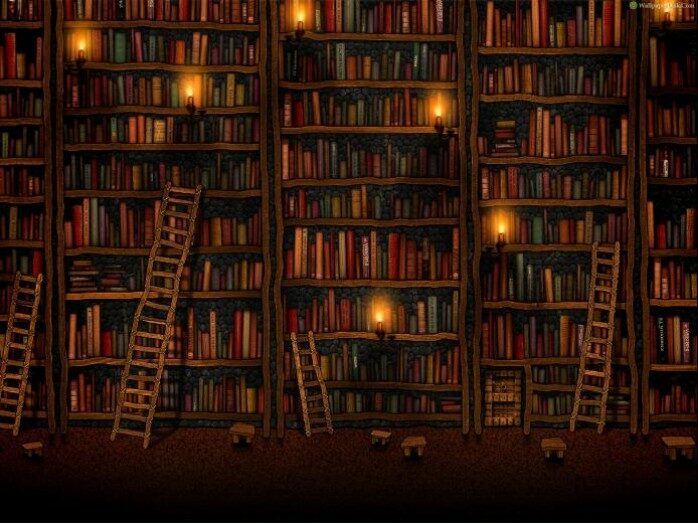
사라질 수 있어서 기쁘고
저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친밀하자는 욕망... 같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저자를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독자 모두의 거리감이 다 다르겠지만
나도 ‘그 사이’에서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기도 하는 걸까...
솔닛의 문장 덕분에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