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의 끝 여자친구
김연수 지음 / 문학동네 / 2009년 9월
평점 :



아까 잠시 들른 도서관에서 커피를 한잔 마신게 화근인지
도통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도 하루 종일 남은 일을 하려면 얼른 자야하는데..
중간 과제 제출 기한이 코앞이다. 역시 항상 모든 일을 닥쳐서 하는 나는 요며칠 정신이 없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와의 만남도 미루고 레포트 자료찾고 정리하느라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다.
더 황당한건 도서관에 가도 내가 찾는 자료의 책들을 볼 수가 없었다. 모두 대출중...
방통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다들 지금 열심히 중간과제 준비하느라 그럴거라고 이해하면서도 화가났다. 매일 겪는 일을 반복하는 내 자신에게...
머리를 굴리다 집앞 대학 도서관에 가니 지역주민 자격으로 대출도 가능하고 내가 찾는 책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평일 오전의 도서관은 썰렁하다 못해 추울정도로 아무도 없었다.( 비싼 등록금내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사실 눈치가 보인다.혹시 그들이 필요한 자료나 도서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지역 도서관은 자료실에서 노트북 켜놓으면 사서가 조용히 와서 경고를 주는데, 과제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 아무도 없으니 완전 내세상이었다.
상호대차 찾으러 잠시 들른 지역도서관에서 갑자기 아까 저녁 준비하면서 들었던 김연수님의 단편 소설이 생각나 찾아 들었다. 바쁠때 짬을내 읽는 소설 한편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다.(그 맛을 어찌 잊으랴) 게다가 김연수님의 소설이니 말할 것도 없다.
'당신들 모두 서른살이 됐을때' 낭독을 듣고 다시 읽으니 역시 달랐다.
억울하기만 하던 나의 30대를 다르게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의 40대를 어떻게
그려나갈지도 잠시 생각해봤는데 여전히 나는 조급하다. 남들은 한참 좋을때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항상 내게 얘기해왔지만 왜 나는 세상을 다 산 느낌이 드는 걸까?
내친김에 그 뒤에 레이먼드 카버에게 라고 작게 쓰여진 '모두에게 복된 새해'도 쭉 읽어 내려갔다. 레이먼드 카버는 김연수님이 번역하시는 바람에 나에게도 친숙한 작가이다.
이거 내 얘긴가? 할 정도로 섬세함이 느껴지는 글을 읽고나니 갑자기 김연수님이 더 좋아지면서 우울했던 기분이 업되었다. 올해가 다하기전 내가 꼭 한번 그분을 만나보리라는 희망도 품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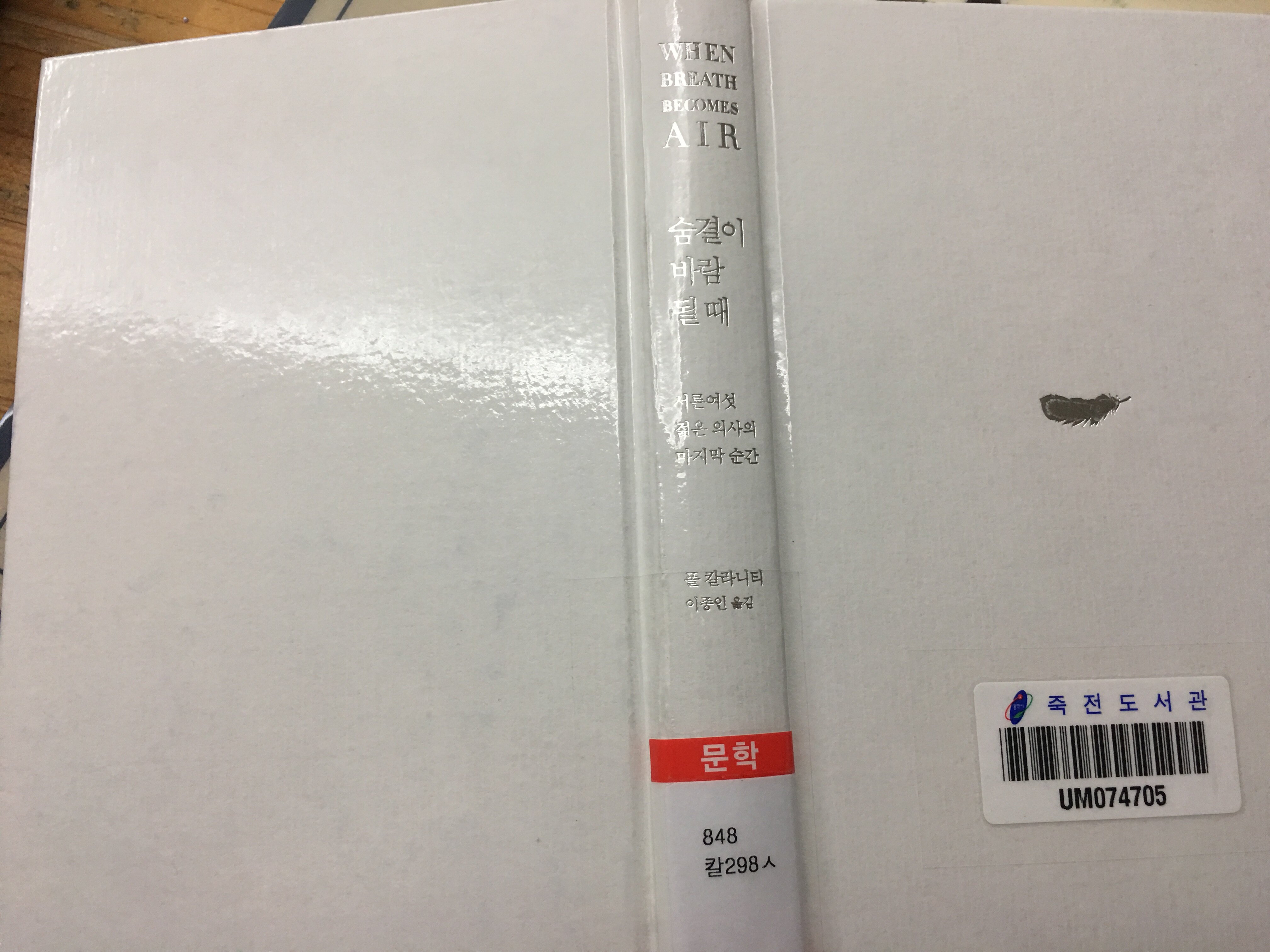
며칠전에 읽은 <숨결이 바람 될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데
자신의 죽음 앞에 어찌 이렇게 초연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지 나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평소 죽음에 대해 많이 보고 생각해 왔기때문이겠지...(죽음 앞에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나?) 그가 의사가 되기전 영문학을 전공한 문학도 였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거의 있을 수 없지만 미국에서도 흔한일은 아닐 듯하다) 죽음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는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가 추천한 죽음에 관한 문학책들을 읽어가며 생각을 해봐야겠다. 솔제니친 <암병동>, B.S.존슨 <운 없는 사람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네이글 <정신과 우주> 등등...
이 책들을 읽고나면, 나의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하지만 지금도 나는 폴처럼 죽음을 앞두고 레지던트 생활로 돌아가는 일을 절대로 하지못할 것이다.)
가족들이 폴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과정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부인의 에필로그도 매우 감동적이어서 내 기억에 오래 남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