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소설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아주 드물게, 무엇인가를 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같은 작품. 처음에는 읽고 무엇인가를 써볼까..생각했지만, 읽다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만, 누군가가 억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설의 처음 첫번째 장(章)을 읽으면, 읽는 사람을 이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은 더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 장은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는다는 사실이 점점 고통스럽게 느껴질 즈음, 어느 틈엔가 그 읽는다는 의미의 어떤 숭고함을 생각하게 된다.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과 읽음으로써 그것을 지탱시키는 것의 의미 말이다. 아무튼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그런 소설이다.
아마도 무엇을 말하기가 힘든 것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 앞에 가로놓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것. 이 소설은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점점 인간 일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간다. 과연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한강 작가의 말대로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거나 악한 인물이 있었고, 그 반대로 보기 드물게 선하거나,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애쓰던 이도 있었다. 인간이란,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소설의 가치는 그런 불투명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한석 평론가가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에 대한 비판론(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비판론이었다)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투명하게 영화가 될 수 없고, 영화도 투명하게 세상이 될 수 없으며, 양쪽은 영원히 그래서도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소설을 비롯한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야기가 투명해질 때 종종 실세계가 불투명함을 우리는 잊고, 이야기의 카타르시스를 세상에 대한 카타르시스로 혼동하거나 쉽게 대체한다. 내가 밑에 올려놓을 몇 권의 책은 불투명한 상태로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불투명함이 이야기를 읽고 내려놓는 마지막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혹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도 말이다.

뿌리 이야기 - 2015년 제3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숨 외, 문학사상사
나같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소설집이다. 시간을 가지고 진득히 챙겨봤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이렇게라도 해야겠지. 어째 왠지 늘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것 같은 인상은 있지만, 그래도 이상문학상을 읽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한해를 시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휴전, 마리오 베네데티, 창비
군부독재, 도시 노동자, 염세주의와 숙명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낯설어 보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이 느낌. 나도 요새 자꾸 염세주의와 숙명론이 엄습하는데,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될까.

붉은 밤의 도시들, 윌리엄 S. 버로스, 문학동네
반양장은 지난 달이고, 양장은 이번 달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작품은 유토피아 공화국 리베르타티아를 건설한 실존 인물 미션 선장에 영감을 받아,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저질러진 치명적인 실수들을 돌이키기 위해 탄생한 유토피아 소설이다.'라는 출판사 설명을 봐서는 내 취향에 딱일 것 같은데, 아마도 안되겠지. 안될거야.

상상범, 권리, 은행나무
예전에 '씨네21'인가, '한겨레21'인가에 연재되었던(아니면 비운의 만화잡지 '팝툰'에서였나..) 글들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2322년 URAZIL의 세계라니, 재미있을 것 같다. 위에 건 유토피아, 이건 디스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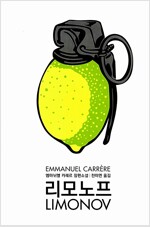
리모노프, 엠마뉘엘 카레르, 열린책들
다른 분들의 추천을 믿고 골라보는 한권. 로쟈님의 추천이나, guiness님의 추천을 봐도 그렇고, 추한 망나니의 '문학적 다큐멘터리'나, '기록문학'이라는 설명을 봐도 그렇고, 꽤나 흥미진진한 독서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