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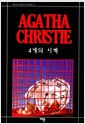
-
4개의 시계 ㅣ 애거서 크리스티 미스터리 Agatha Christie Mystery 71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황해선 옮김 / 해문출판사 / 1991년 8월
평점 :



원제 - The
Clocks, 1963
작가 - 애거서 크리스티
속기 타이피스트 셰일라는 고객의 요청으로 어느 집을 방문한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신원불명의
남자 시체와 네 개의 시계였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은 타이피스트를 부르지 않았다는 집 주인의 주장과, 현장에 있던 시계가 한 개 사라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게다가 셰일라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타이피스트마저 살해당하자,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데……. 결국 우연히 그
사건에 휘말린 콜린이 포와로에게 조언을 요청한다. 그는 배틀 총경의 아들로, 스파이를 잡기 위해 근처를 탐색하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읽는 내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지 궁금했고, 결말을 읽으면서는 놀라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했던 책이다. 거기다 우연이 너무 겹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자세히 밝히면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거 같아서 패스하려니, 감상을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처음에는 콜린이 수사하던 스파이와 연쇄 살인이 연관이 있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토미와 터펜서 부부가 나왔던 ‘N 또는 M N or M?, 1941'과 너무 흡사해질 것 같았다. 물론 크리스티의 작품 중에 비슷한 느낌을
주는 책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흐음.
그러다가 스파이 얘기는 쏙 들어갔다. 아, 이건 상관없는 거구나. 그러다가 잉?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건 너무 지나친 우연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포와로의 논리에서 우연이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마지막 콜린의 사건 부분은 아무래도 우연 같다.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런
함정을 팠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걸 알 정도면 영국 정보부를 능가하는 건데…….
어쩐지 포와로가 귀엽게 나왔다. 처음에는 자신은 절대로 집밖으로 나와 사건 현장을 둘러보지 않을
거라고 콜린에게 선언한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며칠 묵으러 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파트를 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다. 흐응, 따, 딱히 너를 위해서 현장 근처로 온 게 아니야. 아파트 수리 때문이라고! 자꾸 물어보지 마! 나도 인간이니까 호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 츤데레라고 해야 하나? 아, 완전 귀엽다!
그나저나 포와로의 신문에 대한 견해가 흥미롭다.
“의자에 앉아서 신문기사를 읽기만 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사실이란
정확해야만 하는데 신문기사가 정확한 경우는 극히 드문 법이니 말이오.”-p.279
이 책이 1963년도에 나왔는데, 언론의 정확성에 관한 논의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