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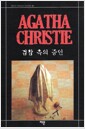
-
검찰측의 증인 ㅣ 애거서 크리스티 미스터리 Agatha Christie Mystery 33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최운권 옮김 / 해문출판사 / 1990년 10월
평점 :



원제 - Witness for the Prosecution and Other Stories, 1948
작가 - 애거서 크리스티
아홉 개의 단편이 수록되어있는 단편집이다. 마지막 편에서만 포와로가 나오고, 다른 여덟 편은 우연히 사건사고에 휘말린 주인공들이 나온다.
‘검찰측의 증인’ 이건 예전에 EBS에서 특별 영화로 본 기억이 있다. 그 때, 막판 반전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소설은 영화와 결말이 달라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여운을 남겨주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붉은 신호등’ 역시 막판 반전을 주는 이야기였다. 강령술이 나와서 분위기를 묘하게 이끌었지만 음, 그건 훼이크였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22% 정도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 남자’는 음, 괴담 모음집에 나올법한 내용이었다. 빙의인지 다중인격인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모를 소녀들의 이야기. 여름 괴담물로 딱이었다.
‘SOS’는 읽으면서 자꾸 비슷한 다른 내용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선가 비슷한 분위기의 글을 읽은 것 같은데,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진 모양이다. 돈이 뭔지, 참. 기른 정보다 낳은 정이 더 강한가보다.
‘유언장의 행방’은 읽으면서 빵 터졌다. 자업자득이다. 나쁜 놈. 윌리엄 브린튼의 단편 ‘존 딕슨 카를 읽은 사나이’와 제목은 생각 안 나지만 계속 바뀌는 액자 그림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영화가 떠올랐다. 거기서도 저승에서 돌아오는 친척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돈 많은 노인을 심장마비로 죽이는 나쁜 놈이 나왔었다.
‘청자의 비밀’은 좀 안타까웠다. 그런 식으로 당하다니,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 하긴 그에게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런 결말이라니.
‘나이팅게일 커티지 별장’은 세상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걸 새삼 알려줬다. 만약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전화기가 그 때와 달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지. 갑자기 한눈에 반했다고 들이대는 남자를 조심해야하는 이유를 제공해줬다.
‘우연한 사고’를 읽자마자 든 생각은 ‘으앙, 불쌍해!’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는지 아니면 상대의 오지랖 때문에 그러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역시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좋지 않다.
‘두 번째 종소리’에서 포와로가 등장한다. 자신의 저택에서 살해당한 남자.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데, 포와로는 발자국과 꽃밭의 상태 그리고 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만으로 범인을 밝혀낸다.
이번 단편집은 몇 개만 빼고 여름 괴담집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추리 소설 단편에서 좋아하는 트릭의 독창성이나 정교함 내지는 상황의 반전보다는, 음울하고 묘한 분위기와 다소 억지스럽지만 말이 되는 상황을 더 강조한 것 같았다. 난 크리스티의 정교하게 맞춰진 사건 트릭이 더 좋아해서 아쉬웠지만, 몇몇 이야기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