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1 (금) 서울시향 말러 교향곡 7번 성시연 부지휘자
역시나 공연 후기 페이퍼를 느즈막히 작성한다.(이번주 금요일에는 9번 교향곡이 잡혀있다) 요즘 ‘말’들이 많다. 정명훈 서울시향 음악감독의 연봉이 20억이 넘으며 너무 과하다고 말이다. 사실 연봉은 2억이 조금 넘는다. 문제는 그 이외의 부수 비용과 그 지출내역이 문제다.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듯 하다.
그런데 이 논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듣는 클래식 음악에 그것도 우리 음악도 아닌 서양음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그 돈 있으면 ‘국악’에나 투자해야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정말 아닌 듯 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의 정치적인 색깔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정명훈 지휘자의 음악은 좋아한다. 그리고 그의 취임 이후 서울시향의 발전은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이제 공연 애기를 해보자. 벌써 1년이 지났다. 작년 8월 26일 말러 교향곡 2번의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그 전에도 말러의 교향곡을 좋아했지만, 그 날의 공연 이후 더한 애착과 ‘실연(實演)’ 감상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오늘은 교향곡 10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명훈 지휘자가 아닌 성시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다. 제임스 드프리스트의 교향곡 10번 공연(사실 이 날 공연도 다른 어떤 공연보다 상당히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한다)때는 객석의 빈자리가 꽤 보여서 이번 공연에서도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날 첫곡은 Wagner의 Lohengrin 1막 전주곡이다. 예습은 DG에서 1971년 녹음한 Rafael Kubelik 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의 연주를 들었다. 아직 오페라를 듣고 있지는 않아 느낌은 사실 별로다. 오페라 전주곡 정도 듣는 정도이니, 하여튼 이 음반은 로엔그린 음반중 손에 꼽히는 명반이라고 불리우는데 음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는 듯 하다.

서울시향의 로엔그린 1막 전주곡의 러닝타임은 8분 30초 정도였다. 다른 연주와 대동소이한 수준이였다. 도입부에 천천히 이어지는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의 묘한 멜로디 라인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음반으로 들을 때는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듣지는 않는 편이지만 공연장에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연주자들의 움직임과 소리를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듣게 된다. 그러면서 악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하여튼 도입부 주요 멜로디 라인의 선율 처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담백하면서도 유려하다. 그리고 호른의 소리도 상당히 깨끗하다. 이런적 처음이다. 살짝 아쉬운 점은 후반부 클라이맥스 부분에서의 심벌즈의 소리가 너무 소심하게 처리된 듯 하다.
드디어 말러 교향곡 7번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곡이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들이 이 곡을 어려워 하는 것 같다. 우선 예습은 크게 두 앨범으로 들었다. SONY에서 1965년 녹음한 Leonard Bernstein과 New York Philharmonic의 앨범, 그리고 Hanssler에서 1993년 녹음한 Michael Gielen과 SWR Sinfonieorchester Baden-Baden und Freiburg의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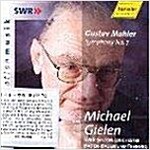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곡인 이 곡의 나름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이는 ‘길렌’ 옹이다. Hanssler에서 나오고 있는 그의 앨범들의 경우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음이 아쉬울 따름이다.(다행히 음원으로는 좀 가지고 있다.)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된 것은 헌책방(신촌에 있는 ‘숨어있는책’)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을 때이다. 그때 들은 곡은 브루크너 교향곡 3번이었다. 내가 처음 브루크너 교향곡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교향곡 3번 부터였다. 헌책방에서 이리저리 책을 고르며 귀에 들어오는 길렌 옹의 브루크너 사운드를 들으며 기분 좋게 책들 사이를 헤매던 기억이 난다. 책을 구매한 이후에 친절하신 사장님께 음반을 빌려 들어보게 되었다.

나 같은 경우 아직 애기가 어려 집에서 여유 있게 오디오에 CD를 넣고 감상을 하지는 못하고 거리를 헤매며 헤드폰(AKG K-450 3년 정도 전에 샀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소리도 괜찮은 듯 하다. 다른 놈 하나를 사고 싶은데 혹 좋은 헤드폰 아시는 분?)을 통해 듣거나 운전(이번에 새로 산 차가 Bose 스피커가 달려 있어 나름 들을만 하다)을 하며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길렌의 말러 7번의 경우 1악장 도입부터 내 귀에 ‘쏙’ 들어왔다. 음질도 상당히 맘에 들었다. 멜로디의 변화가 크고 소리의 폭이 큰 이 곡의 경우 잘 못하면 귀가 상당히 피로할 듯 한데, 79분이나 되는 이 곡을 상당히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Gustav Mahler Sinfonie No.1 4mov Sinfonieorchester des Südwestfunks
Dirigiert von Michael Gielen Freiburg, 2002
그러면 서울시향 성시연 부지휘자의 말러 7번은 어떨까? 1악장. 러닝타임은 21분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다들 기대하고 있을 도입부의 테너호른(실제로는 처음 봤다. 연주자가 악기를 잡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 솔로. 연주자도 외국인으로 전용 연주자를 따로 기용한 듯 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처음부터 어긋난다. 도입부의 “빰빠~빰빰~~”하는 부분부터 이상하다 싶더니 중간부분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음이탈이 발생했다. 번스타인의 1965년 앨범처럼 당당하게 쭈욱 뻗어나오길 기대했는데 너무 과한 기대였나? 그리고 워낙 튀는 부분이라 조금의 음이탈도 귀에 쏘옥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쉬웠다. 그 이후 보니 연주자의 얼굴도 멀리 있는(난 항상 2층 A블록 맨 오른쪽 통로 부분에 앉는다) 나에게 보일 정도로 티나게 좀 붉어진 듯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자신감이 상실된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호른 파트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서울시향의 공연 후기를 쓰며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호른 파트의 약점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1부의 로엔그린 1막 전주곡에서도 느낀점이지만, 오늘 호른 파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보였다. 호른 부수석인 미샤 에마노프스키(Michal Emanovsky)의 오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나머지 한명 전 6번 공연때 보였던 인물인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악장의 발전부 초기 부분의 바이올린 소리는 신경질적으로 들리더니 끝부분 하프의 아름다운 소리에 이어지는 바이올린 솔로는 왠지 전체 음악과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너무나도 확연히. 'solo'라고 하면 왠지 "나야 어때 멋있지.."해야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제 뭐야 별것도 아니네..."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할까?
사실 1악장 중 최고(?)는 후반부였다. 언제나 만족감을 주는 팀파니 수석 아드리앙 페뤼숑(Adrien Perruchon)도 후반부에서 실수를 한 듯 보였다. 치면 안되는 부분에서 한 번 친 듯 보였다. 이것은 다분히 내 느낌이다. 미묘한 연주자의 표정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모든 악기들이 따로 노는 듯 했다. 비유하자면 지휘자 4명이서 연주를 하는 듯 했다. 연주자들이 집중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듯 보였다. 당연히 잔실수도 많이 들렸다. 그런데 당시 공연장에서 듣기에도 이 곡은 지휘자건 연주자건 상당히 까다로운 듯 한건 사실이다.
2악장 ‘Nachtmusik I’이다. 러닝타임은 15분 약간 넘은 듯 했다. 다른 곡들도 찾아보면 14분에서 17분 정도로 연주되고 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긴 시간은 EMI에서 1968년 녹음한 클렘페러와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음반으로 22분이다. 2악장 또한 음산한 호른 솔로 파트가 시작을 알린다. 그에 이은 클라리넷. 정말 ‘베리 굿’이다. 서울시향의 목관 특히 클라리넷 파트는 지금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으레 그러려니 한다.(ㅋㅋ) 그러나 전체적으로 패시지(passage)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딘지 자꾸 귀에 거슬린다. 단순히 원래 곡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다. 2악장을 들으며 드는 생각은 확실히 어려운 곡이라는 생각이다. 조금만 집중이 흐트려지면 ‘삼천포’로 가기 딱 쉬울 듯 하다.
3악장 Scherzo이다. 런닝타임은 10분 정도이다. 아르떼 TV를 통해 몇 번 본 성시연 지휘자의 모습도 그랬지만(물론 머리스타일은 조금 바뀌었다) 지휘 동작을 보면 나에게는 좀 부담스럽다.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다. ‘감정의 쓰나미’? 하도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검은색 연미복의 안감이 보였다. 그런데 검은색과 너무 대비되는 분홍색이었다. 내 스타일이 뭘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보는 스타일이라 이런 것 까지 눈에 들어왔다. 나도 쓰고 보니 내 자신이 좀 웃기긴 하다.
연주 내내 느끼는 거지만, 이번 연주에서는 유독 지휘자가 첼로 파트를 보지 않았다. 지휘자 왼쪽부터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연주 내내 첼로쪽은 보지를 않는게 아닌가? 왜 그런지 지금도 궁금하다. 참고로 이날 첼로 수석은 이정란 부수석이 맡았다. 완전히 상황이 첼로 파트가 지휘자에게 ‘따’ 당하는 느낌이었다.(심지어는 4악장 첼로 솔로 파트에서 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내가 예민했던 걸까? 그리고 재미있던 사건은 연주를 들으면 정명훈 지휘자처럼 암보로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간단한 총보를 보고 지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날 성시연 지휘자는 조그만 총보 두고 지휘를 했는데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렸다. 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나에게는 크게 느껴진다. 지휘자가 그렇게 크게 소리날 만큼 총보를 넘기는게 무슨 의미였을까? 긴장을 했다. 아니면 뭔가 연주에서 틀리거나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경질적이었다? 하여튼 별 생각을 다하는 듯하다!!
다시 Nachtmusik II이다. 4악장의 러닝타임은 14분 정도이다. 4악장의 백미는 1바이올린 맨 뒤편에 있던 기타와 만돌린이었다. 음반으로만 들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악기들의 매력 말이다. ‘띵띵띵띵...’하는 소리가 아주 묘하게 들렸다. 타악기 주자들은 편히 쉬고 있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 말이다. 그런데 불연 듯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지휘자들의 왼손과 오른손 지휘봉의 움직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물론 지휘법과 관련된 책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손대기는 힘들 것 같다. 하여튼 궁금하다. 그리고 왼손으로 지휘봉을 드는 지휘자들도 있을까?
Gustav Mahler, Symphony No. 7 Mov. 5, "Rondo-Finale: Tempo I (Allegro ordinario)"
Conducted by Leonard Bernstein, Wiener Philharmoniker
대망의 5악장이다. 러닝타임은 17분 30초 정도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5악장이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5악장이 어색하기도 하련만 시작을 알리는 페뤼숑의 팀파니 타격은 정말 발군의 실력이었다.(아마도 4악장에서 쉬면서 힘을 많이 비축한 듯 하다. ㅋㅋ) 또한 발전부에 나오는 팀파니 솔로 부분은 거의 드러머의 현란한 움직임과 다르지 않았다.(그러고 보니 팀파니의 북도 5개였다.) 왼손, 오른손 반대로 움직이며 타격하는 모습은 전성기 젊은 시절의 메탈리카 드러머 라스 울리히(Lars Ulrich)를 보는 듯 했다.
철학자이자 음악학자인 아도르노는 5악장에 대해 “화려한 외부와 궁핍한 내부 사이의 불균형”이라 비판했고, 음악학자 데릭 쿡 역시 이 악장을 실패작으로 애기 했다고 한다. 물론 전문적이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복잡’한 의견일 것이다. 범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밤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음악에 난대 없이 튀어나오는 ‘팡파르’이지 않을까 한다. 물론 ‘난대없다’는 건 역시나 전문적 식견 없는 나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제 3일만 있으면 말러의 9번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대망의 8번 ‘천인 교향곡’도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아쉽기도 하다. 다음에 꼭 다른 악단이든 서울시향이든 말러 치클루스를 진행 했으면 한다. 하지만 다행히 내년 서울시향 시즌 티켓을 전체 패키지로 싸게 구매해서 정명훈 지휘의 1월 13일 볼로도스와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부터 12월 28일 대망의 베토벤 교향곡 9번까지 표를 벌써 예매해 두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벌써 기대된다.
ps : 내년 시즌 프로그램은 보면 객원지휘자들의 면모가 상당히 매력적인건 사실이지만, 정명훈 음악감독의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 정도면 사실 상임 지휘자라고 애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