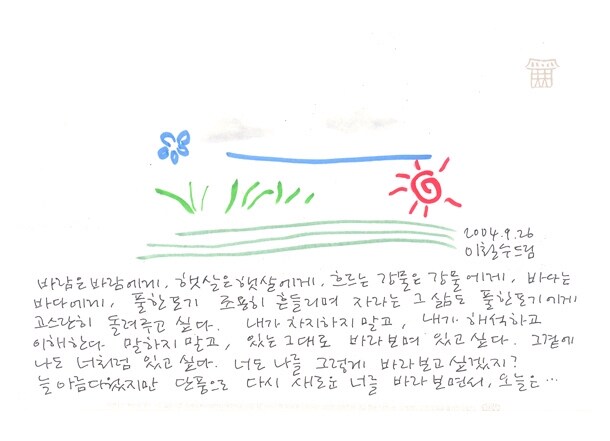
바람은 바람에게, 햇살은 햇살에게, 흐르는 강물은 강물에게, 바다는 바다에게, 풀 한 포기 조용히 흔들리며 자라는 그 삶도 풀 한 포기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 내가 차지하지 말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한다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있고싶다. 그 곁에 나도 너처럼 있고 싶다. 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싶겠지? 늘 아름다웠지만 단풍으로 다시 새로운 너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참! 좋은 말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며 곁에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하려 하다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