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랑의 기초 : 한 남자 ㅣ 사랑의 기초
알랭 드 보통 지음, 우달임 옮김 / 톨 / 2012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어릴 적에 많이 읽었던 동화의 결말은 대부분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결혼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테다.
이 소설은 열정적인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난 후의 이야기다.
함께 있으면 마냥 즐겁고 행복해서 결혼 했지만, 오래도록 행복할 거라는 그들의 기대가 어떻게 현실로 실현되는지... 낭만적인 '연인' 관계가 끝나고, 그 후 시작된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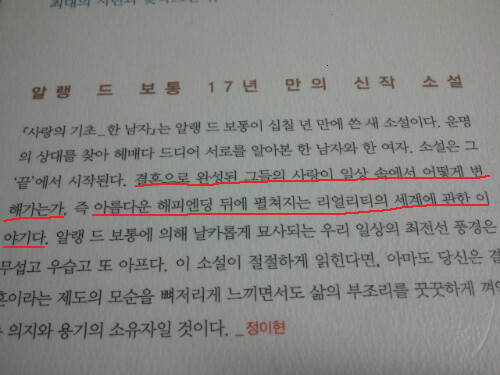
소설의 카테고리를 하고 있지만, 결혼과 오래된 관계에 대한 에세이다.
정이현의 '사랑의 기초'가 결혼전의 연인들 이야기라면, 알랭드 보통의 '사랑의 기초'에는 결혼후의 한 남자의 이야기다. 낭만적인 사랑이 결혼이라는 결실로 엮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충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서약이 어떻게 현실과 접목되어서 변질(!)되어 가는지가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시종일관 씁쓸하다. 결혼한 내 입장에서 수긍이 가고, 바로 우리 부부의 이야기 이기도 하니까. 내 남편의 머리속에도 어쩌면 같은 생각이 들어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처음엔 열정적이었다가 점차 시드는 게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통해 상대방을 "내꺼!" 로 소유했다는 안도감이 서로에 대한 긴장과 설레임을 빼앗아 버려 사랑에 대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단점일 수도 있겠다. 아니 사랑이 일상과 맞닥뜨렸을 때의 얘기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랑' 말고도 다른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무', '책임', '희생' 그런 것들도 덩달아 따라온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 행복과 불행의 수치가 어느 것이 높으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지어진다고 한다. 숫자는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라도 행복이 조금 더 우세하면...
"아~ 행복해!"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였다.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역할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
기쁨, 즐거움, 만족 VS 의무, 책임, 희생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이 품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과 의무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양보한다. 그러나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 더 이상 양보하기가 싫어진다. 상대방이 좀 더 많이 의무를 이행했으면 바라게 된다.
기쁨과 즐거움은 줄어드는 반면 의무와 책임은 점차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의무, 책임, 희생)에 깃발을 더 많게 한다. 그래서 부부보다는 결혼전의 연인일 때가 더 행복한가 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조금 안도가 되는 것은 이 점이 대부분의 커플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