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변모하다. 그러니까 표지나 디자인을 달리한 개정판과 특별판도 나오고 일부는 작가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대체로 책을 구매하는 시기는 그 책이 출판되었을 즈음이 가장 많다. 어떤 책은 뒤늦게 재발견의 기쁨으로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만남도 있다. 미루고 미뤄서 이제야 손에 잡은 책, 읽으려고 펼치니 앞 부분에 가름끈이나 책갈피가 꽂힌 책. 이런 책은 읽다가 멈춘 책, 읽다가 멈추었다는 사시조차 잊은 책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읽다 보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다.

내가 미니 책장이라고 이름 붙인 책장에 그런 책을 수납하고 읽으려 한다. 그러니까 읽기에 치중하려는 사진과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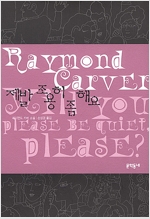
레이먼드 카버의 『제발 조용히 좀 해요』는 10년 정도 책장에 있었다.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도 곧 10년 가까이 될 것 같다.

그나마 캐럴라인 냅의 『명랑한 은둔자들』은 겨우 3년인다. 도대체 나는 어떤 책을 읽느라 이 책들을 모른척하고 지냈을까. 먼저 읽은 이들의 좋은 리뷰를 보며 나, 나도 이 책이 있는데 생각만 했다.

최근에 앤드퓨 포터의 단편집 『사라진 것들』을 보고 그의 다른 소설도 읽다 말았구나 싶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단편집에 자꾸 눈이 간다.
적어도 한 권 이상은 읽으려고 한다. 책장에 안긴 책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나를 잘 알기에 그건 장담할 수 없다. 1월이 가기 전에 한 권이라고 읽으면 나름 뿌듯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책장을 탈출한 책은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이다. 살구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정이 단단하고 부드럽다. 일상에서 빚어올린 은유와 상징이 아름답다.
눈과 비, 그리고 안개의 지배로 열린 하루다. 이 하루를 닫는 순간를 지배하는 건 무엇일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로 열린 하루의 끝은 내 의지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루를 알차게 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