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티야의 여름
트리베니언 지음, 최필원 옮김 / 펄스 / 2016년 8월
평점 :

절판


이 책을 읽기전 표지만 보고는 아주 여리디 여린 소녀를 상상하했고, 카티야가 그런 소녀쯤 일거라고 생각했다. 표지의 소녀와 막 매치되는
느낌.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시기는 꽤 오래전, 1930년대즈음인걸로 생각해보니 읽을수록 고전적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마을의 배경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고전내음을 약간은 풍기는 기분.
그런데 뭐랄까 이제껏 펄스에서 나온 책들을 봤을때 액션이나 스릴러가 많아서 이 책 또한 그런 부류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난 책도 펴기전에
막 추리할 준비(?!)부터 했었는데 책을 덮고 나서 흠, 연애소설인가 반전소설인가, 스릴러인가.. 혼자 막 고민을 했다. 아, 심지어
고전소설에 분류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이런 소설은 그 분류에 들어가 오래토록 읽혀도 괜찮치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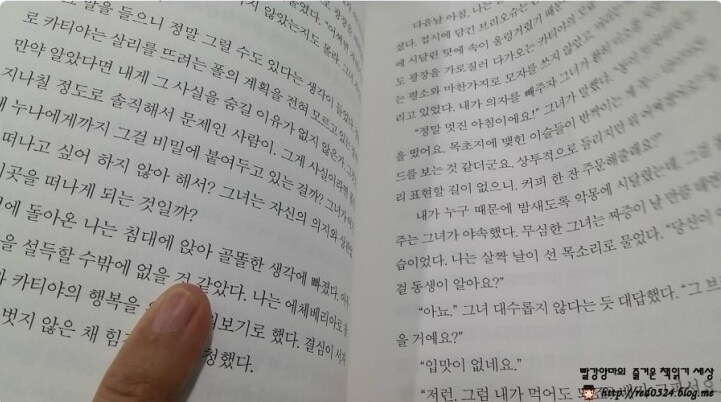
사실을 말하자면 이 책에서 뭔가 확~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래키거나 끔찍한 살인이 갑자기 생겨나서 오오오..범인 잡아야해.. 누구지?
누굴까?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아, 이거 스포라고 해야하나? 아닌거 같은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멀스멀
사람을 간질간질하면서 비밀스런 뭔가가 내 주위를 맴도는 기분을 계속 던져준다. 뭔가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일어난 듯한 기분. 게다가
카티야와 나(주인공)의 이야기에서 농담처럼 카티야의 집 정원에서 유령이야기를 할때는 정말 확~ 어디서 그 유령이 나타나서 내 주위를 맴돌것만
같은 무서운건 아닌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든다. 변화된 것 없는데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느낌?
그렇다. 몇년전 나에게 쓰리콤보를 맛보게 했던 <레베카>에서 느꼈던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심지어는 헨리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이 내 머릿속을 막 맴돌았다. 실체하진 않지만 심장을 죄여오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다.
분명 나의 사랑이야기인거 같은데.... 왜 사랑이 주가 아니고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압도하는가.
한마디로 트리베니언의 필력이 그만큼 분위기를 압도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긴장되게 하는 뭔가를 가진 작가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야할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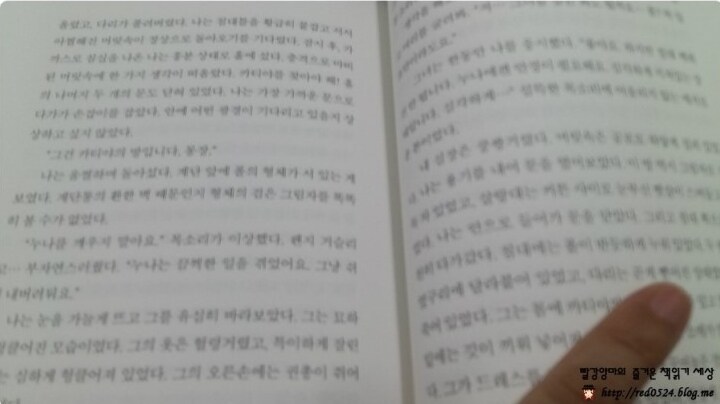
물론 단박에 나를 사로잡은 헨리제임스의 어마어마한 필력에 개인적으로 비할 순 없다. 하지만, 그 분위기 만큼은 헨리제임스를 떠올리게
만든다.
오히려 이 책의 대반전보다 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 책에 압도당했다고 봐야한다. 마지막 반전은 그동안 내 마음을 옥죄어 오던 그
스멀거리는 마음을 풀어주는 장치에 불과할 뿐일 정도로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강하다. 후~ 이런건 고전으로 길이길이 읽히는게 좋은데
말이지. 이제서야 이런 작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네. 우리나라에선 그리 유명하지 않은 듯 한데... 개인적으론 안타까울 정도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떤지를 어쩌면 제대로 보여준 소설이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