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지음, 김욱동 옮김 / 열린책들 / 2015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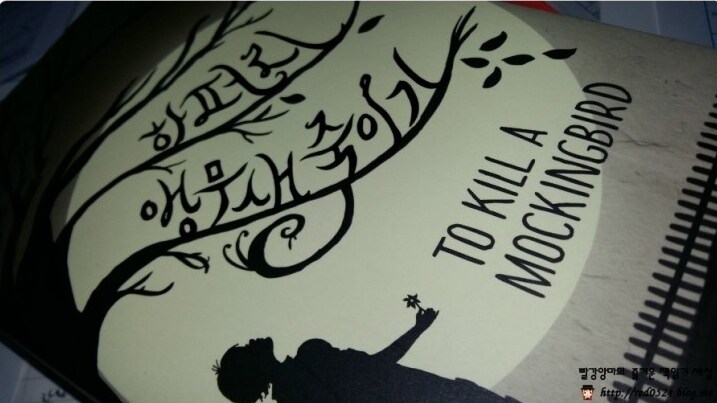
그러니까 나는 분명 이 책을 고등학교 졸업 즈음인지 그 한참후인지 가물가물하지만 꽤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난다. 그때 그 표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단조롭다고 해야할지, 뭔가 좀 아쉽다고해야할지... 아무튼 그런 표지였었다. 아무튼 그렇게 분명 나는 그 책을 읽었고 아무리
강산이 몇번(?)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토록 아무 기억이 안날 수가 있나 싶을만큼 이 책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대한 찬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뭐, 이런 문구에 읽기를 시작하긴 하지만서도 생각 저 먼 곳에선 '나한테 딱히 크게 각인되지 않았던
소설이었구만, 이렇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걸 보니. 그렇다면 이 화려한(?) 문구도 흔히들 쓰는 수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당최 이 책 제목만 기억날뿐 감동적이었다, 이 깊이의 무게는 감당키 어렵다 등등의 느낌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거다. 그래, 그냥 그렇고 그런 책이었나부다. 그랬나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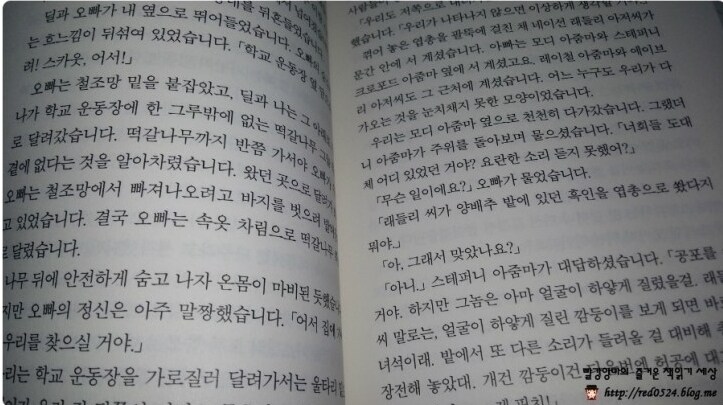
꽤 두꺼운 이 책의 초반부까지만해도 아니, 1부 이야기가 끝나고 2부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스카웃의 이야기가 시작 될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소설쯤으로 여겼다. 그리고 너무 오밀조밀 세밀하게 묘사를 해서 이걸 어찌 다 읽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2부가 시작되자 마자..... 그래, 이제 본격적인 젬과 스카웃, 그리고 아빠가 말로만 전하던 톰로빈슨의 재판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
이건 정말 그냥 그렇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느낀 바부탱이 라는걸 스스로 자각해야만 했다.
스카웃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1930년대 그때즈음의 시대상황과 이야기가 맛물려 돌아가며 작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힘을
발휘한다. 어느누구에게나 우리는 법앞에 평등하다 배우고,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다 배우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 살아간다고 배운다.
그리고 미국사회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민주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물론, 그 이전의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전쟁이 유명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고 배워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이론일 뿐 현실은 그렇치 않다. 심지어 우리나라마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돈 없는 사람은 불평등하다고 외치는 때가 아니련가. 그래도 그래도 말이다. 미국은 좀 그렇치 않겠지...하는
기대감이 조금은 내 뇌리에도 박혀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1930년대의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출입문마져 달라야하고, 백인은 우월하며 흑인은 못배우고 가난하고 예의마져 없다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아주 깊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 빼내기 힘들던 시기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한 톰 로빈슨에게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치
않는다. 정말 너무도 눈에 뻔히 보이는 진실이 있는데도 말이다. 거짓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도 백인이라면 그들의 말에
손을 들어줘야하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만, 역시 희망은 있었다. 어떻든간 흑인에게 편견의 시선을 가지지 않은 젬과 스콧의 변호사 아빠와
몇몇의 가슴 따듯한 이웃들이 존재했고 그 변화는 미미했지만 서서히 변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 하지만, 과연 이 책의 이야기가 전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세계뉴스를 전할때면 미국경찰이 과도하게 흑인 죄인들을 때리는 장면이나 아무 죄도 없는 흑인 청소년에게 총을 겨눠 죽기도 하고
그로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물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비단 흑백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모든 힘없는 것들에 대한 편견없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견해, 자신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등등 그야말로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의 무게를 가진 이야기였다. 어린 여자아이 스콧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야말로 어른들이
만들어 낸 말도 안되는 것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론 편견없는 시선을 지닌 사람 역시 존재함을 가르쳐 주는 따듯함이기도
했다.
아, 역시 이 책이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왔는지, 그리고 하퍼 리가 더이상의 소설을 써내지 못했는 지 이해가 될 만큼 깊이가 깊어 그
무게조차 가늠하기 힘든 대단한 책이었다. 정말 우린 다 같은 인간이 아니던가..... 다시금 인간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한 책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