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사를 품은 영어 이야기 - 천부적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영어의 역사
필립 구든 지음, 서정아 옮김 / 허니와이즈 / 2015년 3월
평점 :

품절


그래 뭐 사실 이 책을 들 때만해도 나는 뭣보다 의욕이 넘쳤다. 이 세상에서 과연 영어를 마주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세계언어로 영어를 택하고 있고, 아니 택하는게 아니라 자연스레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 그런 언어에 대한 역사를 알아간다는 건
뭣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작정 영어를 쓰기만 하고 그에 대한 역사를 모른다는 것도 뭔가 아쉬움이 있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공부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사정인데 이래저래 이 책을 들 시기쯤에 너무 집안팎으로 치이는 일들이
많다보니 꽤 오랜시간을 할애하며 책을 읽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되돌아가 다시 보고, 보고 한 부분도 없진
않치만 말이다.

영어가 처음 시작된 시기부터 영어가 발전해 오는 과정을 총 망라하며 이야기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영어가 발전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영국 역사를 보는 기분이 좀 깊었다고 할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대 이야기 부분은 일부 세계적 역사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이 자주 언급되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전개 될 때마다 오오~ 하는 감탄이 일었다. 역시 뭔가 새로이 이루어질때는 그 언어부터도 달라지고
이야깃거리들이 많아지는 건 분명한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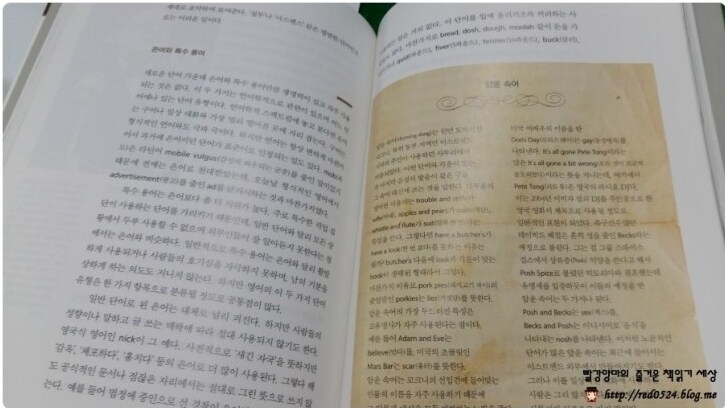
특히나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영어 사전을 편찬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 처음은 마치 사전을 무슨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전적의미를 진지하게
보다는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너무 인상깊었다. 오히려 요즘처럼 딱딱한 전달 방식보다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침은 있어선 안되지만 말이다. 뭔가 중심을 잡고 사전적 의미를 좀 더 재밌게 전달한다면 예전의 사전적 의미의 표현도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초창기는 영국에서 발전되어져 점점 세계화로 뻣어갔다면 영어가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오면서 미국과 관련된 발전을 거듭한다. 새롭게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소멸되면서 요즘에 맡게 나아가는 느낌, 아니, 퇴보일 수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영어뿐 만 아니라 모든 언어부분에서 단어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축약된 단어들로 보수적인 관점이나 역사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무엇보다도 염려한다는 사실이다. 꼭 영어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인터넷이나
문자상으로 단어들이 축약돼서 모두들 걱정하고 세대간의 차이로까지 인식하는 지경이니 언어에 대한 고민은 세계 어디나라든 똑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세상을 정복한 언어는 정말 말 그대로 영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일단 영어를 들이대고 물어보면 뭔가 기본적인 답은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 한글 처럼 훌륭한 언어를 가진 우리 민족은 좀 아쉬운 마음도 든다. 이런 좋은 말을 세계언어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크하하하하.. 나의 욕심이련가. (사실 영어 공부 하기 싫어하던 사람이라 한글이면 그냥 다 해결될까 싶어서.... 크크)
초창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된 영어의 역사는 그야말로 신기하고, 재밌다. 물론, 이해 못하는 부분은
몇번씩 다시 돌아보며 읽어야 했지만, 세계언어를 알아가는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련가.
영어도 알면 알 수록 신비로운 세계구나. 그들도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는 구나 라는 걸 깨닫는 다는 자체만으로도
꽤 유용한 책 읽기가 아니었나 싶다. 자, 우리모두 영어의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볼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