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곱 편의 이야기, 일곱 번의 안부
한사람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1월
평점 :

절판


이 책은 그동안 내가 가진 선입견들을 다 깨준 책이 아닌가 싶다. 나는 사실 한국소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편에 속하고, 심지어 단편소설 또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다. 그럼에도 뭔가 이 책은 끌렸다고 해야하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라는 느낌이 있는 책이었다.
일단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었고 표지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모습은 너무 이뻐서 질투날만큼이지만 왠지 나의 워너비 모습 같기도 한 그런 느낌.
첫 작품집이라는 사실이 더 설레임을 안겨줬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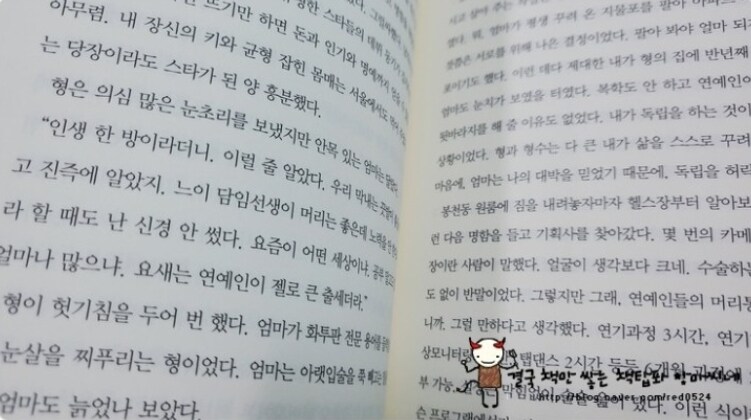
첫번째 단편 토지문학 대상을 받은 작품은 읽으면서 정말 대상의 느낌이 온전히 전해지는 느낌.
주인공은 비록 개이지만, 우리들 모습을 개의 눈으로 쳐다보게만 했을 뿐 하나 다른게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키워줄 이 없어 안락사에 쳐해지는 강아지들은 ... 글쎄, 우리사회에서 통용되지는 않치만 미래 먼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 같은 느낌.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쩜 머지않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상상이지만 또 그런일이 없을 거라는 걸 자신있게 말 할 수 없다. 점점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게 되고 점점 귀찮은 존재로 부각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모든것이 그에 맞춰지는 사회다 보니 따뜻함, 인간적인... .이런 느낌들이 사라져 간다. 비록 개가 주인공이지만 이미 그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마음이 따끔따끔 아파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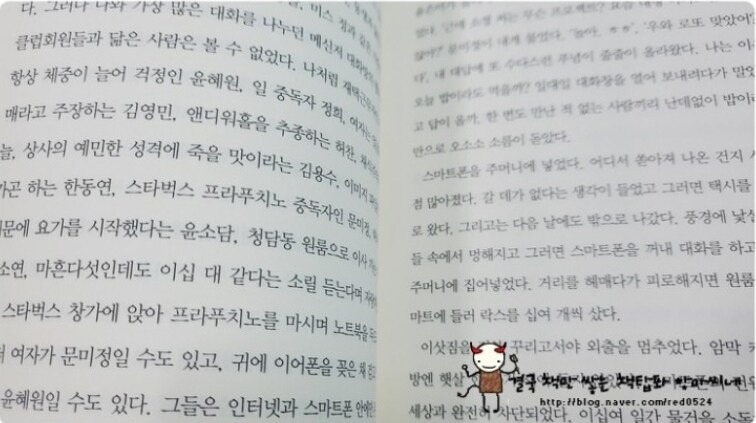
그외 전체적인 나머지 소설들도 상처받는 이들이 등장한다. 특히나 가족들에게 상처 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모습들. 하지만 스스로라고 해도 어쩌면 이미 사회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점점 인간적인 면이 상실되어 간다는 걸 나조차도 요즘 꽤 절실히 느끼고 있는 세상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뭔가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면들이 사라져 가는 삶 속에서 한 작가의 글은 그런 아픈 부분을 더 깊이 파고 들어 상처를 건드리고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 곪아버린 곳을 그대로 두지 않고 툭툭 건드린다. 그래서 아프지만 터트리고 폭발하며 그동안 꽁꽁 감쌌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처음 만난 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괜찮은 느낌을 받은 작가의 글이 아니었나 싶다.
요즘 우리나라 작가의 글들이 괜찮구나 싶은 그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