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라이
닐 셔스터먼.재러드 셔스터먼 지음, 이민희 옮김 / 창비 / 2019년 9월
평점 :




책 초반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인간의 몸 60%~70%가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제목부터 <드라이>다.
뭐지? 시작하기 전부터 건조해 지는 이 기분. 제목에서 부터 목마름이 마구마구 느껴진다. 물론 표지도 정말 기가막히게 뽑혀서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어쩌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갈증을 같이 느끼게 만든건지도 모르겠다. 미래 디스토피에 대한 세상 이야기를 몇년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점점 세상이 어째 환상적이고 멋진 곳이 아닌 황폐해지고 뭔가로 부터 부족해지면서 암울해 지는 분위기가 돼 가는 것을 느끼는 건 나만이 아닌가 보다. 뭔가로 가득 차 있지만, 어느순간 어디에서 사소한 것들이 틀어지면 그것이 크나큰 재앙이 되어 간다.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 재난, 재앙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인간들이 어쩌면 자초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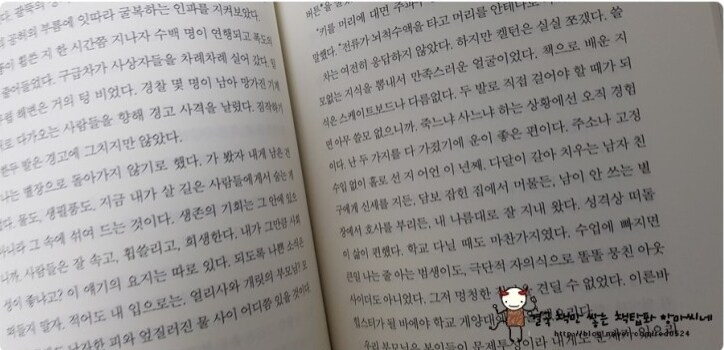
국가는 안일하게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고 더 큰 재난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60%가 물인 마당에 물이 끊기면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인지라 물 대란에서 결코 사람들이 이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단 살고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일단 초반엔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생수란 생수는 다 사들이고, 생수가 없자 음료수, 그리고 주인공 얼리사는 그 와중에 얼음을 생각하고 나른다. 하지만 그건 정말 초반의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점점 물이 사라진 세상에서 모두들 좀비처럼 물을 향해 뛰어드는 무서운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물만 있다면 어느누구 할 것 없이 덤벼든다. 살고자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인간의 좀비화가 돼 버리는 사태. 내가 살기위해서는 남들을 죽이고서라도 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 심지어 어린 얼리사의 부모는 물을 구하러 나갔지만 소식조차 없고 동생까지 보살펴야 하는 얼리사의 처절한 싸움.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상상만해도 싫은 이 기분. 그만큼 또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이야기 책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책의 이야기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리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될까?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래서 또 끔찍하지만 이해가 되는 상황.
마치, 우리나라 영화 <부산행>을 봤을때 끔찍했지만 살기 위해 다른이들의 희생을 지켜봐야 했던 이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기분이기도 했다. 물론 또 그 만큼 적나라함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뭣보다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 사라진다면?? 이라는 가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고마운 책이랄까나.....
솔직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펑펑 쓰고 살아온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물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되새기고 그와 더불어 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저 밑바닥 끝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 더 암울하기도 했다. 그만큼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서 쉬이 넘길 수 없는 책이었다. 이 상황이 끔찍하면서도 대단한 책이다. 제발 이런 일이 현실에선 존재하질 않길 간절히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