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진
에느 리일 지음, 이승재 옮김 / 은행나무 / 2019년 7월
평점 :

절판


첫 한문장이 강렬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이셨을때... 라고 아무렇치(?) 않은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 아 이거 막장에 의한 막장을 위한 뭐 그렇고 그런 소설이구나.. 라는 느낌.
심지어 책 글씨도 빽빽해서 읽기 버겁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책.
근데, 읽어갈 수록 뭐랄까...... 이 범죄집단(?) 소녀의 집안이 어느정도 왜 이해가 되면서 불쌍해 지기 까지 할까?
사실 북유럽 소설은 그리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도 좀 생경해서 호기심이 강하게 다가왔을 때 책을 들었는데, 첫부분 진도가 안나가서 좀 고생을 할려나보다 했는데, 읽어 볼 수록 이 기이한 집안에 대한 호기심이 동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책장 넘기는 속도가 꽤 빨라 졌었다. 왜 빨리 안 읽었나 몰라.

<송진> 이란 책 제목은 말 그대로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액. 그 액을 받아서 정확하게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 예전 저장고나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썩지 않기위해 덧 바르는 식으로 쓰지 않았나 싶다. 미이라 제조 얘기에 나오는 거 보니..... 우리나라는 식기에 혹여 발랐나? 이래저래 지식이 짧다보니 언뜻 들은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이 책에서 의미하는 송진은 가족의 지킴, 보존에 대한 것일까? 그들만의 사랑에 대한 것일까? 혹은 추억에 대한 것일까?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꽤 쉽지 않은 이야기가 촘촘한 책이었다.
본도 큰 섬이 있고, 거기 외따로 떨어진 한 작은 섬. 마치 전세낸 듯 그들 한 가족이 사는 곳.
어릴적에는 솜씨 좋은 아버지로 인해 꽤 소문이 자자해 여러가구들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많았고, 크리스마스 트리등도 특이하게 만들어서 파는 등 잘 살지는 못해도 나름 오손도손 살았던 가족.
특히나 아버지는 관을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말로는 짰다고 해야하는건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 관에 둘째 아들과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했다. 큰 아들은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활발했지만 숲을 살아하고 조용한 둘째 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그 후, 이러저러한 일들도 둘째 아들이 그 섬에 살게되고 결혼을 하게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고, 쓰레기더미가 된 집과 너무 뚱뚱해져 버린 엄마, 그리고 밤마다 마실을 나가 필요 물건을 가져오는 부녀의 삶.
그건 명백히 방임이고 범죄이며, 살인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잘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 그곳은 그야말로 그들이 아니면 무인도라도 해도 좋을만큼 그들만의 리그였으니까....
그속에서 자라는 소녀는 당연히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보다 그 적응력에 그저 놀라울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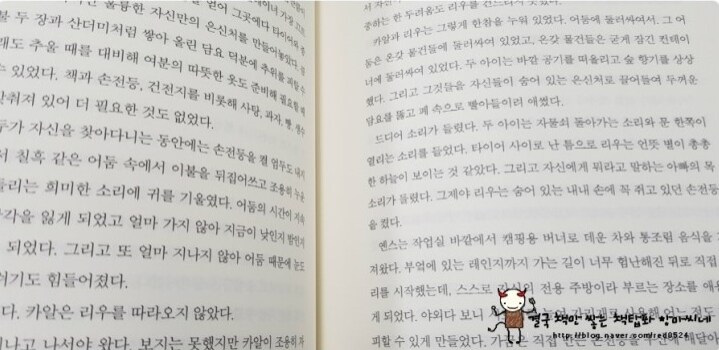
뭔가 일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자연스레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써 둘째아들, 즉 그 아이의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오롯이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는 소통하는 법을 몰랐다. 아니 어쩌면 배우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냥 그 속에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역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
어떤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도 없는 그런 삶속에서 끔찍하게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아빠는 그렇다쳐도 아이는... 아이는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읽으면서 치를 떨었고, 어떤것이 사랑이라는 것인지 다시 또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느낌의 책이라고 해야하나... 일단 이해 안되는 가족이고 아빠이지만 왠지 또 그렇게 이해가 안되지도 않는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였던 책이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묵직한 여운이 남는 책이었다.